쉽지 않다. 잘 쓴 장편을 찾기가 말이다. 잘 쓴 단편은 넘치는 것도 같다. 적어도 한 주(3시간)에 쓸 한 두 편의 단편을 고르는 것은 힘들지 않다. 문단 시스템도 단편을 쓰도록, 또 고르도록 편성되어 있고 소설창작 수업도 그렇게 가는 것 같다. 문제는 장편. 어쩌면 고루하게도, 모름지기 소설이란 장편이라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이게 참 유감이다. 고전 읽는 수업(각종 어문학과 문학 수업이 다 이런 식)이 아니라 소설 쓰는 수업에서 장편을 읽기가, 또 평하기가 쉽지 않는 거다. 그럴 수록 한 두 편을 엄선하는 데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분량이 만만한 경장편으로 기운다. 이런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물론 반성해볼 필요도 있다. 아무튼 그렇게 읽어본 경장편 중 으뜸은 김영하다.



김영하 소설은 어지간히 다 읽었지만, <살인자의 기억법>은 작가의 창작 전체를 놓고 봐도 수작, 심지어 걸작인 것 같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래 아마 김영하의 장기가 제일 발휘된 소설. 한데 이 소설과 어느 프랑스 소설이 영향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읽어보려고 주문해봤다.



또 다른 경장편의 견본으로 황정은 소설도 좋았다. 그녀는 여전히 많은, 좋은 소설을 쓰고 있다. 한데, 이건 정말 개인적 취향인데, 다소 감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왠지 재독하게 되지는 않았다. 단편은 그런 감상성이 짧으니(?) 아마 그쪽으로 읽게 될 듯하다.



그 밖에 뭐가 있나. 최근 읽었거나 읽으려고 샀거나 '눈팅'만 해뒀더가 한 장편을 뽑아본다. <홀>은 <식물애호>라는 상당히 잘 쓴 단편의 장편 버전이라, 구미를 자극한다. <82년생 김지영>은 작품 자체로는 재미 있었으나, 흔히 말하는 문학성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할 말이 많지 않은 것이 나로서는 문제다. 천명관, 그의 소설을 좋아하지만 어째 이번 장편은 애매(?)하다. 왠지 <... 브루스 리>의 따분한 재탕일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는 '남자(만)의 세상'(느와르 장르의 소설적 변용 같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결혼은 하셨는지... ㅋ



또 어떤 장편 소설이 있으려나. 이렇게 검색을 해봐야 할 정도니 이건 뭔가 이상한 것 아닌가. 한편 외국 작가들이 쓰는, 그래서 국내에 번역되는 소설은 거의 다 장편이다. 우선 가즈오 이시구로. <남아 있는 나날>에 이어 <나를 보내지 마>. 내 입장에서 '취향 저격'이라고 할 소설이 아님에도(나는 건방진 작가를 좋아하는데 이 작가는 너무 겸손하다!^^;;), 작품의 무게와 주제의식,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배여 있는 장인정신에는 혀를 내두르게 된다. 둘 다 일인칭. 그럼에도 흔히 일인칭 장편에서 우려되는 자의식의 과잉, 서사의 불균형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보다 더 부각되는 것은 주제의식이다. 우리 인간 모두의 메타퍼로서 (대저택의 집사에 이어) 장기기증자-클론들. 사실 이거 엄청 살 떨리는 얘기인데, 너무 담담해서 더 무섭다. 1차 기증을 끝내고 회복되면 또 2차 기증으로, 그리고 회복되면 또 3차 기증.이 클론들이 이식 전에 주로(오직?) 하는 일은 그 기증자들을 간병하는 일.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인간과 삶의 메타퍼다. 불쌍한 것들.(Poor creature?)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과 같은 뜻인 것이다.


줄리언 반스의 신작도 뒤적여 보았다. 그의 <플로베르의 앵무새>를 읽어봤으나 좀 지루했던 것 같다. 소련의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를 소재로 쓴 <시대의 소음>은 어떤가. 이게 무척 칭찬 받은 소설임에도, 나는 참 별로였다. 아무래도 '영혼의 형식'이 아니다. 저 엄정하고 점잖은,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영국식 세계관과 문체에, 광기와 혼돈의 육화인 러시아-소련의 예술혼을 담아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 나의 개인적 생각이고, 이런 시도 자체가 문학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문학의 소재, 문체, 시도 등은 다양할수록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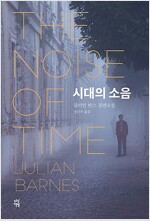


덧붙여, 이 소설 읽다보니 영국인들의 우주주의, 최대주의랄까, 그런 것을 또 한 번 상기하게 됐다. 선진국-제국다운 (참 시건방진^^;;) 담대한 시도이다. 오래 전 도스-키를 공부할 때 도-키 평전의 모범이었던 <도스-키>의 저자 역시 영국인 러시아역사학자이다. 그를 두고 오래 전 강의실에 김윤식 선생이 하셨던 말씀을 대략 복기해본다. "러시아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 저 미개한 야만의 땅에 이토록 기똥찬(기막힌) 천재 작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이 위대한 역사학자가 그 바쁜 와중에 평전을 하나 써주시고~ "



미뤄두었던 독일 소설도 한 번 펼쳐본다. 영화로 먼저 봐서 소설책에 좀 미안한 느낌. <책 읽어주는 남자>의 경우에도 인물, 스토리 모두 좋지만, 이 정도 좋은 소설은 적지 않고, 이 소설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역시나 주제의식인 것 같다. 전에도 쓴 것 같은데 바로 법과 정의, 죄와 벌에 대한 작가의 통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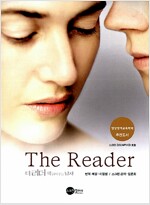
대학 시절에는 프랑스 소설을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요즘은 뭐가 읽히는지. <개미>를 처음에만 좀 좇아갔기 때문에 아예 놓친 것도 같다. 어느 순간부터 너무 가볍다, 라는 느낌도 들었던 듯하다. 하지만 어쩌면 실은 내가 너무 무거워진 것은, 그래서 처져 버린 것은 아닌지. 잠깐 반성해보는데 이것이 바뀔 수 없는 진리인지라 더 슬퍼진다.



장편의 역사를 더듬고 장편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어보인다. 말이 쉽지, 현실이 녹록치 않다. 작년에 비교적 정독, 재독한 장편들. 참 갈 길이 멀고나.



*
그래서 우리는 고전을 대하면 마음이 편안하다. 적어도 지금 시간낭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은 적다. 그럼에도 이 소설, 정녕 안습, 노잼, 극혐이다.^^;; 번역이 참 좋은데, 이 좋은 번역이 아까울 정도의 소설. 역시 벨린스키의 평(졸작)은 진리. 곁다리로, 아이의 발달센터 근처에 커피숍 하나를 새로 발굴(?)했다. 하지만 참, 입에 맞는 떡이 없다. 커피도 맛있고 전망도 좋고 다 좋은데 오후 1시에 문을 열고, 무엇보다도, 이 엄동설한에 무척 추운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그러니 투덜대지 말자. 핫팩을 배에만 붙이지 말고 등에도 붙이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