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라고 하면 고급스럽다. essai(s). 단순히 일기 수준의 신변잡기 이상의 글쓰기는 되어야할 것 같다. 아무래도 고전부터 넘겨온 까닭에 이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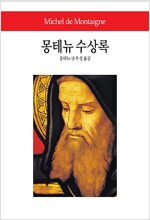


우리 문학의 고전에 참 무지한데, 조선 최고의 문장가라는 박지원의 <열하 일기> 같은 것을 꼽아볼 수 있을까? 이름만 알지, 읽지는 않은 정약용, 이런 양반들의 글은 어떨지. 검색해보니 <열하일기>, 헉, 이렇게 두꺼운 거였냐, 냐, 냐 -_-;; 나는 한 권짜리도 읽은 것 같다.


20세기 초반 에세이는 '수필'이라는 이름으로 소비되었던 것 같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고, <중고생 필독서 - 수필편> 이런 데 실린 글을 반복해서 읽으며 동서양 수필에 입문했다. 찰스 램(?), 이런 이름도 있지 않았나. 교수 부부의 딸이었던 사촌 동생은 심지어 <바보네 가게>, 이런 것도 읽고 있었는데, 그 지적인 풍미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20세기 후반부터 에세이는 '산문'이라는 이름으로 생산, 소비되는 것 같다. 소설가나 시인이 어느 정도 명망이 쌓이면 산문집을 냈다. 작가의 이름값에 비례해 관심을 얻었고 또 지금도 그런 것 같다. 영화 에세이도 적잖았고 언제부터인가 독서에세이, 각종 독후감책도 많아졌다. 21세기부터인가 그야말로 수많은 '작가'가 생겨났다. 소설가, 시인, 극작가, 이런 명칭과 달리 '작가'란 뭐든 쓰면 된다.(심지어 만들면 된다^^; - 작, 쓰꾸루!) PC통신은 이미 고물이고, 인터넷, 이어 스마트폰에 힘입어 쓰기(+ 사진 찍기 등)가 무척 용이해졌다. 덕분에 옛 기준이라면 도무지 '작가 아닌 작가'도 많아졌다. 그러나, 물론, 소위 등단(=자격증)이 그 작가의 품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21세기, 어느 지점부터 호칭에도 "- 작가님"이 일반화되었다. 대학교에서도 "교수님"이라는 호칭이 퍼진 것과 비슷한 듯하다. 누구에게나 두루 쓸 수 있는 경칭인 '선생님'과 달리, 이 교수님은 직업에다 '-님'을 붙이는 것이라 처음에는 상당히 낯설었다. 물론, 내가 시간강사인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보다 원론적으로, '직업+님'이 주는 불편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언중들의 합의에 따라 이제 보편화되었고, 나 역시 길들여지는 것을 느낀다. 청소부님, 환경미화원님, 고객님, 의사님, 교사님, 강사님, 헤어 스타일리스님, 간호사님, 의사님 등등. 그래도 여전히 이상하긴 하다.
아무튼 다양한 종류, 성향의 작가들이 책을 낸다. 나야 물론 문학가들에게 먼저 끌리지만 독서의 지평을 최대한 넓히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다. 노력까지 해야 하는 이 상황(나이와 애 엄마라는)이 참 서글프지만, 그 시간에 한 권이라도 더 훑어보려고 한다. 이런 것 역시 관성이려니.



지난 주말에 이삼일 동안 세 권을 훑었다. 허수경은 나에게 왠지 해탈한 개룡, 약간 이런 느낌을 주었다. 왠지 그녀의 전공만큼이나 독일에서의 그런 최후는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 반 정도를 읽었는데, 중간중간 울컥하곤 했다. 반면 <시절일기>는 오랫동안 김연수의 소설을 읽어온 독자로서, 뭐랄까, 그가 지금 한 박자 쉬는 중이랄까, 이런 느낌을 받았다. 쉬는 동안 무엇을 할까. 역시 공부밖에. 제목은 '시절일기'지만, 나는 '공부일기'로 읽었다. 음, 그런데, 쬐금 지루했다^^;;
그래서 다음 책으로. '칼럼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김영민'이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다른 이름의 주체와 착각하여, 이제야 비로소 읽었다. 캭, 웃겨 죽는 줄 알았다. 웹상으로 읽은 글들이 너무 재미있어, 나로서는 잘 없는 일인데, 이 책 한 권만 달랑 당일배송 주문했다. 얼굴은 굉장히 싱겁게(?), 재미없게 생겼는데, 문체는 정반대다. 그를 스타덤에 올린 이른바 '추석이란 무엇인가'(**란 무엇인가) 외에 거의 모든 칼럼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학생들에게 쓴(주례사 포함) 글도 재미있었다. 15년 정도 아이들의 레포트를 읽어온 결과 쌓은(?) 내공이지만, 아무래도 사회과학(정치외교학부 교수라니)을 공부한 사람의 글쓰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명민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 글쓰기의 특징의 일관된 특성 중 하나는 '-끼' 없음이다. 간혹 '-끼'가 있어도 (레포트라는 제한된 장르에서!) 잘 발휘되지 못하기도 했을 터. 김영민의 프로필을 찾아보니 역시 학부가 고려대 철학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활자화된 (아마) 첫 글은 영화평론이다. 인터뷰 들어보니, 영화를 만들어 출품한 적도 있다고. 그런 '-끼'들이 '포텐 폭발' 하듯 넘치는 글들의 모음집이다. 지성과 감성이 만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보여준다. 반 이상 왔는데 마저 읽을 생각이다. 소설보다 재미있다니, 소설가로서 반성할 수밖에^^; 참고로, 저 책의 한 꼭지에 이인성의 <마지막 연애의 상상>이 언급되었다. '마지막 강의'를 상상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용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 저런 것까지? ^^;
*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 생각한다는 것,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 살아 있으리라.
- 아침에는. 즉, 아침에 일어나 있으라.
- 생각. 그냥 멍때리거나 몽상하지 말고 생각, 생각을 하라.
*
모든 일에서 기대치를 낮추라. 추석과 설날은 물론, 모든 일에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라. <기생충> 생각난다.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된다. 이참에 저 책에 인용되는,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을 새겨(^^;) 본다. .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 하나는 있다, 쳐맞기 전까지는
Everyone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
너무 많이 '쳐맞아서' 지금 이 커피가 너무 고맙다. 오늘 아침 일주일만에 또 몸이 좋지 않았다. 아무래도 몸이 회복된 것에 회심의 미소를 흘리며, 어젯밤에 저 에세이를 읽으며 오징어파전을 한 판 다 먹고 감자칩까지 먹는 욕심을 부려서가 아닌가 싶다.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를 먹는다, 라는 계획을 버려야지. - 그러게,
- 욕심이란 무엇인가.
- 계획이란 무엇인가.
- 시험이란 무엇인가.
- 서울대란 무엇인가.
- 교수란 무엇인가.
- 아이(자식)란 무엇인가.
질문은 무한히 이어질 수 있다.
- 질문이란 무엇인가.
- 무엇이란 무엇인가.
.....
*
많이 찌질한 사족.
아마 내가 꿈꾸던 사오십대의 나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왕년에 소설을 좀 써본, 그러나 소설가로 일가를 이루기에는 재능이든 열정이든 뭐든 좀 부족했던, 그래도 그 '-끼'를 가지고 무슨 유사한 글쓰기를 하는 서울대 교수. 이건 정말로 사족이다. 이참에 찾아본다.
- 사족[뱀 발]이란 무엇인가.
*
유의미한(?) 족.
'쳐맞다'. 혹시나 싶어 찾아보니 역시 사전에 없는 비속어이다, 헐.
'처맞다'도 없는 말이다. 안타깝다!
가끔씩은 내가 (입-아가리를?) 더 쳐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