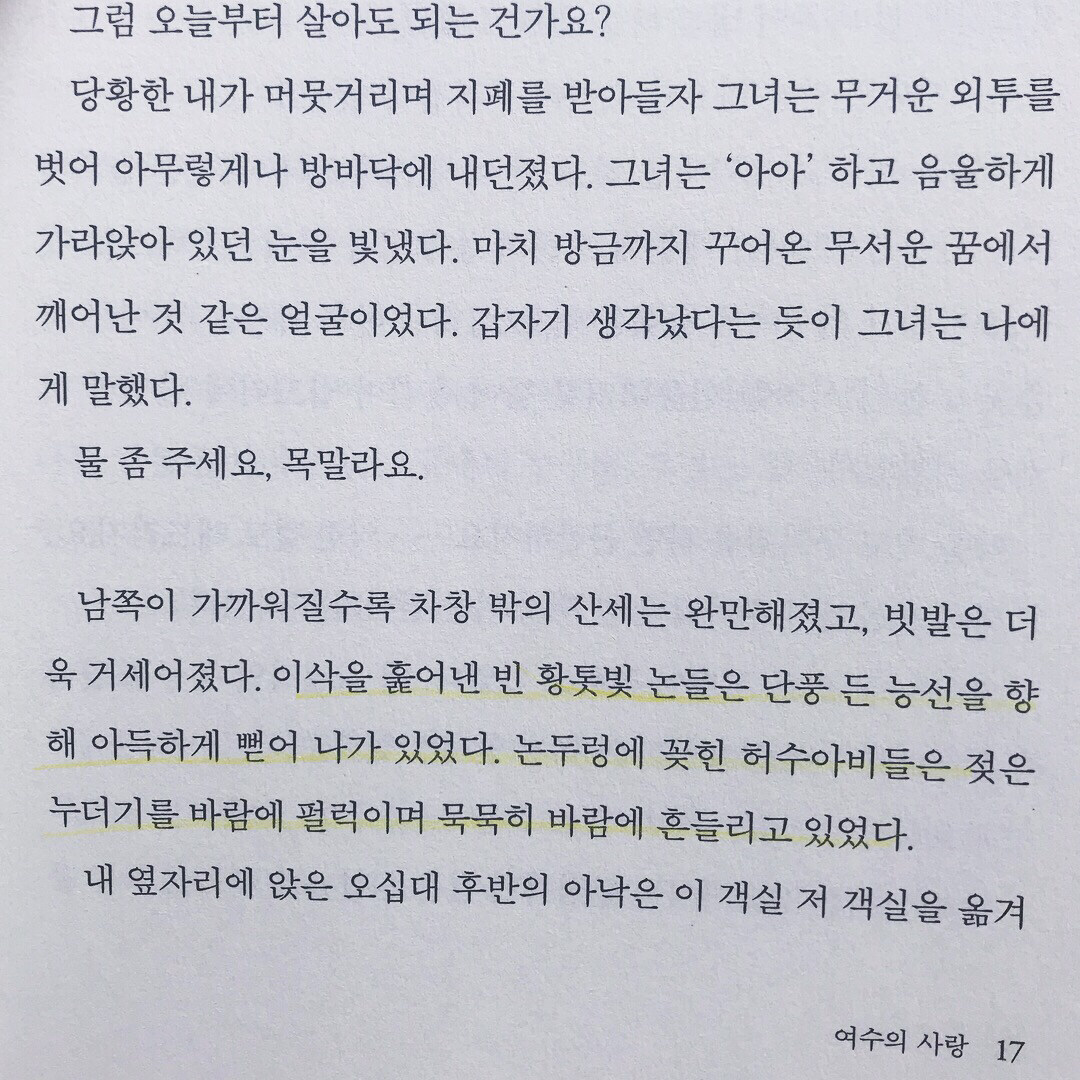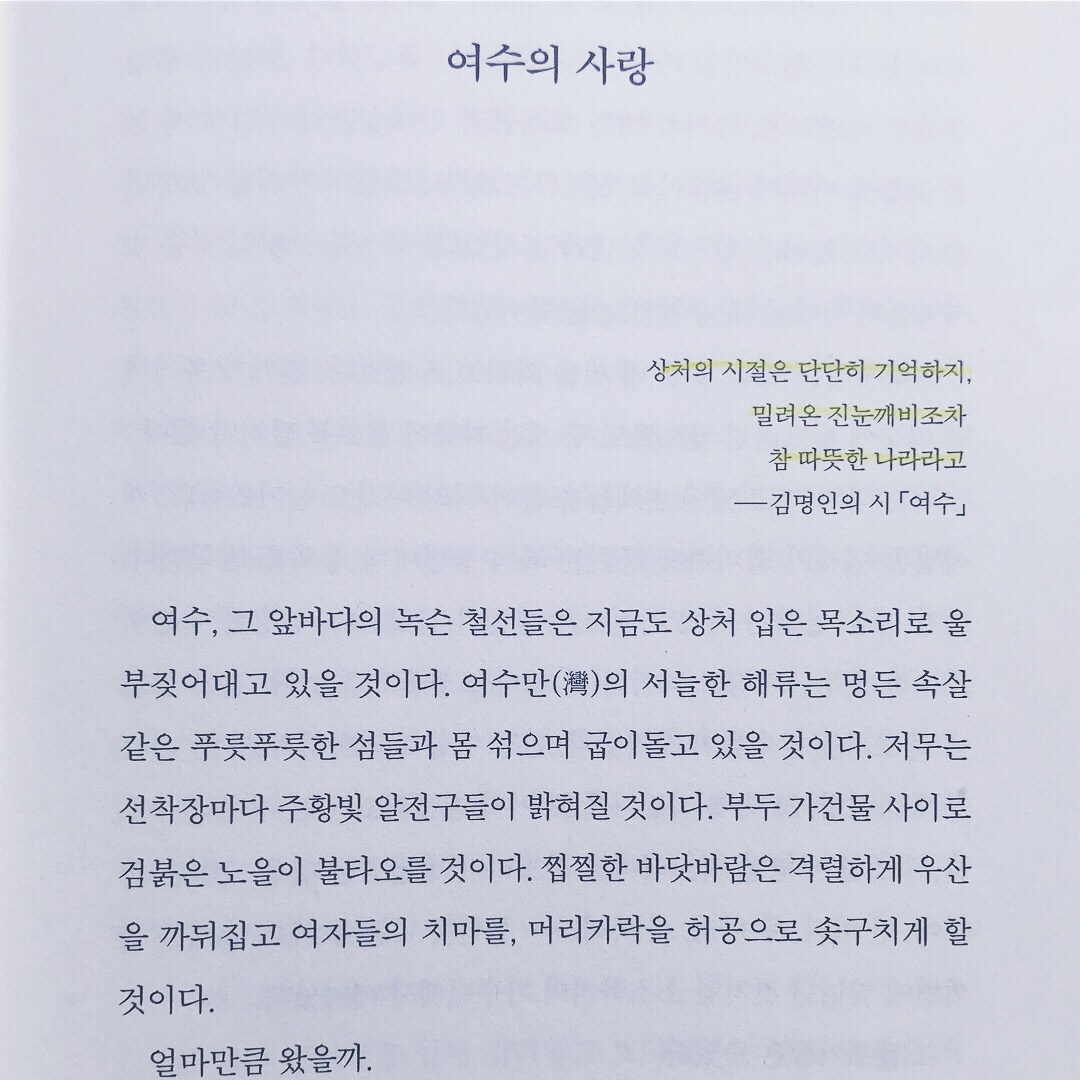
엄마가 말해주 길,
내가 태어났던 날 그 한 겨울에도
눈이 아닌 진눈깨비가 내렸다고 했다.
한강은 분명 여수에 여러번 왔다 갔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이 고장의 눈이 대부분 진눈깨비라는 것도, 기차가 남쪽으로 내려갈 수록 땅의 색이 황톳빛으로 붉어진다는 것도 알 수 없었을 테니까..
“집이 여수입니다.” 라고 하면 서울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란다.
아주 먼 곳. 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비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의~ 끝.
나의 고향은 여수다. 19살때 까지 떠난 적이 없다. 야자시간에는 멀리서 뱃고동 소리가 들렸고, 뒷산에 올라가면 한려수도가 널찍이 펼쳐졌다.
배경음악 같은 뱃고동 소리가 없다는 것도, 산에 올라가면 바다가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도, 겨울에 눈이라는 것이 쌓이면 사람이 미끄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스무살이 넘어서야 알았다.
사는 게 어려울 때,
내가 바다를 그리워 한다는 것도.
<여수의 사랑>
집이, 바다가, 여수가 그리워서 읽었고, 두번 읽었고, 천천히 읽느라
아직 세편의 단편이 남아있다. 그리고 여전히 바다가 보고 싶다. 요즘, 잘 안풀리나보다, 나..“바로 거기가 내 고향이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나한테는 모든 곳이 낯선 곳이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가깝고 먼 모든 산과 바다가 내 고향하고 살을 맞대고 있는 거에요. 난 너무 기뻐서 바닷물에 몸을 던지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죽는 게 무섭지 않다는 걸 그 때 난 처음 알았어요. 별게 아니었어요. 저 정다운 하늘, 바람, 땅, 물과 섞이면 그만이었어요 .... 이 거추장스러운 몸만 벗으면 나는 더 이상 외로울 필요가 없겠지요, 더 이상 나일 필요도 없으니까요... 내 외로운 운명이 그렇게 찬란하게 끝날 거라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큰 소리로 그 기쁨을 외치고 싶었는지, 난 그 때 갯바닥을 뒹굴면서 마구 몸에 상처를 냈어요. 더운 피를 흘려 개펄에 섞고 싶었어요. 나를 낳은 땅의 흙이 내 상처난 혈관 속으로 스며들어 오게 하고 싶었어요. (p.49)”피를 내서라도 섞이고 싶은 외로움이란 무엇일까.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 편인데,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극단적인 외로움 - 강렬하게 섞이고 싶음- 이라는 감정이 궁금해서 외로워지고 싶더라.자흔이라는 캐릭터가 으엄청 매력적이었다.내 팔이 닿는 힘껏, 꽉 안아주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_여수에 대한 시각적 묘사가 두드러진 소설이지만, 소설을 읽을 사람들을 위해 짧은 코멘트를 달아두고 싶었다. 내 고향 여수는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는 곳이라고. 눈이 내리다가도 녹아 없어지는 따뜻한 바다가 있는 곳이라고. 그날 자흔이 외롭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의 바다가 따뜻했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고.여수같은 사람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