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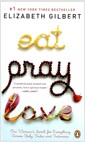
-
Eat, Pray, Love (Paperback) -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원서
Elizabeth Gilbert 지음 / Penguin U.S / 2007년 11월
평점 : 
품절

영어 원서로만 읽은 책을 리뷰하는 것은 정말 간만이다. 워낙 유명한 책이기에 한 번쯤 읽고 싶었고, 에세이 형식의 여행기인 것을 알았기에 독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 예상대로, 엘리자베스 길버트(Elizabeth Gilbert)의 Eat, Pray, Love는 무리 없이 읽혔고, 생각 이상으로 작가의 재치와 통찰력을 엿볼 수 있었다. 직접 접하면 그녀 특유의 유머러스한 톤과 솔직한 매력을 확인할 수 있으니, 나는 각 권마다 인상적인 장을 소개하려 한다.
1권 4장은 신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담아낸 부분이다. 1권에서 저자는 이탈리아 여행을 배경으로, 이혼을 비롯한 과거에 신을 만났던 경험을 풀어낸다. 그러면서도 새롭게 만나는 사랑과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4장에서는 기도를 통한 신과의 대화를 보여줌으로써 이 책의 제목 중 하나인 pray의 의미를 곱씹게 만든다. 엘리자베스는 이후 신을 믿지 않게 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다른 종교를 대하는 관점이나 글의 후반부에 나오는 초월적인 경험에 대한 노력의 발판이 된다.
그래서 나에게 Eat, Pray, Love이 주는 의미는 관용(tolerance)이 아닌가 싶다. 나는 신을 믿기 때문에 식전 기도를 올린다. 그래서 나에게는 '기도하고, 먹고, 사랑하라'는 명령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먹고(나의 욕구를 채우고), 기도하고(종교적 체험을 시도하고), 사랑하라(주변 사람들을 만나라)'는 명령이 더 익숙하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마냥 비난할 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녀 역시 신과의 만남을 겪었고 단순히 그 믿음에서 떠난 것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 비록 작가로서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울 수도 있는 과거와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으나 나는 여전히 그녀의 인생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2권 57장에서 엘리자베스는 신들의 나라인 인도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에 대해 피력한다.
믿음은 일종의 "그래, 나는 우주의 말들을 진작 받아들이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미리 포용해"라고 말하기이다. 우리가 "믿음의 도약"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신성에 대한 어떤 생각에 동의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이성에서 불가지로의 대단한 발돋움이고, 나는 모든 종교의 학자들이 책들을 쌓아 놓고 당신을 앉힌 후 경전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진실로 이성적임을 얼마나 성실하게 증명하려 하는지 관심 없다. 만약 믿음이 이성적이라면, 그건 정의상 믿음이 아닐 것이다. 믿음은 당신이 보거나 증명하거나 만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믿음은 얼굴을 먼저 들이밀고 어둠 속을 전력질주하는 것이다(p.233).
믿음에 대한 저자의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만약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나에게 납득이 되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다. 오히려 그것은 "합리적인 믿음을 가진 나"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에 가깝다. 한때 나도 신을 믿었던 이유가 그것이 세계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었기 때문이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인격적 만남 이후,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 이후로는 이 세상이 이성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님을, 논리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야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딥러닝으로 오류를 아무리 최소화한다 해도,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과학과 논리학 등의 학문은 지성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서 인간의 업적 중에 가장 대단한 축에 속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물론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힘과 지식만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것이 오히려 더 어리석다. '믿음의 도약'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은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다. 최소한의 자기를 지키기 위해 도약하지 않는 그 선택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을까? 다만, 날고 있는 이들에게 추락을 바라지는 않길 바란다.
3권 83장에서는 유디(Yudhi)라는 친구가 등장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저자가 만난 친구인데, 사연이 참으로 기구하다. 음악적 재능을 타고나서 그 꿈을 펼치기 위해 뉴욕으로 갔고,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지만, 9·11 테러 이후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그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순탄하게는 아니었고, 아주 부당하게. 테러라는 역사적 비극의 한복판에서, 또 다른 희생자들이 등장한 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결코 몰랐을, 이 세계의 부조리들에 대해 우리는 배운다. 인간 사회는 누군가가 피를 흘리면, 다른 누군가의 살점을 이용해 그것을 감쌀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피로 맺어진 악순환은 누군가가 자신의 살을 모두 내어주는 희생이 없으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다. 과학, 이성, 논리로 무장하고 첨단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과연 그 슬픈 굴레가 멈추게 될까? 많은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였다.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높이만큼 풍경을 볼 수 있고, 자신이 아는 만큼만 상상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여행기를 보고 누군가는 가볍게 즐기고, 누군가는 별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고 불평할 수도 있겠다. 나에게는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었다. 문학을 사랑하는 이는 그것을 즐기면서도 그 이야기가 현실이 아니기에 안도하거나 아쉬워 한다. 하지만 실화의 무게 앞에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 나는 숙연해진다. 왜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여행을 하는가? 거기에는 특별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를 돌아다니며 저자는 분명 성장했을 것이다. "여행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시간에, 여행지에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라. 그것이 어렵다면, 눈앞의 사람들을 사랑하라.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려보라.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그제야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