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벼운 점심
장은진 지음 / 한겨레출판 / 2024년 4월
평점 :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한 소설이다.
소설에서 익히 본 문장으로 시작된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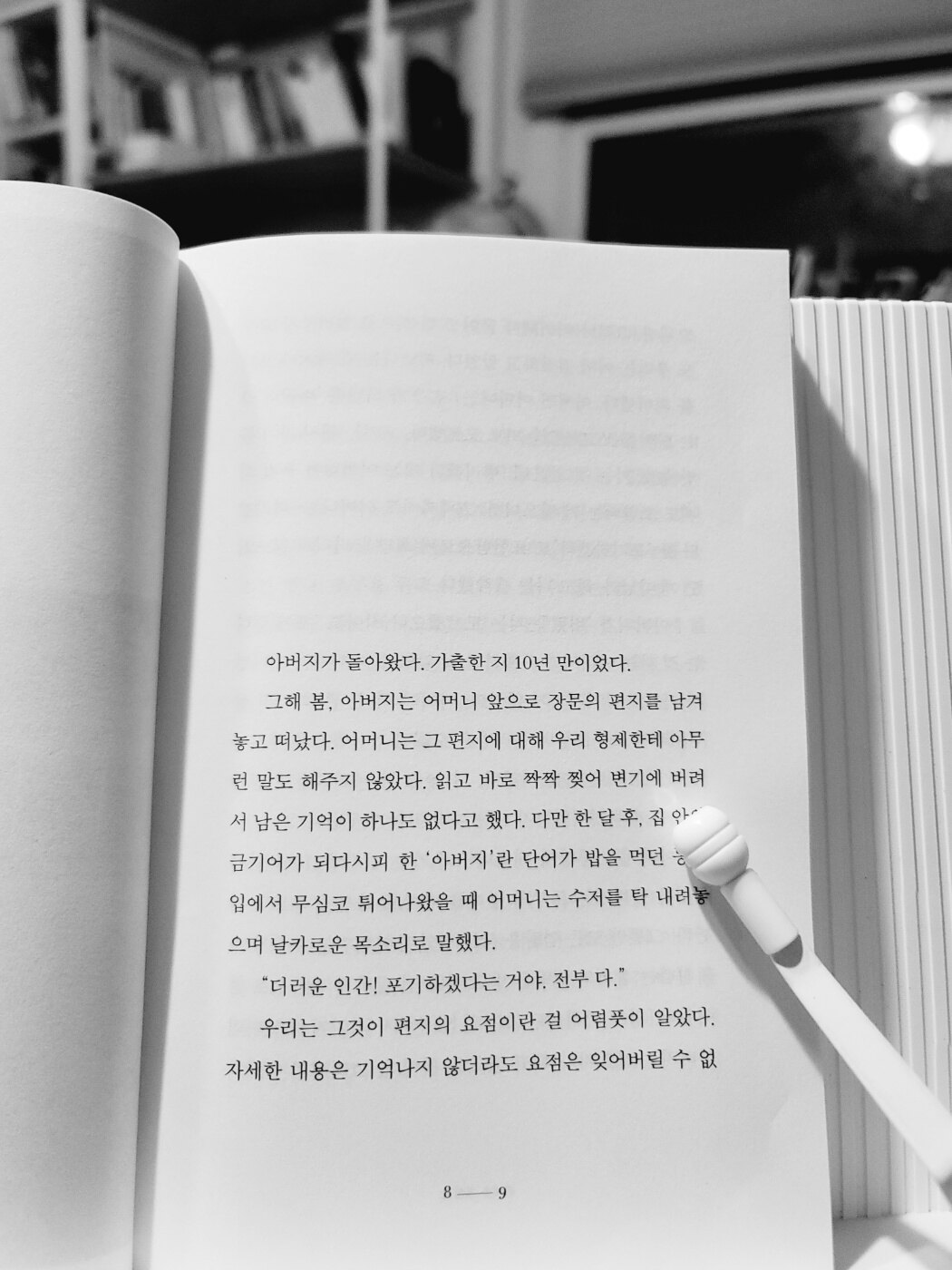
소설에서 누가, 특히 아버지가 돌아온 이야기는 물릴만치 많다.
새로울 게 없다. 더 읽고 싶다는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아버지가 떠난 이유와 돌아온 이유를 따져 묻기에
이미 지난 숱한 소설들이 진력나게 말해 주었다.
더 떠날 아버지가 있고, 더 돌아올 아버지가 있을까 싶을만치.
아버지는 어머니 앞으로 장문의 편지를 남겨 놓고 떠났다.
(중략)
"더러운 인간! 포기하겠다는 거야, 전부 다."
9p)
이 또한 새로울 게 없어서 별로 궁금하지가...
아버지는 십 년 전에 다 놓고 갔고, 오죽하면 조부가 물려준 오래된 만년필도 챙겨가지 않았단다. 그리고 그 조부가 죽어 장례를 치르러 미국에서 귀국했다. 조부는 아버지가 존경하던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사흘 간 대신 울어달라며 고용된 사람처럼 보였다.
열심히 울어서인지 아버지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혼자였다.
11p)
솔직히, '있어 보이는' 문장은 이게 고작이다.
소설을 읽다 보면, 겉이 번지르르한 문장들이 있다.
소설을 읽다 보면 하나 번지르르할 것 없는데 번쩍이는 문장들이 있다.
이 소설은 둘 다 아니다.
그냥 번지르르할 것 없는...문장들이다.
소설이 끝나지 않은 아직까지는.
어지간히도 비유를 쓰지 않는다.
요즘 소설에서 판 치는 '~처럼'조차 거의 없다.
그냥 할 말을 담백하게 한다. 비유 같은 것에 의탁하지 않고.
그래서 '울어달라며 고용된 사람처럼'처럼 신중하게 쓴 비유가 좀 귀하게 느껴진다.
다른 소설에 썼다면 흔하거나 낯익을 수도 있는데.
요즘 소설답지 않게 이 소설의 '아버지'는 '교수 씩이나' 된다.
대개, 무직에 무능해서 집을 나간 소설 속 흔한 아버지들과 다르다.
그 점이 계속 읽게 만들었다.
현실에서도, 소설에서도 이렇게 '있어 보이는' 아버지들은 집을 잘 나가지 않으니까.
'나(아들)'는 아버지를 공항으로 배웅하면서 '가벼운 점심'을 함께한다.
벚꽃이 핀 봄날이다.
'갸벼운 점심'은 가벼운 점심답게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루어진다.
뉴요커가 다 된 아버지는 뉴요커답게 햄버거를 주문한다.
'무거운 점심'을 대접하고 싶었던 '나'는 못내 아쉬워하지만.
나와 아버지 사이에 두 장의 사진이 오간다.
나는 아버지에게 연인의 뱃속에 자리한 아기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다.
아버지는 사진 속 아기가 자신을 닮지 않길 바란다.
아버지는 나에게 연인의 사진을 보여준다.
금발의 파란 눈을 한.
나는 대번에 아버지에게 그 사람이 아버지의 진짜 사랑임을 알아챈다.
그래서 아버지는 행복해 보인다.
아버지는 나를 낳고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걸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부자 간의 '가벼운 점심'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이야기를 가볍게 주고받기에 더없이 적절한 매개가 되어 준다.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이야기.
아버지의 연인 또한 아버지와 사랑을 하면서 일도 가족도 잃었다는 식의.
학자였던 아버지는 뉴욕에서 연인과 세탁 일을 한다.
학자였을 때 아버지의 손은 말랑했지만 왠지 삭막하고 창백하고 무뎠던 걸로 기억한다. 시든 손. 그러나 세탁을 한다는 현재 아버지의 손은 거칠지만 부정하기 힘들 만큼의 생기가 감돌았다.
활짝 핀 손이었다.
35p)
이런 식이다.
그 흔한 비유가 고집스럽게 없다.
세상 말로 '흔한' 작가라면 "~처럼' 말랑거리고 '~처럼' 거칠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독자를 편하지만 게으르게 만들었을 것이다.
'활짝 핀'이 고작이다.
이상한 소설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려다 문득 서게 된다.
손이 피다니. 손이 활짝 피다니.
아, 봄 꽃? 봄 꽃처럼 활짝 핀 다섯 손가락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작가는 독자더러 하라는 것 같다.
비유는 직접 알아서 생각하라는 것 같다.
"봄이 왔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인 거야."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분홍 빛으로 물들었다. 즐겁게 나이를 먹어서 생긴 주름이었다.
"열 번의 봄은 열 번 환생한 느낌이었어."
41p)
자식이고 아내고 다 버리고 외국으로 떠나서 연인과 저 하고 싶은 대로 살며
분홍빛 주름을 달고 봄마다 환생한 느낌으로 사는 아버지.
있어 보이는 아버지는 다 그런 건가.
도대체 이 아들은 어째서 이런 아버지와 '가벼운 점심'을 나누며
가벼운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인가.
이 아들은 어째서 다 버리고 집 나간 아버지에 이다지도 호의적인가.
이제 소설의 결말에 이르렀다.
도대체 독자로 내가 얻어가야 하는 건 뭔가 밑진 느낌이 들 참이다.
반전을 도모하기엔 너무 늦어 버렸다.
이제 겨우 한 장 남았으니.
앞의, 새로울 것 없는 그 모든 걸 뒤집거나 흔들기에 한 장은 역부족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소설이다.
한 장으로 그걸 해 내고야 만다.
턱을 괴고 소설을 읽다가 결말을 다 읽고 턱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맨 앞으로 돌아가 양손에 책을 쥐고 다시 읽었다.
전에 읽었던 거의 모든 단어가 새롭게 읽혔다.
특히, 여기.
"더러운 인간! 포기하겠다는 거야, 전부 다."
집 나간 아버지들에게 던지는 어머니들의 흔한 개탄사.
그런데 결말까지 읽고 돌아오면 이 문장의 진의를 알게 된다.
'더러운'의 서브텍스트를 알게 된다.
'포기한 것'의 대상을 알게 된다.
'전부 다'의 스펙트럼을 알게 된다, 이 말이다.
이 소설에서는 비유가 필요 없었는지 모른다.
혹시 작가는 비유를 썼다가 다 지웠는지도 모른다.
비유가 해 낼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단어가 지닌 본연의 의미만으로도 얼마든지 서브텍스트가 품어질 수 있다는 걸
이 소설은 보여준다.
봄, 봄 꽃, 아버지, 어머니, 연인, 손, 주름, 행복, 사랑 같은 단어가
이다지도 품이 넓었던가.
내가 단어들마다 얼마나 졸렬한 고정관념으로 대했던지를 절감하게 해 주었다.
참, 이상한 소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