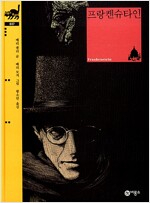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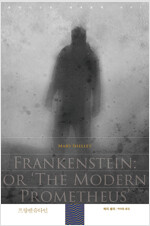



모든 창작물은 수용자의 경험 위에서 재건축된다.
텍스트와 영상은 그 자체로 완결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읽히고, 보이고, 해석되는 순간마다
작품은 각자의 기억과 윤리, 삶의 조건을 덧입는다.
감상되지 않는 작품은 의미를 생산하지 않는다.
그것은 새벽의 박물관에 놓인 전시물과 다르지 않다.
이 전제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기예르모 델 토로의
'프랑켄슈타인'을
내 멋대로 다시 읽었기 때문이다.
내 방식대로 재건축하면서.
원작 소설에서 메리 셸리는 창조주와 피조물(크리처) 모두에게
윤리적 질문을 분산시킨다.
빅터는 무책임한 창조주로 출발하지만,
크리처 역시 단순한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민가에 숨어 살며 언어를 익히며 자신의 처지를 사유하기 시작한다.
관찰하고, 비교하고, 인간 사회의 규범을 이해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크리처는 점차 판단과 선택이 가능한 주체로 이동한다.
델 토로의 영화는 이 설정을 삭제하지 않는다.
영화 속 크리처 역시 숨어 살며 책을 읽고 세계를 이해하려 애쓴다.
그러나 차이는
‘사유의 유무’가 아니라, 사유가 작동할 수
있는 구조에 있어 보인다.
원작에서 독서와 사유는 크리처를 인간 사회의 윤리 영역 안으로 끌어올려 창조주와 인간에게 맞서게 하지만, 영화에서 크리처는 원작의 피조물에 비해 최소한의 사회적 발화권도 갖지 못한다. 원작의 크리처보다
더 많이 읽었고, 더 많이 말했으나(수용자는 장님) 훨씬 더 말할 수 없고, 응답 받지 못한다. 여기서 델
토로의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사유하고 판단했으나 끝내 응답 받지 못하는 존재에게,
우리는 그 생에 어디까지 책임을 지을 수 있는가.
원작이 '사유했음에도 왜 이해에 실패했는가'를 묻는다면,
델 토로의 영화는
'사유했으나 끝내 응답받지 못하는 존재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같은 프랑켄슈타인이 서로 다른 시대의 윤리를 비추는 방식이다.
이 영화의 핵심은 비극적 정서가 아니라 구조적 갈등에 있다.
피조물은 태어나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결핍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될지도 결정한 바 없다.
이 모든 결정권은 창조주에게 집중되어 있다. 창조는 철저히 일방적이었다.
그럼에도 창조주는 결과에 대해 후회한다. 창조주 빅터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후회는 감정의 표현일 뿐, 책임의 수행은 아니라는 것-.
한마디라도 더 하면 기적이라고 해 놓고,
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가?
창조자를 대면한 크리처의 절규다.
이것은 권력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다.
창조주는 전능에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피조물은 제한된 능력만을 받았다.
언어 능력, 사회적 위치, 자기 해명의 수단
모두가 창조주 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럼에도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자신과 동일한 윤리적 기준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공정하지 않다.
이 대사는 비애의 토로가 아니다. 권력의 비대칭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다.
창조주는 전능에 가까웠고, 피조물은 제한된 능력만 받는다.
언어 능력, 사회적 위치, 자기 해명의 수단
모두가 창조주 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럼에도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자신과 동일한 윤리적 기준을 요구한다.
이 예정된 비극적 불균형이라니...
델 토로는 이 갈등을 개별 인물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상징화한다.
시체의 절단 장면이 전혀 잔혹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살인'이나 '훼손'이 아니라 '제작'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빅터가 절단하는 것은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재료의 일부였다.
원작을 읽었을 때보다 확실히 이 부분에서 시청자(독자)는 감정을 강요하지 않았다.
영화는 감정 대신 구조를 드러낸다. 생명체의 복제란 극적인
장면이 아니라
책임이 유예되는 '구조'를 시체 절단,
이 장면으로 구현한다.
원작과 영화가 가장 확연히 다른 바는 인물에서 이루어진다.
여인, 엘리자베스이다.
원작에서 엘리자베스는 빅터의 여자다.
그는 엘리자베스를 사랑했고, 잃었고, 그 상실을 견디지 못한다.
이때 엘리자베스는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명분을 제공한다.
이전
크리처에서는 소거된 '감정'이 개입되면서
빅터의 창조가 오만적 욕망으로만 보이지 않게 역할한다.
정서적 알리바이인 셈이다.
이 알리바이로 빅터는 '나는 신이 되려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랑하는 이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선다. 엘리자베스는 그 말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방패를 자처한다.
그에 비해, 델 토로의 영화에서는 이 알리바이가 철저히 제거된다.
엘리자베스는 빅터의 여자가 아니라 더구나 동생의 여자이다.
여기서는 사랑도(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했다. 혼자 썸
타는 정도),
소유도, 회복의 환상도 생략된다. 그 결과
창조 행위는 감정으로 가려지지 않은 채
그 자체의 윤리적 문제로 불거진다.
영화에서 빅터의 창조는 더 이상 '사랑했기 때문에'라는 말 뒤에 숨을
수 없다.
오로지 그의 '도덕'만, '책임'만 남는다.

확연히 다른-사과의 받아들여짐
소설에서는 창조자와 크리처가 끝내 화해에 도달하지 못한다. 메리 셸리는 '사과'를 유예한 채 서사를 닫는다.
빅터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 연민에 가깝고 명시적인 사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빅터는 인간들 틈에서 죽는다. 크리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존재를 이해할 빅터와 마지막이 어긋난 채, 그래서 영원히 이해 받지 못한 채 빙산의
황무지로 사라진다. 파국은 봉합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절대적 비극이다.
델 토로의 영화는 확연히 다른 선택을 한다.
영화에서 빅터는 사과한다. 그것은 변명도, 후회의 독백도 아닌,
창조주로서의 명시적 책임 인정이다. 그리고 크리처는 얼굴을 마주하고 그 사과를 받아들인다.
그 받아들임은 화해라기보다, 더 이상 관계에 매이지 않겠다는 결정에 가깝다.
크리처는 떠난다. 도망이 아니라 이탈이며, 파괴가 아니라 분리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원작이 '왜 이해에 실패했는가'를 묻는다면,
영화는 '사과가 가능했다면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실험한다.
델 토로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건을 장치한다.
바로, 사과이다.
빅터와 크리처는 얼굴을 마주하고 분명히 말한다.
I am sorry.
Accepted.
책임이 언어로 발화되는 순간, 폭력의 순환은 종료된다.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은 희망적이라기보다
내게는 다분히 윤리적이다.
크리처는 머무르지 않고 떠난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복원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희극적이지는, 당연히 않다.
그 중간의 어디쯤이다.
슬프면서 희망적이면서 가여우면서 기특하고
너 같으면서도 나 같다는 느낌...
무엇보다, 뿌듯하다.
책임이 한 번이라도 제자리를 찾았다는 사실에.
그리고 나는 얼마간 평온해졌다.
괴물이 사라진 자리에 구조가 잠시 멈춘 게 느껴져서.
일방적 권능과 무방비 상태로 그 권능에 희생되어야 하는,
보나마나 2026에도 이어질
불가해할 정도로 편파적인 힘의 구조가
잠시 멈춘 게 느껴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