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베리 따는 사람들 ㅣ 서사원 영미 소설 2
아만다 피터스 지음, 신혜연 옮김 / 서사원 / 2024년 11월
평점 :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에 살고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여름이 되면 블루베리 따는 일을 하기 위해 미국 메인주로 내려와 몇 달간 농장 일을 하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곤 했다고 한다. 이 소설의 작가 아만다 피터스는 이 블루베리 농장의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원주민 혈통인 작가의 아버지에게서 들었고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는 게 어떠냐는 아버지의 추천으로 첫 소설에 담아내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사게 되었다. 블루베리 좋아하는데 블루베리 따는 사람들이 나오는 소설이라고? 하면서... 아주 단순한 이유였다. 게다가 책 표지도 예뻐서^^
1962년 메인주로 블루베리를 따러온 원주민 가족은 4살 난 막내딸 루시를 잃어버린다. 온 가족이 블루베리를 따기 위해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 어린 루시는 가만히 길가 바위 위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이다. 루시의 실종으로 가족은 커다란 상실감에 빠진다.
루시 바로 위 오빠 조는 루시와 가장 친했고 루시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다. 그런 조에게 루시의 실종은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 있게 되었고, 게다가 몇 년 후 조의 형 찰스까지 조가 보는 앞에서 억울하게 죽게 되자 조의 삶은 망가진다. 동생의 실종과 형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갔던 것이다. 술을 과하게 퍼먹고 갑자기 불쑥 솟아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기 일쑤. 그러다 저지르는 짓은 부인을 향한 폭력이었다. 이에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못 견뎌 가족을 버리고 도망쳐서 평생 대륙을 횡단하며 이일 저일 육체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실종된 루시는 메인주의 어느 백인 부부가 기르고 있다. 노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자꾸만 루시였을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어머니한테 그때의 기억을 말하면 어머니는 그건 자다가 꾼 꿈일 뿐이라고 달래준다. 노마가 왜 자신은 부모와 다르게 피부색이 짙은 거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이탈리아계라서 그런 거라고 둘러댄다. 노마는 밖에서 또래들과 놀지 못하고 부모의 과잉보호를 받으며 집안에서만 가둬져서 성장한다. 집안의 분위기는 늘 숨막힐 듯 침울하고 노마의 어머니는 노마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노마를 사랑해준다. 보호를 받고 부유하게 양육되었지만 노마의 마음속에는 어쩐지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미묘한 거리감과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모른다는 답답함, 어디서 비롯된 건지 알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득하다.
이런 조와 노마의 시점을 왔다 갔다 하며 서로 만나지 못 하고 생사도 모르는 50년의 시간을 이야기 하는 소설이다.
소재만 보면 과연 이 가족이 감춰진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사건을 파헤쳐 누군가 벌을 받게 되는지 등등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지만 이 소설은 그런 식의 방향을 선택하지 않는다.
조와 노마가 서로를 잃고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살아가는지를 조용하게 따라가는 이야기이다.
이 소설을 읽다보면 멀쩡히 가족이 있는 어린 루시를 데리고 와서 노마라고 부르며 루시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한다는 설정이 예전에 미국과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행해졌던 원주민 기숙학교 제도를 떠올리게도 한다. 부모로부터 어린 아이들을 거의 빼앗다시피 데리고 가서 기숙학교에 집어넣고 원주민 문화를 말살하려 했던, 원주민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하면 체벌을 가하여 영어만 쓰도록 교육했다던 그 시대의 끔찍한 역사 말이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견뎌야 했던 상처의 기억들을 소설 속에 녹여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읽히는 소설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평은 별 셋.
조금 슬프고 적당히 아름다운 문장에 중간정도 재미있는 소설로 나는 읽었다.
사실 불만도 있었다. 캐릭터에 더 깊이 들어갔으면 더 슬펐을 것 같고, 이야기가 더 다채로웠다면 훨씬 재밌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 섞인 불만이었다. 밋밋해서 확 끌어당기는 힘이 부족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길지 않은 소설인데도 느리게 읽게 된다. 왜냐하면 읽고 있으면 이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겠구나, 앞날이 훤히 예상되고 그것이 별로 새롭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소재로는 좀 더 독한 맛을 보여줘도 되었을 것 같은데 말이다.
(사실 내가 조이스 캐롤 오츠의 소설을 읽고 나서 이 책을 집어 들어서 밋밋하다 느낀 것일 수도 있다. 아무래도 오츠 여사님의 독한 맛에 중독되었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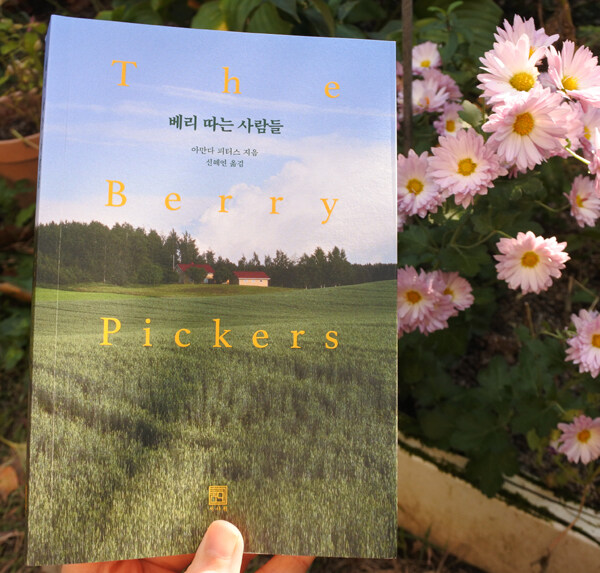
책 표지는 참 예뻐서 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