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에는 인문서에 우선순위를 매겨본다. 진중권 교수의 책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개정판이나 새 판본을 내는 것이었는데, 이번 <미학 에세이>는 새로 만든 진짜 새책이다. 씨네21에서 연재한 연재분을 모아 낸 책이므로 현대미학강의 시리즈와 헷갈리면 안된다. 다른 책이니까. 따로 한번 포스팅을 마친 미셸 옹프레의 <우상의 추락>도 강추할만 하다. 포스팅 한 후 그 주 각종 신문에서 앞다퉈 문화면에 실었더라. 내 눈에 좋은 책이 남 눈에도 좋은 건 대부분 드문 일인데 이 책은 남 눈에도 좋은 듯! <절망의 인문학>은 52명의 인문학 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현 인문학의 감춰진 진실이나 문제점을 얘기해 본 책이다. <희망의 인문학>과 대비되는 제목만큼이나 문제의식도 강하다.



니체는 생전에 자신의 시들을 시집이라는 카테고리로 발간한 적이 없다. 그래서 니체 전집에는 그의 시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제 그 시들을 흩어짐 없이 일본 무자리온판 니체전집 중에서 시를 모아놓은 제20권을 번역한 <니체전시집>을 참고로 하면 될 것이다. 알랭 바디우의 <투사를 위한 철학>은 얇은 팸플릿 형태의 책이다. 앞으로 이런 책들이 더 많이 출간 될텐데, 굵직한 학자들의 책을 중심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이 책은 철학과 정치와의 관계를 다룬 저작인데, 알랭 바디우의 저서중 가장 쉽게 쓰여진 편이라고 한다. <아름다움>은 영국의 미학자 로저 스크러튼의 책이다. 말 그대로 아름다움에 관한 예술철학책으로 보면 되겠다.






그 외 눈에 띄는 인문서로는 미셸 마페졸리의 <디오니소스의 그림자>와 사이 시리즈 새 책인 <이미지를 넘어> 그리고 개정판이 나온 <철학의 고전> 등이 있다. 나머지는 학술서의 느낌이 강한데 특히 <현상학과 해석학> <탈모더니즘 시대의 인문학>은 더더욱 그렇다. 뒤에 거론한 책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목차를 수록하고 있어서 올려둔다.



<여왕의 시대>는 한창 50프로 할인으로 스테디셀러더니 판을 달리해 나왔다. 살사람 다 산것 같은데... <독일인의 발자취를 따라>는 한국외대 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더 교수의 연구서다. 한국에 있었던 독일인들의 자취를 따라가보는 여정이다. <설탕, 세계를 바꾸다>는 설탕에 관한 지구사, 문화사다. 향신료의 역사를 다룬 <스파이스>와는 또 다른 맛인 단맛나는 책이 될 듯 하다.



표지부터 섬뜩한 <절벽사회>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이젠 옛일이 되버린 한국사회를 질타하는 사회비평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꼼꼼히 추렸다. <희생의 시스템 후쿠시마 오키나와>는 일본의 대표적인 희쟁지(?) 두 곳을 조명한 일본사회비평서다. 비평서일까 분석서일까 아리송하다. 국회의원 신경민의 <국정원을 말한다>가 나왔다. 아무래도 언론인 출신 의원이므로 이런 책을 쓰기엔 딱일 듯 하다. 국정원이 어떤 조직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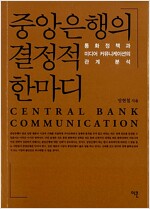

경제에서는 오스트리아 학파를 다룬 <대중을 위한 경제학>과 화폐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화폐 없는 세계는 가능하다>가 눈에 들어온다. <중앙은행의 결정적 한마디>는 중앙은행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화폐, 금융시스템에 대해 짚어본다.



과학에서는 중국인 저자가 쓴 <종의 기원을 읽다>가 신선하게 다가오고 그 종의기원의 저자인 찰스 다윈이 쓴 <비글호 항해기>는 또 더욱 신선하다. 이게 번역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글호 항해기>는 실물도 대단히 묵직하다. 다만 진짜 항해기 형식이므로 관심이 있어야 재미있을 듯. 스티븐 호킹 평전이 얼마 전 나왔는데 <나, 스티븐 호킹의 역사>가 나왔다. 저자도 스티븐 호킹이라 거의 자서전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소설이 별 다른게 없어서 뒤로 밀렸는데, 한국소설중에는 구효서의 <별명의 달인>이 이 주에서는 가장 돋보인다. 그 외 조영아의 <헌팅>과 민혜숙의 <목욕하는 남자>정도.






일본소설이 괜히 관심이 가는게 하나 있는데 바로 현암사에서 펴낸 '나쓰메 소세키 소설 전집'이다. 2016년 나쓰메 소세키 100주기에 발맞춰 간행하는 시리즈로 이번에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도련님> <태풍> <풀베개> 이렇게 네 권이 먼저 나왔다. 총 14권으로 완간예정이다. <결괴>는 1998년 아쿠타가와상 수상작가인 히라노 게이치로의 신작이다. 작년에 <얼굴 없는 나체들>이 번역 된 바 있고 1975년생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신진작가군에 속한다.



독일소설로는 토마스 만의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이 부북스에서 단일작품 단행본으로 처음 나와다. 열린책들과 민음사에서는 다른작품과 묶여있다. <여덟살때 잠자리>는 프랑스 작가 마르탱 파주의 작품이다. 블랙유머가 넘치는 소설이라고 하는데 나는 잠자리인지 자는 잠자리인지 모르겠다. <신의 농담>은 국내에서는 보기드문 캐나다 문학이다. 이미 <스톤엔젤>이 번역된 바 있는 마가렛 로렌스의 작품이다.



장르문학의 냄새가 풍기는 세 권의 소설도 추려봤는데, 현대문학에서는 메리 러셀 시리즈로 로리 R. 킹의 <메리 러셀, 셜록의 제자>를 펴냈고 스웨덴 작가 안데슈 루슬룬트가 쓴 <리뎀션>도 볼만하다. 북유럽 작가의 장르물이 작년 올해 많이 번역된 듯 싶다. <9번의 심판>은 '우먼스 머더 클럽' 시리즈로 나온 책인데 미국 작가 제임스 페터슨과 맥심 패트로의 역작이다.



에세이에서는 시인이자 비평가인 장석주의 동양고전 에세이인 <아들아, 서른에는 노자를 만나라>가 눈에 띄고 헤르만 헤세의 <그리움이 나를 믿고 간다>도 늦게 발견한 괜찮은 에세이다. <주먹으로 꽃을 꺾으랴>는 이른바 마지막 협객으로 불린다는 전직 주먹 신상현씨의 에세이다. 유지광씨 밑에서 일하던 신상사라는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다.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올려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