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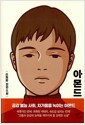
-
아몬드 (양장) - 제10회 창비 청소년문학상 수상작
손원평 지음 / 창비 / 2017년 3월
평점 :

절판

행동발달장애(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그리고 알렉시티미아 이것 말고도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한 증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 감정뿐 아니라 남의 감정도 잘 모른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도 있겠다. 혹시 이런 사람 가운데 편도체가 작은 사람도 있을까. 어렸을 때 정서 발달 단계를 잘 거치지 못하거나 트라우마를 겪어도 그럴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은 기쁘고 아프고 슬픈 사람을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상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못 본 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 이건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맞거나 누군가한테 칼부림 당할 때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나도 위험에 빠진 사람 구하지 못할 것 같다. 할 수 있는 한 그런 일과 맞닥뜨리지 않기를 바란다.
감정을 아예 느끼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른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똑같지 않다 해도 난 슬픈 걸 보면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재미있는 걸 보면 웃고 무서운 걸 보면 무섭기도 하다. 그래도 난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사실은 잘 모르는 것도 있다. 그게 어떤 건지 말하기 어렵지만. 그건 감정이라기보다 마음인가. 내 마음보다 남의 마음. 언젠가 이런 말을 들었다. 남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나도 그럴지도. 가끔은 말하지 않은 걸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주 잘못 생각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남의 눈치란 걸 오래 봐서 지금은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솔직히 말하면 잘 몰랐으면 싶기도 하다. 난 곤이하고 비슷한 마음이구나. 감정 때문에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많다. 괴로우면 괴로운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 시간이 흐르면 그런 게 조금은 덜하겠지만.
이 소설은 태어나면서부터 편도체가 작아 감정을 모르는 아이 선윤재와 어렸을 때 부모와 헤어졌다 다시 만나게 된 곤 이야기다. 윤재는 그것을 괴물인 자신이 다른 괴물을 만났다고 한다. 윤재는 어렸을 때 웃지 않는 아이였다. 엄마는 그런 윤재한테 감정을 가르치려 애쓴다. 할머니는 윤재를 예쁜 괴물이라 한다. 윤재한테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해도 엄마와 할머니는 윤재를 사랑했다. 셋이 함께 산 건 윤재가 열여섯살일 때까지지만. 윤재가 태어난 날은 크리스마스이브였다. 그날은 셋이 밖에 나가 냉면을 먹고 엄마와 할머니가 먼저 가게를 나갔는데, 망치와 칼을 든 사람한테 엄마와 할머니가 공격을 받았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었다. 윤재는 자신이 할머니와 엄마를 구하지 못한 걸 그렇게 슬퍼하거나 화내지 않았다. 할머니는 윤재가 가게 밖으로 나오는 걸 막았다. 윤재는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도 잘 몰랐구나.
다른 아이 곤(본래 이름은 윤이수)은 어렸을 때 엄마와 어딘가에 갔다가 엄마와 떨어졌다. 곤 엄마 아빠는 아이를 잃어버려서 힘들어하고 엄마는 병까지 나서 죽고 만다. 곤이 엄마가 죽기 전에 곤을 찾았는데 곤이 아빠는 곤을 엄마와 만나지 못하게 했다. 곤이 아주 거칠어서였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아이를 찾고 싶어하면서도 막상 찾으면 달라지기도 한다. 어렸을 때와 달라진 모습을 부모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살아있다는 게 어딘가.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잠깐 곤이 노릇을 하고 곤이 엄마를 만난 건 윤재였다. 곤은 그 일에 화가 났는지 윤재를 잠시 괴롭혔다. 그러다 둘이 사이가 조금 좋아진다. 친구가 생겨서 곤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곤은 자꾸 엇나갔다. 곤이 그렇게 된 건 둘레 사람 탓이기는 했다. 아빠가 먼저 곤을 놓아서였다.
부모라고 아이를 다 사랑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부모에서 엄마가 더 아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나 싶기도 하다. 윤재 엄마를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든다. 곤이 아빠가 그런 건 아직 아빠가 되지 못해서가 아닐까 싶다. 곤이 어렸을 때 헤어지고 몇해 동안 함께 살지 않다가 같이 살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다. 곤이 좀 얌전했다면 곤이 아빠가 조금이라도 말하려 했을지도. 곤은 화를 바깥으로 드러냈다. 아니 그건 사랑받고 싶다는 다른 말이었다. 윤재는 감정을 잘 몰라도 남을 평가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그건 참 좋은 거다. 곤이 윤재를 자주 찾아간 건 그래서겠지. 윤재가 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얼마 없었지만, 윤재는 친구로 곤을 구했다. 큰일이 일어난 다음이지만 곤 아빠는 곤과 마주하려 한다. 곤 아빠가 곤을 한번 놓았지만 다시 잡아서 다행이다. 곤은 아주 나쁜 아이는 아니었다. 그걸 알아 본 사람은 윤재뿐이었구나. 윤재도 곤이 어떤지 알려고 애써서 알게 되었다.
작가는 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고 다른 사람 입을 빌려서 말한다.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건 자신뿐이지만 자신을 구하려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마음이 따듯하겠지(윤재는 엄마와 할머니한테 사랑받은 것과 곤과 도라를 만나고 감정을 조금 알게 된다).
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