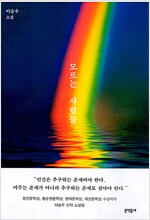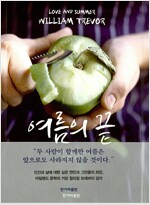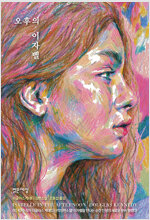기다리지도 않았던 2022년이 어느새 오더니 벌써 1월이 끝났다. 별로 한것도 없이 시간만 지나가는 거 같아서 슬프기만 하다. 그래도 남는건 읽은 책과 독서기록 뿐이니 위안을 가져 본다.
2022년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지 했는데, 1월에는 책만 많이 샀을 뿐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했다. 1월을 정리해보니 독보적 미션은 31일 완료했고, 읽은 책은 18권, 리뷰도 18권에 대해서는 다 쓰긴 했다. 질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 때문에 시간에 많이 쫓긴 1월이어서 그런지 독서에 집중하지 못한 한달을 보냈다는 기분이 든다.
(이유경 작가님 책은 아직 읽고 있는 중이다...)
그래도 한가지 위안은 전작하기로 한 일곱 작가의 책을 공평하게 한작품씩 읽었다는 것이다. 왠지 전작하고 싶은 작가가 계속 늘어나는 기분이 들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분일 뿐이다.
(전작 리스트 : 윌리엄 트레버, 필립 로스, 나쓰메 소세키, 에밀 졸라, 로맹 가리, 프랑수아즈 사강, 가르시아 마르케스)
2022년 부터는 아래와 같이 좋았던 책을 선정해 보기로 했다.
‐-------‐------‐---------------
1월 가장 좋았던 책 :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
이 책을 읽는 내내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고, 무작정 한 사람만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주인공의 모습이 왠지 안쓰럽지만 공감할 수 있었다. 50년도 기다렸는데 질병 따위야 문제가 되겠냐는 마르케스식의 사랑법은 감동적이었다.
‐-------‐------‐---------------
‐-------‐------‐---------------
1월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
˝윌리엄 트레버˝의 <여름의 끝>
언젠가 여름이 오고, 누군가에게 책을 선물하게 된다면 이 책을 하고 싶다. <펠리시아의 여정>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훨씬 좋았다. 잔잔하면서도 진한 여운이 남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읽으면 좋아하실거라 확신한다.
‐-------‐------‐---------------
2월은 좀 짧으니까 16권 완독을 목표로 책을 읽어야 겠다. 그리고 구매는 10권 이하로 해야겠다.(안산다는 거짓말은 차마 할 수 없다...) 플친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s. 2022년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캘린더에 있는 문장들을 필사중이다. 글씨를 너무 못써서 이걸 필사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매일 매일 다른 작품들의 좋은 문장들이 쓰여져 있는데, 1월에 나온 31편의 작품 중 22편이 읽은 책이었다. 그래도 나름 읽은 책이 많이 나와서 뿌듯했다. 2022년에는 매일 빼먹지 말고 써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