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몇 권을 쭉 나열하고 거기에 대한 평을 하는 글을 한번도 써본 적이 없다.
그런 글은 로쟈님처럼 책에 관해 일가를 이룬 분들이 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갑자기 그런 글을 쓰는 이유는 작년 말, 내가 드디어 책에 관해 일가를 이뤘기 때문이다.
물론 그냥 해본 소리다.
2012년은 근래 들어 책을 가장 적게 읽은 해인데 무슨 일가를 이뤘겠는가?
그럼에도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생각해보니 이런 글이라는 게 꼭 일가를 이뤄야만 쓰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데 생각이 미쳤고,
내가 하려는 말이 이런 글의 형식을 취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작년 후반기, 문학동네로부터 책선물을 받았다.
문학동네는 심윤경의 명저 <사랑이 달리다>를 비롯해 많은 책을 낸 메이저 출판사,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거기서 내게 책 몇 권을 선물해 줬다.
책선물을 해준 출판사가 여기만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그 책들은 하나같이 내 스타일이었고,
덕분에 난 책에 파묻힌 채, 아주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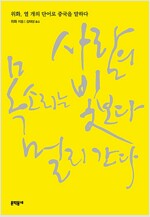
맨 처음 읽은 책은 위화의 <열개의 단어로 중국을 말하다>였다.
이 책은 중국에 대한 위화의 생각을 담담히 풀어놓았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문화대혁명 시절 중국의 풍경이었다.
마오쩌뚱의 책을 제외한 모든 책이 금지되던 그 시절,
책에 대한 갈망으로 번민하던 위화는 친구와 함께 밤을 새며 책을 베꼈고,
앞뒤가 뜯겨져 나간 책을 읽으면서 결말을 상상했단다.
혁명이 끝나고 난 뒤 책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을 묘사하는 대목에선
스마트폰에 매몰되어 책을 멀리하는 요즘의 우리 사회가 생각나 씁쓸했다.

다음으로 읽은 책은 내가 처음 접하는 이혜경 작가의 <너 없는 그 자리>.
단편집이라 내 취향에 안맞을 듯했지만 웬걸, 첫 작품부터 대박이었다.
“경원씨가 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그저 한때 같은 직장 동료였을 뿐이에요.”라는 대목을 읽었을 때,
“이 작가 소설 참 재미있게 쓰네!”라며 감탄했다.
그 뒤의 소설들도, 첫 번째 소설만큼 신선하진 않았을지라도, 다들 한방이 있었던 기억이 난다.

세 번째 책은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의 <천국의 수인>.
이름만 들어봤을 뿐 이 작가의 책을 읽는 게 처음이라 부끄러웠는데,
평범한 서점에서 출발해 숨막히는 스릴러로 독자를 이끄는 사폰의 솜씨가 일품이었다.
너무 감동한 나머지 독후감을 연재하는 잡지에 이 책을 읽는 소감을 써서 보냈다.
독후감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다.
“우리 모두 멘토가 돼보자. 마침 아는 게 많지 않은 분이 새 대통령이 됐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나머지 두 권은 노벨상 수상 작가인 모옌의 <열세 걸음>과 <나는 줄리언어산지다>인데, 현재 모옌의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중.
노벨상을 탄 작가라 어려울 줄 알고 지레 겁을 먹었는데, 아직까진 내 스타일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읽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사서 읽은 <당신들의 기독교>도 문학동네 거다.
133쪽밖에 안돼서 “이렇게 얄팍한 책을 만들다니!”라며 잠시 씩씩거렸는데,
한줄 한줄의 의미가 천근처럼 무거워 다 읽는 데 웬만한 책보다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그가 오입(悟入)과 오입(誤入)을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36쪽)에서 좀 찔렸고-나 역시 혼동하고 있었으므로-
내가 보기엔 신실한 신자인 의사 G에 대해 “비평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91쪽)라는 대목에선 제대로 된 기독교도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깨달았다.
기대와 달리 무조건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은 아니지만,
이 책 덕분에 기독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과거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 대해 특별히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내는 책마다 다 나랑 코드가 맞다니, 난 문학동네 스타일인가보다.
* 참, 내가 좋아하는 고종석 작가의 <해피 패밀리>도 여기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