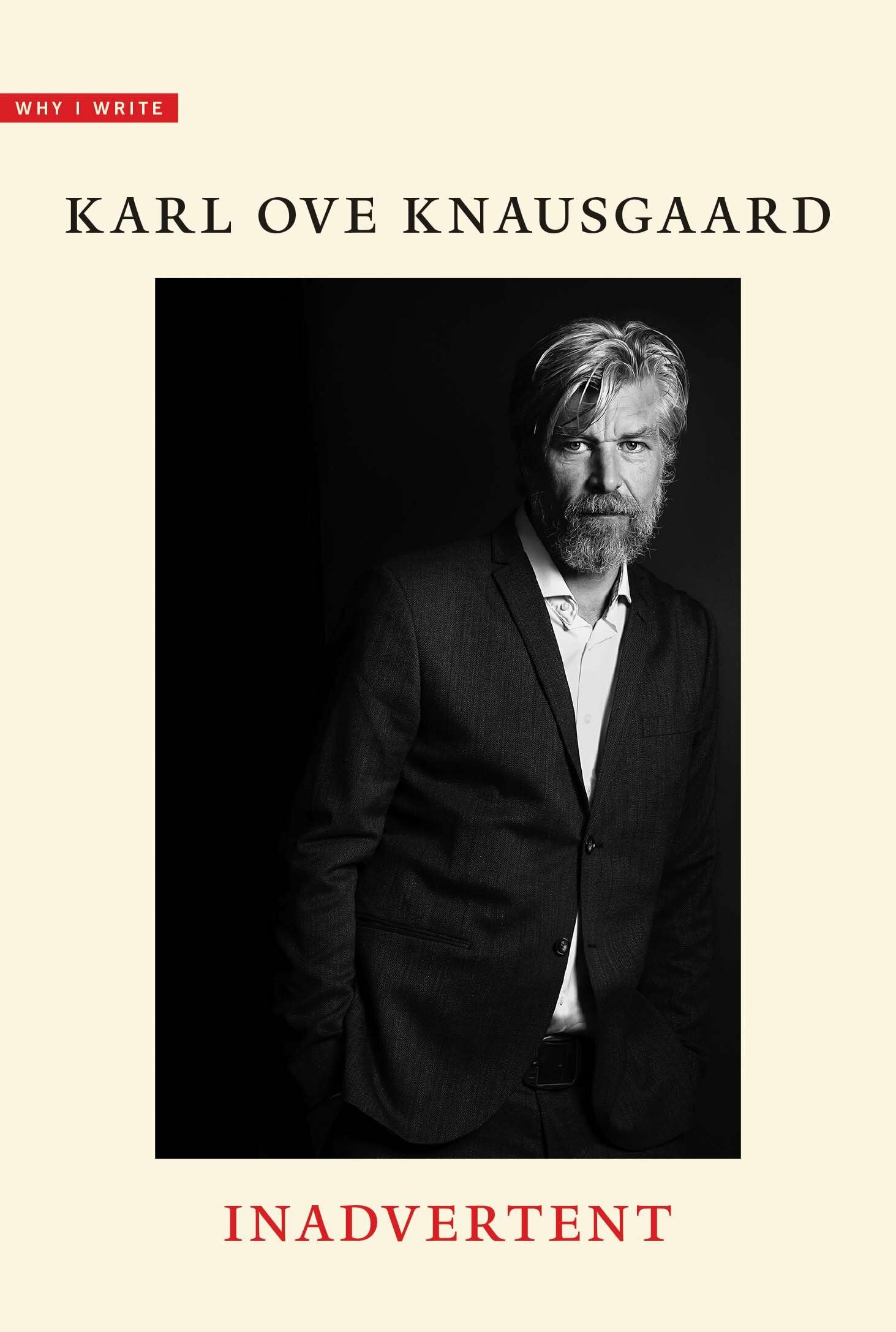
예일대가 주관하는 문학상이 있나 봄. 매년 시상식이 열리는데
시상식에서 수상 작가가 Why I Write 주제로 강연을 한다고. 몇년도 수상인지 모르겠지만 크나우스가드도
수상했고 그의 강연은 18년에 책으로 나왔다.
audible이 무료 방출 안했다면 지금 만나지 못했을 책이다.
지금 만날 수 있었다는 게, 고맙게 느껴진다. 책을 공짜로.... 정말 감사하다. 양잿물도 감사할텐데 책이.
일단 시작은 미미하다. 이러는 것도 그의 고유 스타일일 거라 짐작 되는데
"나는 왜 쓰냐고? 이 주제를 앞에 놓고 나는 사흘 동안 아무 진척도 내지 못했다. 내가 떠올릴 수 있던 건
몇 년 전 TV에서 보았던 어느 작가가 다였다. 그는 스튜디오에 나오면서 "나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씁니다 I write because I am going to die"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바지 바깥으로 삐져 나온 셔츠를 바지 안으로 집어 넣었다. 나는 웃었다. 그가 한 말의 그 엄중함과 그의 행동의 그 일상성 사이 간극이 날 웃게 했다"
저렇게 시작한다.
사실 미미함이 끝까지 지속되는데
그런데 그 미미함이, 격렬한 진정성과 함께 하는 미미함?
미미함의 닻 덕택에 간신히 진정되는 진정성의 폭풍?
<나의 투쟁> 1권은 사두었으나 읽지 않음. 그가 뉴욕타임즈였던가에 썼던 긴 미국 여행기가 있는데
그것에 강렬한 인상 받지 않았었다. 아휴 그냥 침울한 아저씨네.... 정도 끝. 크나우스가드와 인연은
이게 다인데, 그런데 이 강연 들으면서 그의 매력이 무엇인가 알 거 같았고, 그 매력이 내내 있다면 <나의 투쟁>은 국제 센세이션 될만한 책이겠구나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는, 21세기초 베스트셀러로 23세기까지 읽힐 드문 책 아닐까, 읽지도 않은 책을 망상 속에 평가함.
위의 미미한 시작에 이어 그는 이렇게 말한다.
"I write because I am going to die. 이 말이 합당하게 표현되고 그 말이 받아 마땅한 반응을 받으려면, 이 말에
담긴 진실이 전해지려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먼저 창조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글쓰기다. 우리가 말을 할
공간을 창조한다는 것. (That is what writing is: creating a space in which something can be said)."
글쓰기 = 우리가 말을 할 공간을 창조한다는 것.
강연 서두에서 이렇게 못박고 나서, 이어지는 강연 내용 전부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해명하는 데 바쳐지는데
적당히 진부하고 (이렇게 말하면 욕같지만, 칭송으로.... 하는 말이다. 딱 알맞게, 딱 절묘하게, 마치 진짜 진부함이 아니라 진부함에 대한 사유이고 논평인 것처럼....), 동시에 예측 불허로 열정적이다.
우리가 말을 할 공간을 창조한다는 것.
이것 정말 실은 엄청난 전언이지 않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