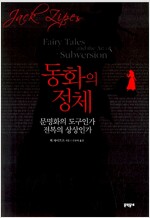<동화의 정체> 6장을 읽고 있다. 6장의 제목은 '희망이 세상을 바꾼다 : 조지 맥도널드, 오스카 와일드, 프랭크 봄의 동화들'이다. 절망의 연속인 현실세계지만 '희망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엊그제 읽은 조지 맥도널드 부분은 이미 희미하게 지워진 기억으로 존재(하기는 하니)의 흔적을 남긴 상태에서 오늘 오스카 와일드 부분을 읽었다. 오스카 와일드, 그러고 보면 유명한 동화 <행복한 왕자> 말고 읽은 게 뭐가 있지? 책을 읽으면서 아아 행복한 왕자를 오스카 와일드가 썼지, 했으니 뭐 말 다했지.
이 책 <동화의 정체>에는 각 장마다 인용구가 배치되어 있다. 이 인용구들이 만만치가 않아. 6장의 인용구는 다음과 같다.
미래는 가능성의 형태만을 취한다. 미래의 가능성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은 당위('반드시')이다.
미래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할 때 - 순수하게 형식적인 방식으로 체계화되고 합리화된 지식을 제외하면 - 미래는 통과할 수 없는 매질이나 단단한 벽처럼 보인다. 벽의 반대편을 보려는 노력이 좌절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와 함께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당위(유토피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미래에 걸려 있는 이익과 의무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간직하고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며, 이를 통해 역사에 대한 최초의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미래는 가능성의 형태만을 취한다. 미래의 가능성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은 당위('반드시')이다.
미래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할 때 - 순수하게 형식적인 방식으로 체계화되고 합리화된 지식을 제외하면 - 미래는 통과할 수 없는 매질이나 단단한 벽처럼 보인다. 벽의 반대편을 보려는 노력이 좌절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와 함께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당위(유토피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미래에 걸려 있는 이익과 의무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간직하고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며, 이를 통해 역사에 대한 최초의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 카를 만하임(Karl Mannheim)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Ideology and Utopia』 (1939)
내 경우, 사회의 모습, 세상이 돌고 있는 장면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각 장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참을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다.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생각들 사이에서 방황하는 처지라 또렷한 답이나 방향을 찾기는 어렵지만 고민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인용구를 각 장의 내용에 적절하게 뽑아낸 저자에게 감탄하고 고마워한다.(각 장 앞의 인용구 뿐만 아니라 글 사이사이에도 엇! 싶은 구절들이 많다. 질문을 던지게 되는.) 마침 독서모임에서 한 분이 '이데올로기/유토피아' 화두를 던져주셔서 생각하던 차였다. 펼친 책에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라고 나와서 더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다. 모든 말과 글을 내 경우에 가져다 대입해보는 습관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내 경우를 생각하고 주변 사람의 경우를 생각하고 이 사회의 경우를 생각하고 다른 사회의 경우를 생각하고. 그렇게 경계를 넓혀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경우에만 대입하고 거기에 머무르며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늘 염두에 둔다. 그러나... 생각하는 만큼 행동하는 사람은 드물다. 나도 마찬가지다.ㅠㅠ
음음 아무튼, 오스카 와일드. 이 부분을 읽고 나니 오스카 와일드의 책들을 읽고 싶어졌다. 가진 건 없고 전자도서관에 있는 책을 일단 찜해둔다. <행복한 왕자>를 한번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못했는데 역시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말은 동화를 읽고 단순하게 권선징악만 생각했을 뿐 그 이면의 의미에 대해서는 고심해보지 않았다는 말이다. 맘에 안 들어!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이런 반응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말이다. 해석이나 작품해설을 보고 난 후에 그 작품을 다시 읽을 필요를 새기게 되는 지점이다. 그런 경험 있지 않나? 소설을 한 편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를 때, 그 소설을 해석한 비평가의 글을 읽으면서 아! 그런 이야기일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어쩌면 그 또한 작품을 보는 눈을 한편으로 치우치게 하는 하나의 지침(?)이 되기도 할 테지만. (그러므로 작품 해설을 읽을 때조차도 한쪽으로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잣대를 잘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그러려면 잣대를 잘 세워두어야 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한다는... 도돌이표의 굴레...@@) 어쨌거나 그래서 <행복한 왕자> 등의 동화들부터 다시 읽어보고 다음으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읽을...까 말까 하면서 도서관 보관함에 담아두었다.
"유토피아가 그려지지 않은 지도는 쳐다볼 가치도 없다. 인간성( Humanity)이 정박하는 나라는 유토피아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토피아에 정박한 인간성은 세상을 둘러보다가 더 좋은 나라가 눈에 띄면 닻을 올린다. 진보란 유토피아의 실현이다." - 225 (오스카 와일드 『사회주의 하에서의 인간의 영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