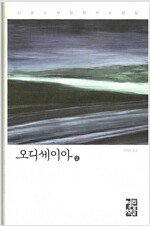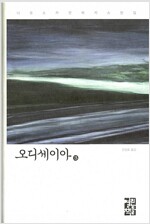자유, 自由, Ελευθερία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
나는 자유다.
Den elpizo tipota.
Den fopumai tipota.
Eimai eleftheros.
- Nikos Kazantzakis‘s Epitaph
King Crimson 의 Epitaph 이 떠오른다.
˝나는 이제 연장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것은 두렵거나 지쳤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해가 저물었기 때문이다.˝
- 임종 직전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메모에서
시골의사 박경철.
지금 무얼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나보다 훠얼~~씬 더 잘 살고 계시겠지만.
그리스문명 강연도 하시고, 찰스님과 포옹도 하시고 했었는데.
그리스 기행1-문명의 배꼽 그리스 이 나올때 무지 기대했었다. 기뻤다.
이 멋진 책을 앞으로 아홉권이나 더 읽을 수 있으니 말이다.
두번째 권 초고도 마친 상태라 했으니!
기대는 한없이 컸으나, 이 후 출간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 10년이 지났다.
사람일은 알 수 없다 했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 😢 😥
문명의 배꼽 그리스 에필로그 p.432
2011년 겨울부터 첫 발을 뗀 이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그리스 전체를 횡단하며 발길 닿는 곳에서 시간의 강을 종단하는 이 여행은 펠로폰네소스에서 시작해서 아테네가 속한 아티카(그리스 북부)의 테살로니키 그리고 고대 그리스 권역을 아우르는 마그나 그라이키아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각각의 여행은 제1부 펠로폰네소스 편 세권, 제2부 아티카 편 네 권, 제3부 테살로니키 편 한 권, 제4부 마그나 그라이키아 편 두 권 등 모두 열 권의 책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는 지금, 제2권의 초고 집필을 마친 상태이다. 짐작건대 2013년 한 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행과 집필의 시간들로 채워질 듯하다. 모쪼록 이 여행이 필자인 나는 물론이거니와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바란다.
박경철님과 오달수님 이미지가 비슷하다.
나만 그런 것인가? 사진 올리고 싶지만 참는다.
King Crimson 의 Epitaph
The wall on which the prophets wrote
Is cracking at the seams
Upon the instruments of death,
The sunlightbrightly glea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