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는 맨손으로 학교 간다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지음 / 양철북 / 2013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은 새로운 선생님과 새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가 조성되지만, 곧 학생들은 적응을 하게 되고, 교실은 왁자지껄 생동감이 넘쳐 흐르게 된다.
그러나, 이전의 학교나 교실에서 왕따였던 학생은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되고,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얼마 전에도 그런 학생의 죽음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학교에서, 가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펴 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전에 읽은 <우리반 일용이>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한 가족처럼 생활하는 이야기를 담은 교실일기였는데, 문장력이 뛰어난 작가의 글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진솔한 이야기들이었다. 그 이야기들 속에는 선생님의 함박웃음과 미소, 눈물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런 선생님들만 있다면 학교 폭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선생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교실이기에.
이 책과 함께 '한국글쓰기 교육연구회'에서는 또 한 권의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이 바로 <우리는 맨손으로 학교 간다>이다.
이오덕 선생님을 중심으로 전국 초, 중, 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삶을 가꾸는 글쓰기'를 하는데, 이 글들은 1983년부터 201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서 다달이 <우리 말과 삶을 가꾸는 글쓰기 >회보에 실렸었다. 그중에서 뽑은 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책이 <우리는 맨손으로 학교간다>이다.
그러니, <우리반 일용이>와 <우리는 맨손으로 학교간다>는 같은 맥락에서 쓴 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맨손으로 학교 간다>는
제 1부는 교실에서, 골목길에서, 들로 나가 아이들과 함께 지낸 이야기를 담은 글이고,
제 2부는 아이들과 글쓰기하면서 서로 마음 나눈 이야기를 담은 글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글과 초등학생들의 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잘 쓰려고 어른들의 글을 흉내내거나 미사여구를 늘어 놓지도 않는다.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글로 썼다. 선생님에게 말로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면서 아이들은 가슴 속에 담고 있었던 돌덩이들을 꺼내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좀처럼 내색하지 않고 있다가 아이들은 자신의 글에 이혼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쓰기도 한다.
그 글을 읽는 선생님은 지각을 잘 하던 아이가 왜 지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준비물을 챙겨 오지 않던 아이가 왜 그랬는가 등등의 아이들의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아이들의 글을 읽기 전에는 몰랐던 아이에 관한 상황들을 알게 되면서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아이들은 끈끈한 정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엄마 ( 반송초등 4학년 김나영)
어제 저녁 여섯 시에 /아름다운 용서를 봤다. / 거기선 엄마가 딸을 찾는다.
나는 속으로 / '버리고 간 애들 왜 이제야 찾노?'/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난다.
생각 안 할라고 해도 난다./ 엄마는 나를 두고 갔다. / 그것도 아기 때
엄마 얼굴도 모르는데 /이학년 때 찾아와서 /내가 니 엄마다 했다.
나는 왜 용서 못해줄까? / 속이 좁아서일까?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면 / 자동적으로 눈물이 흐른다. ( p.p. 269~270)
초등학교 1학년을 담임하게 된 선생님이 입학식날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준비를 하는 모습, 그리고 입학식날 학부모와 아이들에이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이런 경우에 접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마음일 것이다.
봄날, 들로 나가서 아이들과 쑥을 캐서 쑥떡을 해 먹는 아이들과 선생님.
어느날은 아이들에게 '내일은 맨손으로 올 것' 그리고 '오는 길에 예쁜 것이 있으면 하나만 가져 오기'라는 과제를 내주는 선생님. 그 다음날은 교실이 한가득 예쁜 꽃과 자연물로 가득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이들은 학교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읽다보니, 초등학교 4학년때인가 선생님이 생각난다. 그 선생님은 우리들의 미술시간을 즐겁게 만들어 주셨다.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날, 선생님이 내준 미술 준비물이 바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져와서 만들기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예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집에서 30 분 이상이나 떨어진 효창공원으로 갔다. 거기에서 솔방울을 따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기억이 있다. 다행히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서 엉덩방아 정도를 찧었지만, 그래도 예쁜 나뭇잎과 솔방울, 나무껍질 등을 준비물로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그 선생님의 예쁜 얼굴이 지금도 어렴풋이 생각난다.
이 책에 실린 글을 쓴 선생님들은 어떤 날의 이야기나, 어떤 상활에 대한 이야기, 어떤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 자신이 쓰고, 그 속에 그와 관련된 아이들의 글을 함께 담아 놓기도 했다.
같은 일, 같은 상황, 같은 인물에 대해서 각자가 쓴 글들은 같은 이야기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다른 이야기로 각자의 관점에 따라 쓰여지기도 했다.
이런 글쓰기가 바로 아이들을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바탕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숲 속 교실에서 읽은 <비오는 날>이란 글은 참으로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한 학습이야기이다. 시원스럽다 못해 아름답게 비내리는 날에 창가에 모여서 빗소리를 듣는 선생님과 아이들. 빗소리를 듣기도 하고 비 오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정서교육이 아닐까.
예전에 중학교에서 근무할 때에 나는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시간의 자투리 시간이나 종례시간에 책을 읽어준 적이 있다. 학생들 수준에 맞는 소설책을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 읽어 주었다.
처음에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던 학생들도 어느 정도 책의 내용이 전개되면 쥐 죽은듯이 조용히 이야기에 몰두했었다. 옆반 학생들은 그런 우리반을 부러워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한 권의 짧은 이야기가 끝나면 어떤 학생들은 책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했다. 다시 읽어 보고 싶다고.
이렇게 내 추억 속의 이야기는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는데, 그때의 아이들도 살면서 한 번 쯤은 그때를 기억하겠지.....
이 책 속의 이야기 중에 정말로 가족같은 고천분교 이야기가 있다.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모두 여섯 명의 학생과 두 명의 선생님이 계신 학교이다.
이 학교의 선생님은 목욕탕과 같이 가고, 때론 화장실에 간 아이를 따라가서 똥도 닦아 준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있는 감을 아이들과 함께 따먹기도 한다.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이 학생들과 시내 나들이를 가서 짜장면을 사 주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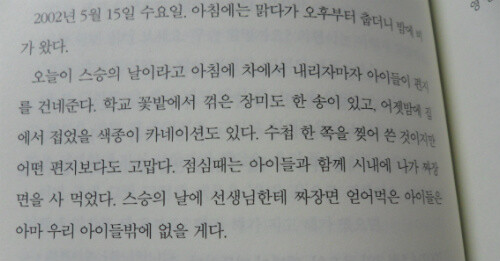
<우리반 일용이>와 <우리는 맨손으로 학교 간다>는 두 권의 책이지만, 내용은 한 권의 책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비슷한 내용들의 글이 담겨 있고, 책의 구성도 같다.
선생님들의 글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아이들의 글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표현하는 솔직함이 담겨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에도 이런 선생님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대도시의 학교가 아닌 작은 마을의 학교에서는 가족과 같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존재한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학교 생활을 되돌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교사는 천직(天職)이라는 말을 상기해 본다.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전달이 아닌,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선생님들 ! 힘내세요. 그리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