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머니스트입니다 :D
낡은 상식과 기존의 역사 인식에 도전하는 《하나일 수 없는 역사》의 서평단을 모집합니다!
《하나일 수 없는 역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한국사는 물론 세계사 교과서도 국정으로 발행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우리가 꼭 주목해야할 책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읽고 기억해야 하는지, 주체적인 역사 인식을 위해서, 다양한 시각자료와 함께 더욱 생생하게 역사를 읽어보세요.
그 어떤 금지도 독단도 터부도 없이 역사를 읽는다!
하나일 수 없는 역사
르몽드 '역사 교과서' 비평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획|고광식 김세미 박나리 이진홍 허보미 옮김|김육훈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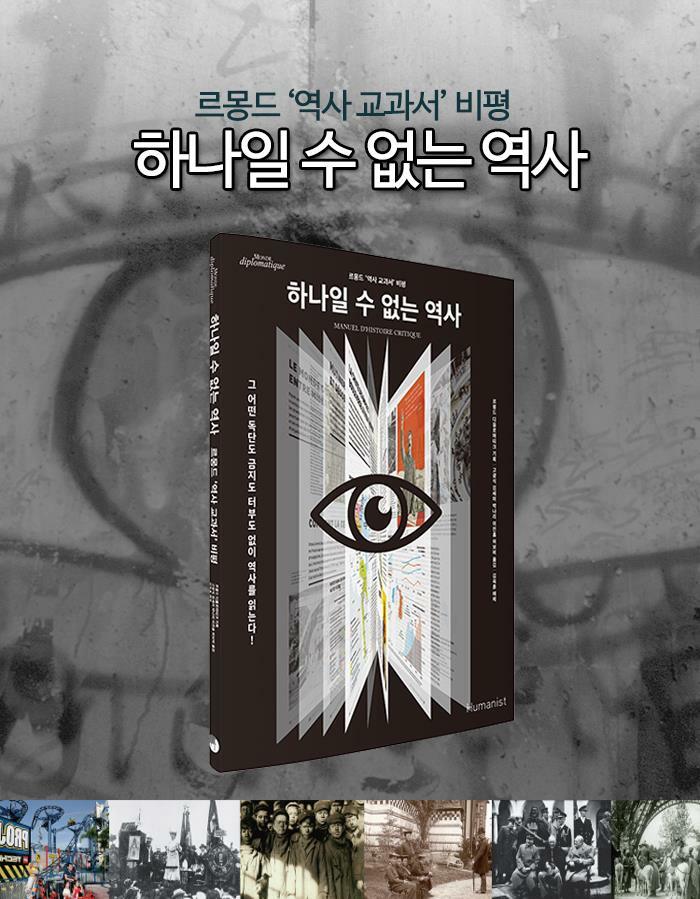
모든 학생이 국가가 만든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하고, 그 교과서에 논쟁적인 질문을 던지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역사 교육이 아니다. 권력이 앞장서서 정치적 쟁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은, 국민의 기억을 동제함으로써 그것을 의도하는 이들의 생각대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일이다.
낡은 상식과 역사 인식에 끊임없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 책은 역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다.
- 김육훈(역사교육연구소장, 역사교사)
《하나일 수 없는 역사》를 읽고 리뷰를 남겨 주실 서평단을 모집합니다. (5명)
* 서평단 신청 방법
1. 본 게시물을 본인의 블로그나 SNS에 스크랩해 주세요. (전체 공개)
2. 스크랩 주소와 함께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를 아래 댓글로 남겨 주세요.
- 모집 인원: 5명
- 모집 기간: 2월 10일 ~ 2월 16일
- 당첨자 발표: 2월 17일 금요일 예정 (휴머니스트 서재 공지)
- 도서 발송: 발표 게시물 비밀댓글로 당첨자 정보 취합 후 일괄 발송
* 서평단 활동 방법
1. 도서를 받으신 후, 일주일 내에 '알라딘 서재'와 개인 블로그 또는 SNS에 리뷰를 남겨주세요.
2. 당첨자 발표 게시물 댓글로 리뷰 주소를 남겨 주세요.
※ 도서 수령 후 리뷰를 작성하지 않은 분들은 이후 이벤트에서 당첨 제외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