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딱 15년 전, 이 책을 구입했다. 70000원.
책값만 놓고 봐도 나의 도서구매 역사에 한 획을 그을만한 책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잘 모셔두었다. 손때도 안묻었다. 명색에 사전인데 늘 손에 가까이 두고
수시로 들춰보고 해야 마땅했건만 절대 그러질 않았다. 쪽수와 두께에 질려서?
아니라고 할 수도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이나, 그래도 핑계를 대자면,
사전이니까 그런 것쯤은 감수하더라도 자주 꺼내 들춰볼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
한마디로, 여기에 수록된 현대소설 100년사 연표(1888 ~ 1988)에 해당하는 소설들을
거의 읽지 않았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저 핑계는 '개뿔' 된 것이다.
채만식의 <탁류>를 읽고 있고 현재 70쪽까지 나갔다. 모르는 말들이 수도 없이 나오지만 사전을 찾아가며 읽어야 할 정도는 아니다. 문맥 속에서 어렴풋이나마 정황이 그려지니까 내용전개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이다. 여기까진 그럭저럭 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더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71쪽부터 탁 막힌 것이다. '생애는 방안지(方眼紙)라' 라는 부제가 달려있고 96쪽에 이르러야 끝이난다. 요지는 당시 1930년대 노름판 풍경이다. 이 대목을 놓친다 해서 책 전반에 흐르는 맥락까지 잃을 정도는 아니다. 무슨 외계어도 아니니 문맥의 정황을 이해못할 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다해서 작품전체의 이해에 대단한 오독을 범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면 건너뛰면 되지 않을까? 20쪽 분량인데 까짓거 안읽으면 그만 아닌가. 하지만 시도도 안해보고 그러자니 뭔가 찜찜하여 차마 그럴 수도 없어 억지로라도 읽자는 마음으로 잘 다독여가며 읽었는데 읽다보니 이게 아닌 것이다. 내가 내 명에 못산다는 말이 왜 있는지 알 것 같다. 답답하게 치밀어오르는 그 무엇. 기역니은으로 된 빤한 글자들을 놓고 그 뜻을 해독할 수 없다는 것이 미치겠는 거다. 어딘가 막 가렵고 뒤틀리고 배배 꼬이고 마비가 오고 결국 뭐라도 붙잡고 쥐어뜯을 것 같은 느낌.(너무 나갔나ㅜㅜ) 딱 봐도 일본말에 뿌리를 둔 단어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화투판 용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물감으로 다가오면서 사람 심사를 뒤집어놓는 것을 어쩌지 못해서 그래서 그러한 몸부림때문에 그런 판국에까지 다다르자 드디어 뇌리를 스치는 구세주가 떠올랐다. 오래전 거금을 들여 장만한 바로 이 책 <소설어 사전>. 곤히 자고 있는 이 책을 꺼내게 된 배경을 쓰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일단 비공개로 해놓고 이따 시간 되면 마저 써야겠다.
...
(그래서 다시 들어왔다. 현재 시각 9시 50분.)
...
(글을 좀 수정하고 사진도 몇장 더 올리고 하다보니, 벌써 10시 15분이다)

1998년 초판본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구입한 날짜는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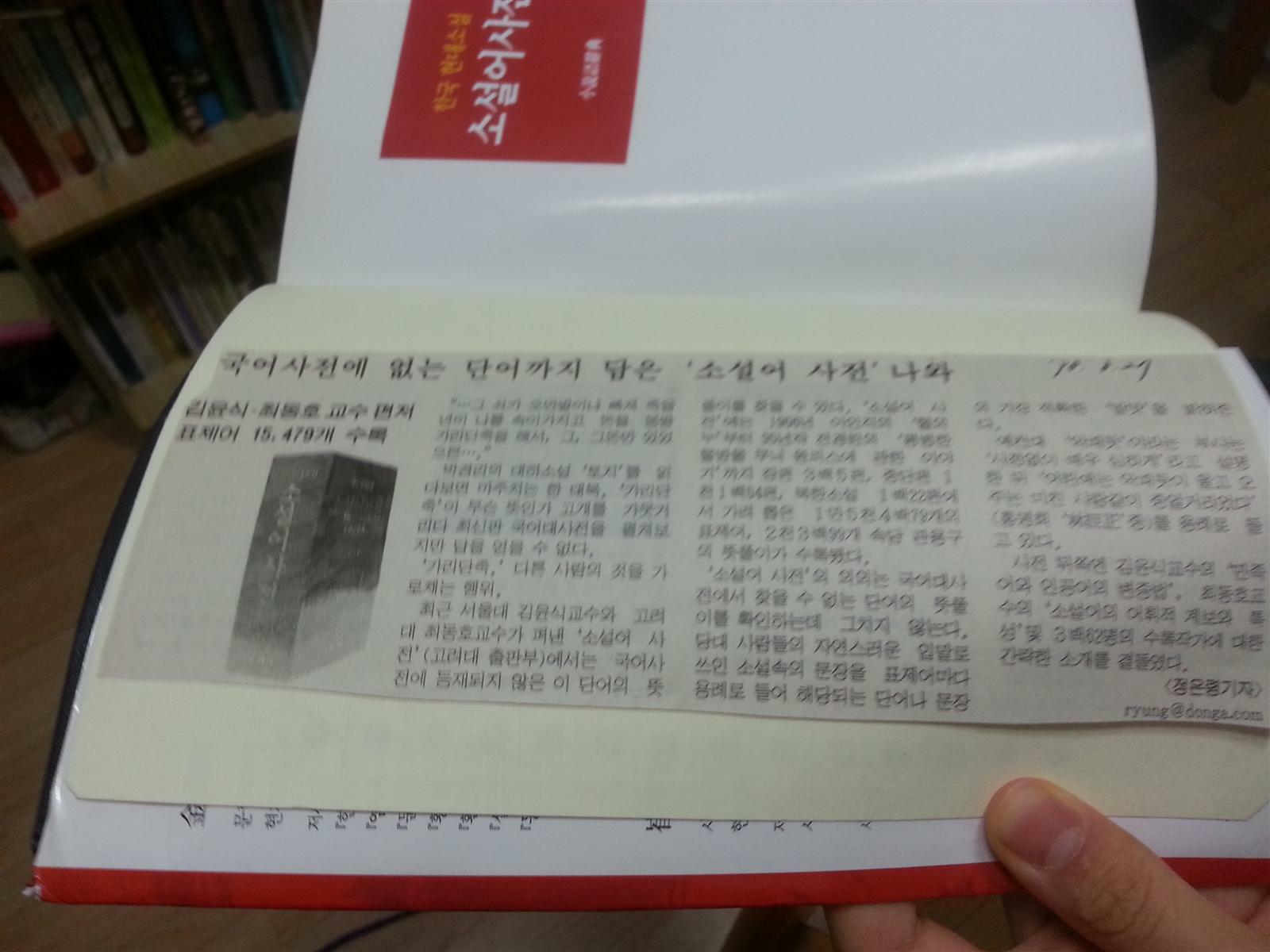
그런데 스크랩해서 붙여놓은 저 신문은 1998. 8.27일자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구입하기 거의 2년전에 스크랩을 해두었고 어떻게 그걸 찾아내서 해당 도서에 붙였다는 얘긴데..
나 저 시절 할 일 되게 없었나보다.
(방안지(方眼紙)가 뭔뜻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 서니데이님과의 댓글을 통해 이 부분은 해결이 되어서 이젠 필요없게 되었지만, 그 해결과정을 살려둔다는 의미에서 남겨두기로 한다. ^^ (방안지는 모눈종이를 뜻함)
......
그러니 내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다. 71쪽부터 96쪽까지 읽지 않겠다는 것. 아니 다시 말하면, 읽긴 읽되 노름판 장면을 하나하나 이해하려들지 말자는 것. 인물이 어찌 되었나.. 돈을 땄나 잃었나.. 그래서 패가망신했나..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어떤 결정타를 입혔나.. 정도로만 파악하는 것으로 최대한 대충 넘어가기로 한다는 것이다. 참, 그리고 소설어사전은 들춰보지 않기로 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몇몇 글자는 도움이 되었지만 그게 오히려 독서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걸 알았다. 그냥 물 흐르듯 쫙쫙 읽는 것이 좋겠다. 한 시대를 통째로 휘어감듯 통곡의 마음으로 쓰여진 위대한 소설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탁류>도 그러하다.. 라고, 조만간 다 읽고 나서 아주 힘주어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제 난 물러간다. 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