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블러드 워크
마이클 코넬리 지음, 김승욱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5년 5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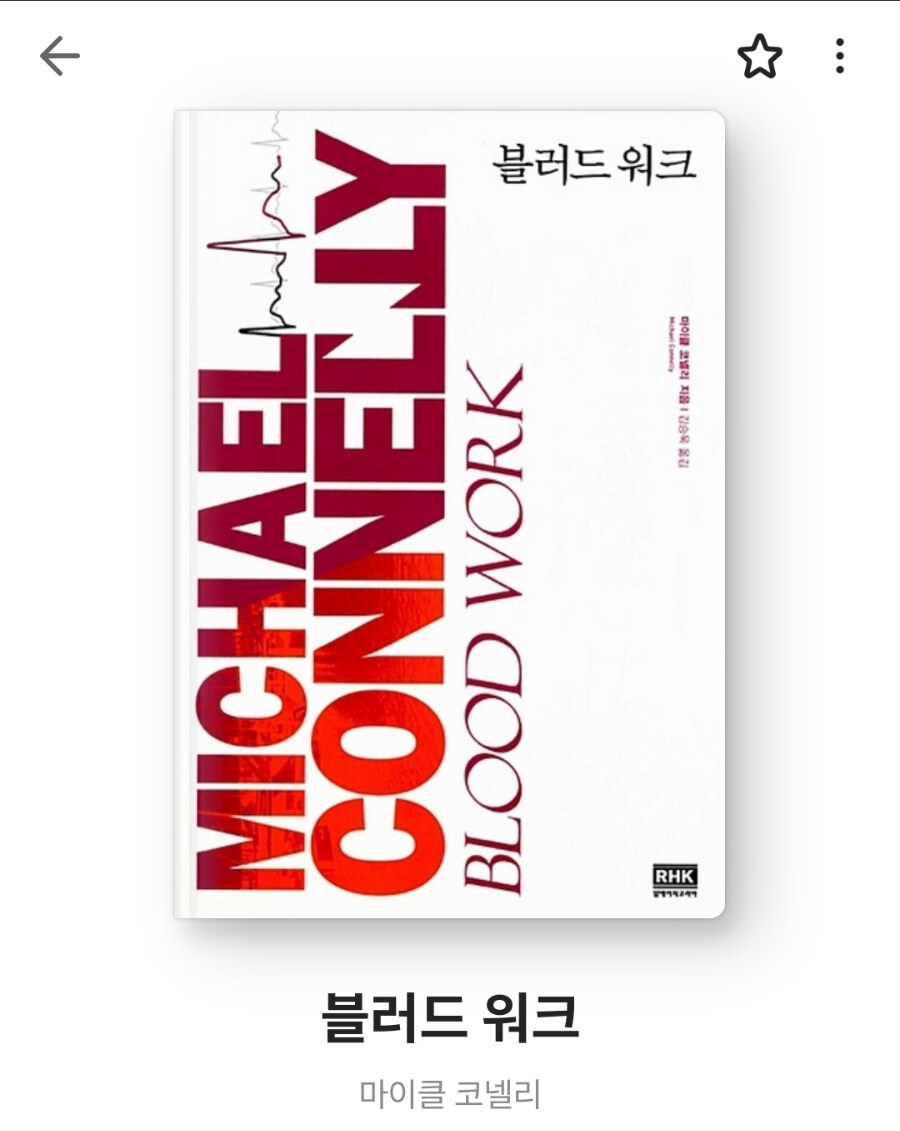
현장요원으로서 그는 기껏해야 평범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책상에 앉으면 웬만한 요원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테리 매케일랩.
전직 FBI인 그는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으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배에서 생활하고 있다.
어느 날 어떤 여인이 배로 그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한다.
전직 수사관이었지만 현재는 아무런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는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고 쫓아내려 했지만
그녀는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
"선생님 심장.
그거 제 동생 거예요.
제 동생이 선생님 목숨을 구했어요."
운전도 못하고, 시간 맞춰 약도 먹어야 하고, 달릴 수도 없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인 매케일럽에게 그녀의 말은 폭탄과도 같았다.
장기를 기증받은 자는 기증자를 절대 알아서는 안된다.
기증자의 유가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찾아냈고, 동생을 살해한 범인을 잡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몰랐으면 잊어버려도 되는 요구였지만 알고 나서는 도저히 모른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건이 찾아오는 방식이 꽤 충격적인 블러드 워크.
<시인>에 이어서 마이클 코넬리의 작품들을 다 읽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는데
엄청난 분량의 작품들이 있어서 어떻게 시작을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어떤 분이 블러드 워크를 추천해 주시길래 냉큼 읽기 시작했다.
밀리의 서재를 정기구독 중이라 전자책으로 읽었다.
전자책으로 완독한 몇 안 되는 책 중에 한 권이다.
그는 이제부터 그 고리를 찾아 나설 참이었다. 식품점에서 완벽한 빨간 사과를 찾듯이. 그 사과를 꺼내면 사과 더미가 와르르 무너져내리는, 그런 사과 말이다.
개별 사건들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매케일랩의 수사 능력은 그가 현장에서는 별다른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서류들 앞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파라는 걸 증명해 준다.
거의 모든 스릴러가 현장파 요원들을 위한 이야기지만 테리 매케일랩은 수많은 서류들 속에서 범인의 윤곽을 찾아내는 신기술(?)을 보여준다.
발로 뛰지 않아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모범 사례라고 할까?
그러니 서류 작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얻게 되고, 이야기를 더 쫀득하게 만드는 소재이기도 하다.
사건에서 프로파일러의 중요성도 알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작품도 초창기 띵작 중 하나로 한때 모든 사람들의 영웅처럼 각광받던 수사요원이자 범인들에게는 절대 피해야 하는 공포이기도 했던 전직 FBI 요원이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생기면서 조기 은퇴를 하고 죽음을 준비하던 시간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심장을 기증받아 기사회생했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테리 매케일랩의 인생은 공허함 그 자체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 일상은 매케일랩 자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다.
그가 이 사건에 뛰어들 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뭔가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수사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지금까지는 책에서만 봤던 감정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생겨나는 것이 느껴졌다. 싸울 것인지, 도망칠 것인지를 놓고 느끼는 갈등. 모든 걸 잊어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어찌나 강한지 마치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냥 모든 걸 그만두고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길은 평탄하지 않다.
그를 무시하는 LA 경찰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범인, 서로 연관이 없을 거 같은 사건들이 이어져 있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수사의 난항 등이 그를 방해하고, 결정적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린 범인에 의해 그는 주요 용의자가 된다.
어제의 동료가 이제는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를 잡기에 혈안이 되는 현실.
그가 일부러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다는 가설로 그를 옥죄어 오는 FBI.
이 답답한 사실 앞에서 그가 믿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자신뿐이었다.
모든 감각을 충족시켜주는 스릴러라고 말하고 싶다.
테리 매케일랩은 깊은 함정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자신을 구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켜냈다.
모든 범죄소설이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겠지만 다 고만고만한 이야기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진다.
마이클 코넬리는 고만고만한 이야기는 쓰지 않는다.
모두가 모티브로 삼을 만한 이야기를 쓰는 작가다.
1998년에 나온 작품을 2021년에 읽었는데도 촌스러운 점이 없고, 답답한 전개가 없다.
<시인>, <블러드 워크> 두 편을 연달아 읽으며 이 작품들이 90년대 작품이라는 걸 느낄 수 없었다.
읽고나서도 신기했다. 자주 나오는 공중전화 장면 마저도 자연스레 21세기에 녹아드는 이 매력은 코넬리만의 '무엇' 인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