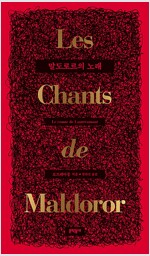수 년 전. 아이를 실기시험 고사장에 넣어두고, 2시간을 걸려 파주 출판단지 지혜의 숲 강연장을 찾았다. <밤이 선생이다>를 읽고 <잘 표현 된 불행>을 제목에 끌려 읽고, 저자에 대한 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났기 때문이다.
수능생을 딱히 열심히 뒷바라지했다기 보다 고3엄마 특유의 무기력증으로 감지않은 머리에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뒤에 숨어서 가만히 강연만 듣고 와야지 했는데 강연이 끝나고 나도 모르게 사진을 같이 찍어 주십사 했다. 그럴만한 차림새가 아니었기에 많이 부끄럽고 죄송했다.
요즘은 너도 나도 글쓰기 열풍이 불어 1인 출판이다, 글쓰기 강좌다 마음만 먹으면 내 책 한 권 정도는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예년이라고 안그랬을까마는. 젊은 시절의 나는 박완서 정도 되어야 책으로 묶어낼 염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생산되는 모든 공산품은 반드시 쓰레기가 되고 책 또한 그러할진대 어줍잖게 내 꿈 운운하며 쓰레기 생산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대학 진학을 앞둘 무렵부터 ‘어디, 나도 한 번, 뭐든‘ 출판을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순문학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있었다. 강연의 주제는 생각나지 않지만 목포에서 보낸 어린 시절 에피소드를 재밌게 들었다. 선생님의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시간이 되었다. 어느 나이 지긋하신 분이 은퇴 후에 창작을 하고 싶다, 조언의 말씀을 해달라고 했을 때 선생님의 답변은 이랬다.
‘글을 쓴다는 것은 정말 지난한 어려움의 과정이고 재능도 필요하다. 꼭 창작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열정으로 독서를 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좋아하는 작가를 선택해서 책을 읽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 작가의 팬클럽활동도 하면서 재미를 찾아 나가시라‘
인생의 후반기에 굳이 창작의 고통을 자처하지 말고 그에 버금가게 즐길만한 일을 예로 들어 주신 것이었다. 그 때 선생님이 팬클럽 활동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진 않으셨지만, 팬클럽활동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예를 꽤 길게 말씀해주신 걸로 기억난다.
당시로서, 초로의 비평가가 해 줄 수 있는 말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했기에 나는 신선한 감동을 느꼈다. 선생님만이 해 줄 수 있는 조언이었다. 청춘은 때가 없다고 하지만, 열정은 때를 가려라 이런 뜻으로 들렸다. 열정의 현현을 가능한 행동의 예로 들어 주신 것 또한 넘나 실제적이어서 이렇게나 오래 가슴에 남았다.
열정의 번지수를 찾아준 강의이자, 무람한 일상, 이래도 될까하던 의문표에 긍정의 무게를 실어 주셔서 네겐 더 특별했던 분. 하마터면 창작에 열정을 쏟을 뻔했다.
73세. 너무나 아까운 나이다.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이 글 속에 자기를 담지는 못할진대,
선생님의 글에는 선생님이 있다.
글로, 더 오래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