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은 잠들다
미야베 미유키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8년 12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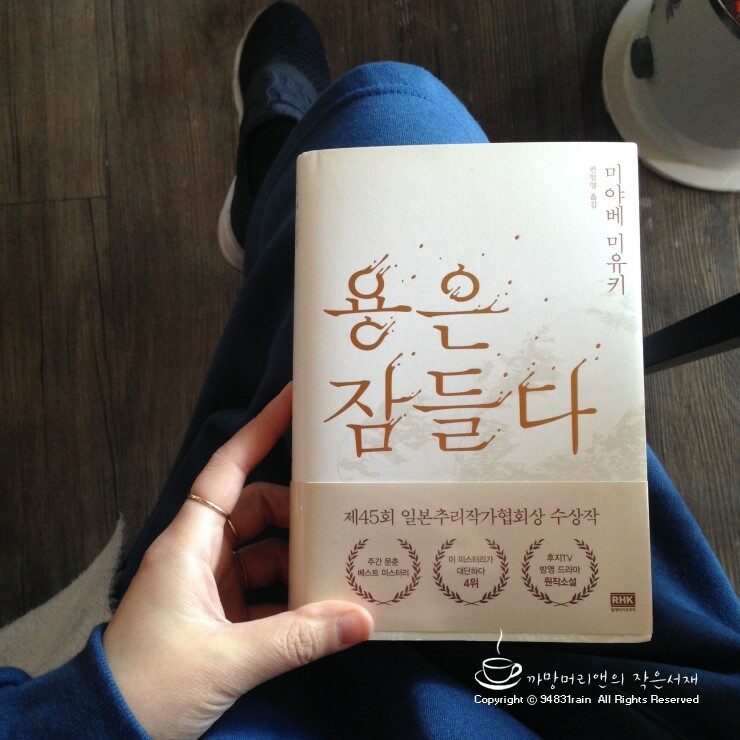
"절대로 믿을 수 없지만,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때는 9월 23일 밤 10시 반쯤이었다. 그는 사쿠라 공업단지 부근 갓길에 자전거를 눕혀 놓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p10
잡지 <애로>의 기자인 고사카 쇼고가 그와의 만남을 회상하는 부분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대형 태풍이 접근하고 있어 폭우가 쏟아지던 밤 만난 소년 이니무라 신지, 함께 비를 피하다 마주치게 된 소년 실종사건은 고사카를 미지의 영역으로 들여놓게 하는 것 같다. 신지가 사건 장소를 되짚어가며 현장을 본 것처럼 이야기해주는 씬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도 그의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
폭우로 자신들의 차 엔진이 잠길까 봐 맨홀 뚜껑을 열어놓고 가버린 두 청년, 그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악의는 없었지만 사건은 일어났고 당사자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알려주었지만 그 일로 인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신지의 능력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신지는 일련의 과정을 고사카에게 맡기지만 사건은 시간이 흘러 흐지부지 종결되는듯했다.
“초능력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사이킥 psychic 이라고도 하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저를 알면 되니까. 왜냐하면....”
신지는 약간 슬픈 눈빛을 보였다.
“제가 그거니까요.” /p69
‘이따금 사람들은 치명적으로 무책임해진다. 악의가 있어서 한 것이라면 또 몰라도.’/p93
그 무렵 고사카에게도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익명의 편지가 도착하고.... 그를 찾아 잡지사에 찾아온 청년 오다 나오야는 신지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아니 신지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이킥을 소유한 청년이 찾아와 신지의 이야기는'능력'이 아닌 사기라며 신지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 반박하는 이야기의 증거들을 자세하게 나열해주고 사라진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명의 초능력자. 정말 초능력이라는 게 있는 걸까? 소년과 청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신지가 정말로 사이킥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일 자체가 거의 고통에 가까운 것 아닐까? 그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서 살며, 어떤 여성과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꾸려갈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속마음, 속마음, 속마음의 홍수. 거기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능력을 컨트롤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감정까지 자제해야 한다. 속된 말로 듣고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이가 말이나 태도로 표현하지 않는 한 주위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전부 들린다면? 듣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듣지 않아야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과연 그 호기심을 완전히 억누를 수 있을까? 그리고 상대방의 진심을 알게 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p144~145
'나오야는 모든 걸 자기 혼자서 해낼 각오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관계해선 안 된다고 했었지.' /p467 자칫하면 마음이 약한 타인을 조종할 수도 있는 초능력. 이러한 능력을 소재로 쓰인 글은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능력이 아닐까? 하지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겐 '능력'이 아니라 재앙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적당히 모르고 넘어가도 좋을 일을 원치 않아도 보게 되어 관여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일에 노출되어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삶. 평범한 만남과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어쩌면 자신들의 수명을 깎아내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쩌면.. 이들이 원치 않았을 능력이었을지도..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자기 자신 안에 용을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춘, 신비한 모습의 용을 말이죠. 그 용은 잠들어 있거나, 깨어 있거나, 함부로 움직이고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하죠."
나는 잠자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코마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용을 믿고, 기도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요? 부디 나를 지켜주세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내게 무서운 재앙이 닥치지 않게 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일단 그 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달리는 게 고작이겠죠, 하지만 역시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p469~470
우리가 믿지 않기로 한순간부터 초능력은 없어진 게 아닐까? 초능력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을 해결하고, 지구를 구하는 대단한 액션이 있지 않다. 하지만 글의 시작에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던 고사카가 초능력을 가진 소년과 청년 사이에서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고뇌를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고사카와의 사건과도 연결되어 진행되는 용은 잠들다 는 이야기의 끝 즈음 책의 제목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도 생생하게 저마다의 특징이 있어 상상하며 읽는 재미도 있고, 등장인물들이 생동감 있게 느껴졌던 건 대사 덕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어린 시절 초능력으로 숟가락을 구부리는 걸 보고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었다. (그게 뭐라고..) 세상엔 믿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그 어린 시절에도 이런 사실을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을지도... 580여 페이지가 되는 책을 조금 읽어보자 하고 들었다가 밤을 새울뻔하기도 했던 용은 잠들다, 는 미야베 미유키 작가를 알게 했던 첫 작품이기도 했고, 그녀의 다른 작품들을 읽고 싶어지게 하는 작품이었다. 날카롭지만 따뜻함을 유지하는 작가 특유의 필체를 다른 작품에서도 찾아보고 싶어지는 글이었다.
본 서평은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개인적인 감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