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깊은 밤, 기린의 말 - 「문학의문학」 대표 작가 작품집
김연수.박완서 외 지음 / 문학의문학 / 2011년 3월
평점 :

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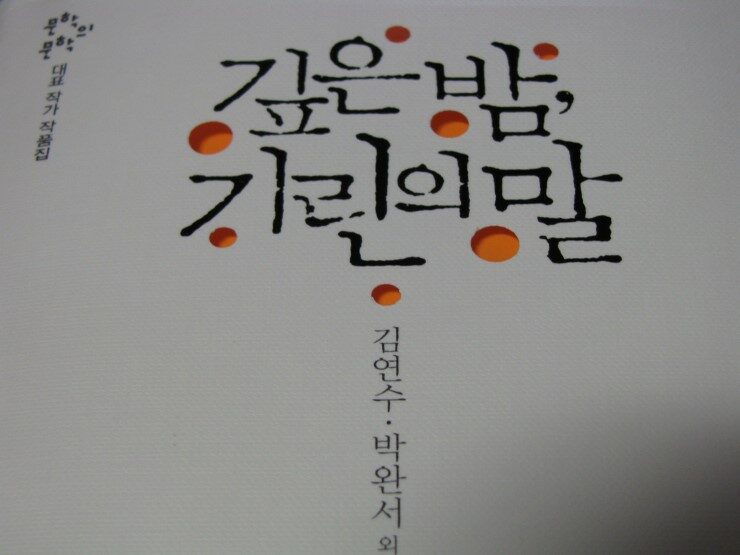
한국을 대표할 10 명의 작가들의 단편문학집, 그 안에서 박완서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특히나 더 반가웠다. 깊은 밤, 기린의 꿈이라는 제목이 김연수라는 다른 작가님의 소설이었음에도 나는 사실 박완서님의 글이 가장 기대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근래에 읽은 그분의 몇 작품을 만나다보니 새로운 작품에 목말라했고, 더 많은 그분의 글을 읽고 싶었다. 그렇게 시작된 책과의 만남.
깊은 밤 기린의 꿈으로 나는 내처 다음 글을 읽지 못하고 한동안 묵묵히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누가 하는지 모르고 시작되었던 독백, 부모님이 자신들을 동물원에 버리려 데려갔다는 쌍둥이들의 생각. 그 이야기는 그들의 동생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윤곽을 잡아간다. 그리고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발견된 자폐 증세는 부모에게 큰 고통이 되어 자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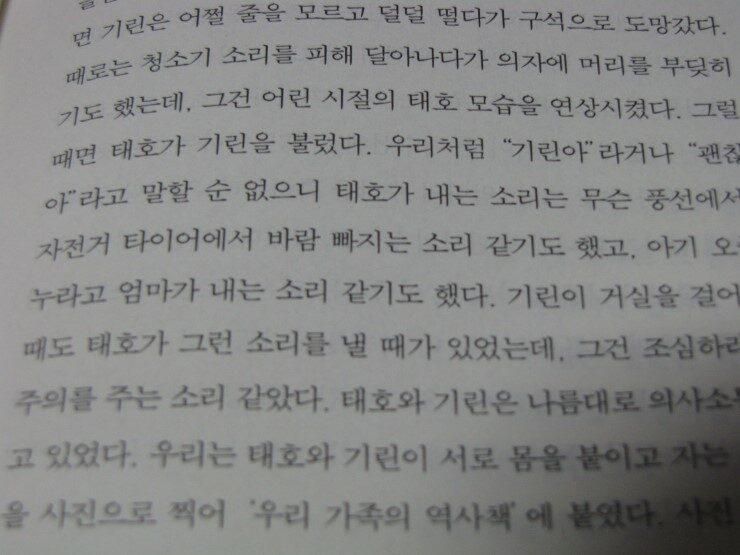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어 비로소 시인이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엄마는 시인이 되지 못하고 결국 내성적인 쌍둥이와 말 못하는 자폐아의 엄마가 됐다.
어떤 여중생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성적인 쌍둥이와 말 못하는 자폐아의 엄마가 되려는 꿈을 꾸겠는가.
엄마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다 생각했다.
엄마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24p 깊은 밤, 기린의 말, 김연수
|
어린 아들을 두고 있어서 자식을 둔, 특히 어린 아이를 둔 엄마의 마음이 더욱 절절히 와 닿았다. 내 아이가 제발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것.
아이를 임신하고 똑똑하기를, 성격이 어떻기를 바라기에 앞서서 가장 바라는 것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었다. 너무나 눈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말을 하지 않고 평범하지 않게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는 벽에 부딪힌 심정이었을게다. 아니, 사실 그 고통을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다.
깊은 밤 어느 날 아이와 후라이드 치킨을 먹고 온 엄마, 엄마는 그날을 계기로 시라는 것을 다시 쓰기 시작한다. 온전히 새로 시작된 인생. 꽉 막힌 줄 알았던 벽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아이와 기린과의 만남. 유독 기린이라는 단어에 좋아라하고, 또 아이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인 동물이었기에 부모는 하나의 희망처럼 둘의 만남을 기뻐하였다. 나중에 결말에 밝혀지는 사실로 부모의 가슴에 특히 아빠의 가슴에 또 한번 피멍이 들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한들 아이에게서 너무나 소중할 기린을 떼어놓아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깊은 밤, 기린의 말. 그들의 눈, 그들의 대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왔다. 아이의 행복을 기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그 누가 대신 헤아릴 수 있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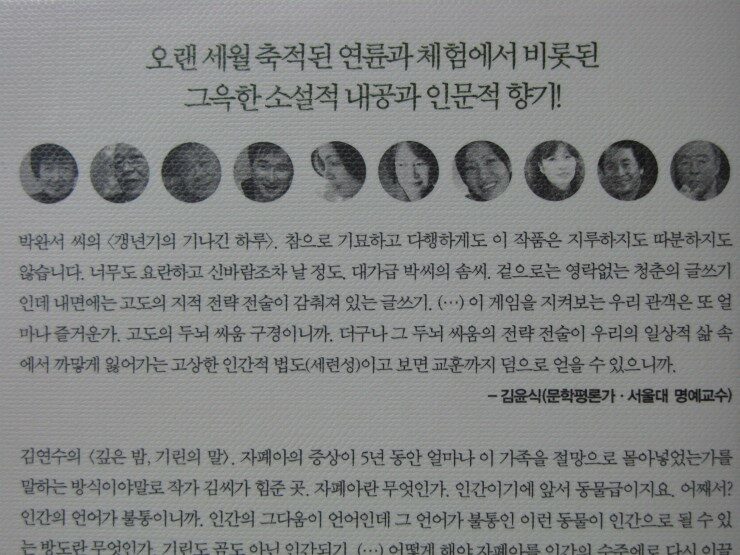
가볍게 읽고 웃어넘길 수 있는 글들이 아니라, 한편한편의 단편이 모두 깊이가 있고, 생각에 빠지게 하는 글들이었다. 묵직한 무게감에 가슴이 무거워지기도 하는 그런 글들. 하지만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다. 그저 읽고 나서 포르르 날아가버리는 그런 얄팍한 글들이 아니었음에 짧은 글이 긴 생각이 되어 머리 속 한 구석에서 재 탄생되는 듯 하였으니 말이다.
박완서님의 갱년기의 기나긴 하루에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보이지 않는 대결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아니, 신경쓸것 없게 느껴지는 고부간의 관계 하지만 식모처럼 불려가는 그날이 되면 날카로워지는건 정작 갱년기인 당사자다. 남편은 흘려듣고, 어머님은 날이 선다. 박완서님 특유의 화법으로 정말 주위 이야기를 듣듯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다는게 이 소설의 인상깊은 점이었다.
이청준님의 이상한 선물은 어느 마을의 사건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봇물 터지듯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면서 그 이상한 선물은 대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글이었다.
단 한 조각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완전하게 맞추기 위해 퍼즐 게임은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은 , 생의 에너지는, 결핍을 채우려는 불완전한 욕구로 허덕일뿐이다.
그게 인생과 퍼즐판의 차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퍼즐을 하는 여자의 내면에 쌓이는 아귀 맞지 않은 욕망의 조각들을.
제자리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유예된 증오의 부스러기들을.
167p 퍼즐, 권지예
|
깊은 밤 유난히 날카롭게 울던 아기 울음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임을 알고 깜짝 놀란 적이있었다. 정말 너무나 흡사했기때문이었다. 퍼즐 속 주인공 역시 고양이에 의한 시달림을 받는다. 좋아하지 않는 고양이가 유난히 그녀를 괴롭힌다. 강제로 지웠어야 하는 아기들, 그녀 가슴에 남은 봉분 세개가 그녀를 평생 옥죄이게 만들었다.
완성도가 높은, 10편의 작품들 중에서 유독 여성 작가분들의 글들이 더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들은 공감하거나, 혹은 대신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어서였는지 모르겠다. 소설 전체를 공감한다기 보다 소재 같은 것에 공감한달까? 조경란님의 파종, 이명랑님의 제삿날 등 역시 그런 맥락에서 최일남님의 국화밑에서보다 조금더 편하게 읽었던 글이기도 했다. 제삿날의 서로가 서로에게 떠밀며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대목에서는 나조차도 발끈하게 되었지만 몰랐던 반전이 밝혀지는 결말은 두 여인의 단단한 결속을 대변해주는 속시원한 결말이 되었다.
짧아서 읽기에 부담이 없지만, 그럼에도 각 작가의 독특한 느낌을 강하게 풍겨주는 내공이 깊은 글들, 오랜만에 멋진 단편집의 향기에 흠뻑 취해들었던 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