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저는 모바일이 PC 환경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이 책을 다 읽고 난 지금도 그렇습니다, 결국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모바일 퍼스트"까지는 몰라도, "모바일 온리"라는 이 책의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 책은 정말 유익했습니다. 책을 통해 얻는 것은 저자(들)이 주장하는 최종의 대의일 수도 있지만, 그 저자들이 주장을 펴는 방식, 상세한 각론으로부터 얻는 주변 지식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채 300페이지가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기본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중대 요소 하나를, 여러 각도에서 상세히 풀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도 감사한 책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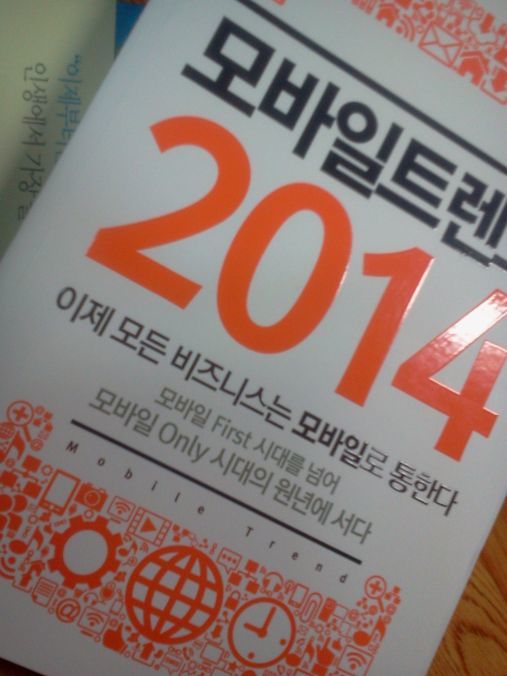
(이하의 설명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제 해석과 표현에 의해 전개된 것이므로, 혹시 내용이 부정확하더라도 책의 잘못이 아닌 저의 책임입니다. 물론 내용의 정확성에는 자신 있으므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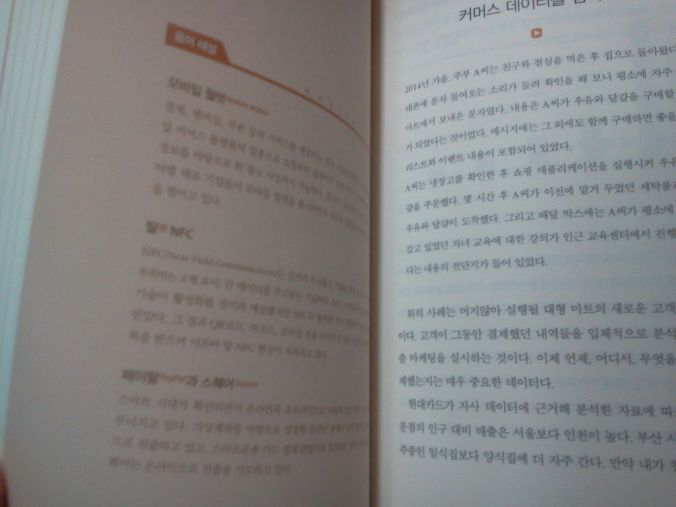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보시는 바대로, 2013년의 리뷰입니다. 트렌드가 아무리 순간을 단위로 바뀌는 변덕스러운 녀석이라고 하나, 만약 그 시계열상의 연속성의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미 "트렌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흐름, 유행을 두고 특별히 "트렌드"라는 의미를 부여할 때에는, 어떤 지속적인 맥락이나 최소 한도의 "역사성, 인과 관계" 같은 걸 상정한 후의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해의 트렌드를 전망함에, 올해의 반성이 빠져서는 그 기초를 신뢰할 수 없음은 당연하죠. 1부에는 총 5장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 1장과 4장은 서로 연결시켜 읽어야 유기적인 파악이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장을 보시면, all-IP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C-N-P-T의 각 영역을 지금과 같은 업체간의 할거가 아닌, 단일 업체가 통합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어떤 독과점이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탐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산업별 경계로 나뉘어져 있던 네 개 영역의 구분이 무너지고, 단일 산업으로 통합되어 보다 편하게, 보다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효용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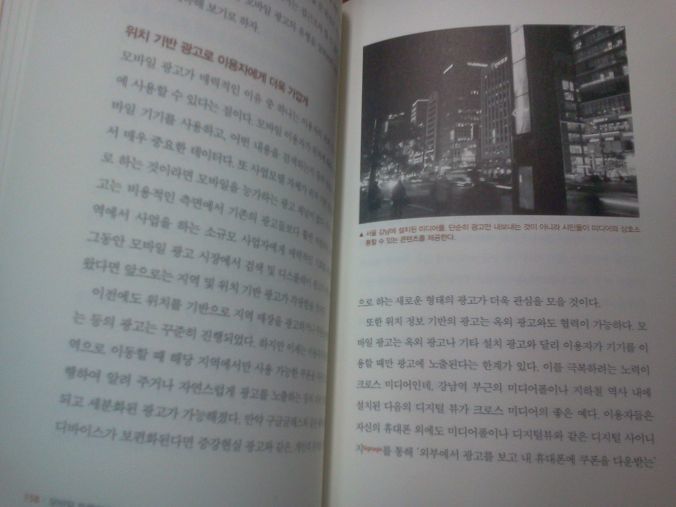
C란 콘텐츠, N은 네트워크, P는 플랫폼, T는 단말기라고들 합니다(저자의 설명입니다). 저 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네 가지 중 두 개 이상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던 주체는 통신사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가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선 갑자기 "...오히려 다른 영역에 있는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all-IP를 구현하고 있는 형국이다."며 다소 모호한 설명을 합니다. 앞뒤의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현 단계에서 all- IP의 주도권을 잡는 데에는 통신사가 가장 유리한 입장이나, 시장의 특성과 잠재력을 영리하게 간파하고 이슈를 선점하며 구체적인 개별 단계를 밟아 나가는 데에는 다른 기업들이 더 두각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쉽게 말해서, 현재 땅을 가장 넓게 차지한 건 통신사이지만, 전투를 위해 자신들의 좁은 땅에나마 야무지게 전투 시설을 구비하고 개별 전투의 승리를 다짐하는 쪽은 다른 중소규모의 도전자들이라는 거죠. PCS가 도입되어 소비자(가입자)들을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 끌어 모을 때만 해도, 016, 018 등의 통신 사업자(N)가 게임이나 영화 등의 콘텐츠(C)를 "생산(제작)"한다, 혹은 검색 사이트(P)를 운영한다, 이런 건 대단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폰을 직접 만드는(T) 일도 어색했죠(011 SKT의 "스카이폰" 브랜드는 예외겠습니다만). 쉽게 말헤서, 드라마, 영화, 게임을 만들고, 망을 관리하고, 포털을 운영하고, 단말기를 만들고, 이 모든 걸 한 회사가 다 맡아하는 게 all-IP죠.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KT가 싸이더스를 소유하고 있다든가 하는 게 다 그 예라는데, 이 외에도 구 하나로통신을 SKT가 SK브로드밴드로 흡수 합병한 일, 파워콤을 LGT가 인수한 일 따위가 더 실감나는 사례이겠습니다(같은 N 안에서의 흡수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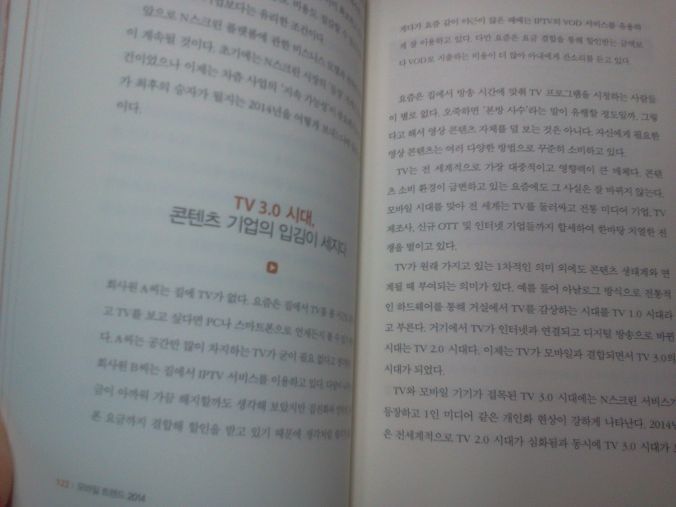
제 생각에는 all-IP란, 그저 패기있게 각 사업자들이 외치는 구호일 뿐, 가 까운 시일 안에 실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어떤 단일, 소수 사업자의 지배적 대두를 허용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점은 이 저자도, 위의 저 모호한 서술로 어느 정도는 자인하고 있는 셈이죠. 대표적인 컨텐츠 기업인 카카오가 과연 통신사의 위상을 넘볼 수 있을까요? 이 책의 p73(제 2부 1장)을 보시면, "이통사는 컨텐츠 기업의 덤프 파이프로 추락하고 말 것인가?"라는 화두가 던져져 있는데, 이는 이 1부 1장에서 논하는 all-IP 이슈와는 상당한 모순을 빚는 주장입니다. 또, 거대 통신사가 과연 네이버 등의 플랫폼 영역을 넘볼 수 있겠으며, 애플의 앱스토어 역시 그 기능을 어느 정도나 더 유의미하게 유지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 중에서 그나마 가장 만만한 건 단말 제조 영역[T]입니다. 물론 애플이나 삼성 역시 거대한 자본력을 갖췄으니만치 이 볼만한 전쟁에서 종속 변수로 머물려 하진 않겠죠) 여러 필진이 관여한 기획이고, 다양한 시각들을 엿보고 공부하는 재미가 있는 책이니만큼 서로 모순되는 주장도 각각 음미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튼 산업으로서의 all-IP 대두는 특히 소비자들에게 흥미로운 새 방향을 제시하지만(기존의 경계 소멸), 단일 기업이 패권자로 나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엔 각 영역에서의 컨텐더들의 저력이 다들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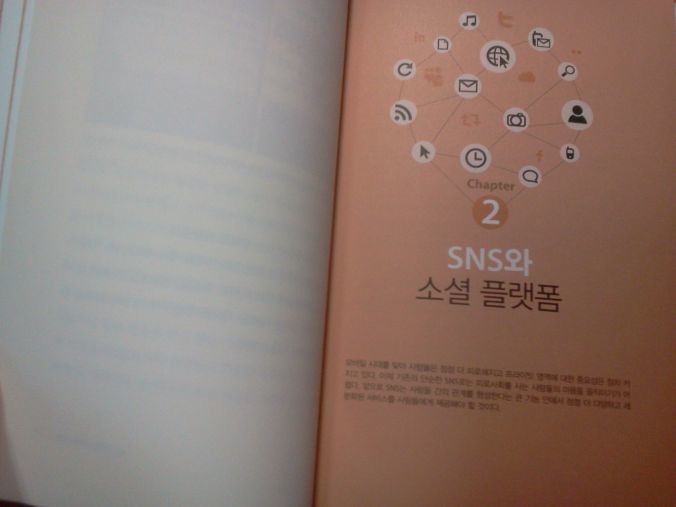
페 이스북이나 트위터 모두, 본성상 반드시 모바일 친화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소통의 대의가 유저들의 동선과 보다 밀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대체 모바일을 버리고 유선에 집착할 수는 없는 일이죠. 실제로 모바일 트렌드를 가장 선도적으로 구체화하는 기업은 페이스북이며, 이 점에서 과연 21세기의 총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페이스북의 각종 약진상은 놀라우며, 이익 창출과 생존을 사명으로 하는 기업의 발빠른 행보와 비전은 여타 누구의 상상력이라도 따라갈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는 개념을 말했지만, 모두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단계를 지금 여기서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잘나가는 기업, 증시에서 한결 같은 기대와 낙관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저자들이 자꾸 강조하는,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 하는 질문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과연 존재해야만 할까요? 또, 그 후보들은 여기 제시된 기라성 같은 기업 중의 어느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지요. 실제로 이 책 2장 2절을 보시면, 프라이빗 SNS를 비롯해서, 심지어 안티 소셜 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바일 생태계에서 어느 한 서비스만으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다양한 서비스의 컨셉, 기능이 존재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 장에도 나와 있듯, 페이스북은 이 점을 간파하여 틈새 시장을 별도 서비스로 벌써 공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네이버가 "밴드"를 통해 벌써 국내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죠. 과거 유선 시대를 돌이켜 보면, 야후, 라이코스, 알타비스타, 그 외 각종 특성화 검색 엔진이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 장기를 뽐내며 할거하는 모습이었으나, 지금은 구글 하나로 판도가 거의 통일된 형국이죠. 서비스는 다양화하되, 비용과 공급 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패권자는 하나, 혹은 소수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유료화의 이슈도 IT 업계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과 거 프리챌이나 싸이월드의 몰락은 이 문제의 소프트랜딩이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님을 잘 알려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톡의 성공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제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곤 하나 본디 안정적인 수익 구조의 설계, 안착이 지난(至難)한 게 이 바닥의 사정임을 고려하면 뭐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동전화 초창기 시절부터 문자메시지가 무료였던 일본(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은 우리나 미국처럼 sms 기반이 아닌, e메일로 펀더멘틀을 잡았기 때문이죠. 번호와 번호 간의 통신이 아니라, 메일 계정 둘을 통신사가 연결해 주는 구조입니다. e메일이 무료니 당연히 문자메시지도 무료였죠)에서, 우리처럼 "무료 문자"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네이버의 라인 메신저가 일본에서 대거 약진한 건, 동일본 대진재가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책을 직접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자들이 가장 흥미있어할 만한 내용으로는 음성 매시업을 다룬 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영화 <설국열차>에서처럼 기계 하나로 통역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면 정말 신기한 일이겠죠. 어떤 마술 같은 게 아니라, 최근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빅데이터, 그리고 음성 인식 기술이 융합되어 가능한 기술일 수 있습니다(책에서는 음성 인식 기술과 데이터 속도만 강조하는데, 그 이전에 방대하게 축적된 번역의 선례 데이터의 양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못내 미심쩍은 게, 뭔가 저자분께서 "매시업"의 개념을 잘못 이해, 제시하신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매시업이란 두 개의 오리지널 소스를 연결해서, 유용한 제 3의 서비스를 창출해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통역을 도와 줄 기술로는 1) 음성 인식, 2) 기존의 텍스트 번역기, 이 둘은 종래 전혀 별개의 영역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제 3) 즉시 통역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 둘이 매시업 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영화 <설국열차>의 그 통역기는 매시업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크죠(그 통역기가 중앙망에서 다른 db를 연결해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퀄컴의 "스냅드래곤 보이스 액티베이션" 역시 자체 CPU에서 독립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데, 이 역시 매시업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겠구요(배추장수 소형 전자계산기가 매시업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죠). 통합된 기기(단말기가 아닌 고립된 기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건 이미 매시업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오리지널입니다. 음성 통역이 자유자재로 되는 단계까지 갔다면 이미 그건 매시업 단계를 멀찌감치 초월한 거죠. 매시업은 지금 같은 초창기에서나 방법론으로 거론되는 거구요.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통번역은 논리연산의 문제가 아닌 휴리스틱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나 연산 처리 속도, 망의 차원이 아무리 확대, 진화되어도, 질적으로 해결 못 할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고도로 통신기술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더 이상 모바일과 유선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큰 그림만 얻어도 이 책을 읽은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동전화를 쓰면서, 이게 SK다 KT다 하는 구별, 또 게임을 하면서 이게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혹은 PC 상에서 이게 넥슨의 서비스다 NC의 작품이다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만, 장 래에는 그런 개념 없이 그저 편하게, 중간 경로를 인식하지 않고 즐겁게 소비하는 선에서 다 끝낼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래미안에 입주해 살면서, 그 벽지와 마감재, 콘크리트의 제조사가 어디인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요. 모바일이 일상 생활에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그 주도권을 가진다는 의미지, 다른 기기(예컨대 PC나 TV)를 모조리 대체한다는 건 아니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