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을 마무리하며 올해 읽은 책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올해는 참으로 내 수준을 넘는 좋은 작품들을 많이 읽었다.
좀 더 많은 책을 못 읽은 게 이맘때가 되면 늘 아쉽지만 그래도 올해는 거의 모든 작품이 좋았기에 만족한다. 그 중 여러가지 이유로 인상깊었던 책들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인내심과 싸워 이긴 책


7월 한 여름에 읽었다. 정말 읽다가 쓰러지는 줄 알았다. 재밌는 책도 아니었지만 올 여름은 이상하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독후감도 길게 쓰지 못했다.
헤세가 10여 년에 걸쳐 완성한, 그의 사상을 집대성 한 작품으로 전설적인 유리알 유희 명인 요제프 크네히트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처음 50페이지의 서문이 쥐약인데 이 부분만 넘기면 그래도 읽을 만 하지만 그래도 재밌지는 않다. 1946년 그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 준 작품이다.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
▶읽으면서 신 났던 책


드디어 나도 <백년의 고독>을 읽는구나! 읽으면서 너무나 즐거웠던 책이다.
읽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 걱정했는데, 웬걸,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봇물처럼 쏟아지는 이야기, 긴 호흡의 문체, 헷갈리는 이름 등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집중하고 정신만 차린다면 이 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다. 특히 1권 200쪽의 장남 호세 아르까디오가 죽고 그가 흘리는 피가 온 마을을 돌아 엄마인 우르술라가 있는 부엌까지 흘러오는 장면은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다.
▶웃기지만 슬프고 슬프지만 웃긴 책

표지 그림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한명인 이그네이셔스 J. 라일리이다. 다른 곳에서 프로필 사진으로도 사용 중이다.
이 못된 놈이 쏟아내는 독설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작가는 이 소설로 1981년 퓰리처 상을 수상했는데, 특이한 점은 이 소설이 작가 사후 11년 만에 출간, 이듬해에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소설이 웃기면서도 슬픈 이유는 32살의 짧은 생을 마감한 작가의 우울과 슬픔이 이그네이셔스를 통해 보여지기 때문.
나는 이 책을 주변의 책 읽는 사람들 몇몇에게 추천했는데 아...다들 반응이 별로이다. ㅠㅠ
그 중에는 이그네이셔스의 수다를 견딜 수 없어 읽다가 포기했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번에 개정판이 나왔던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 책도 웃긴데 조금 지저분하고 노골적이라 깔끔하신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화가 펼쳐 보이는 900페이지에 걸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그 기막힌 이야기의 힘은 대단하다.
어쩜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이토록 재미나고 아무렇지도 않게 쓰나, 역시 중국인들, 중국작가답다!
이 소설의 매력은 비극을 희극적으로 그리면서도 또 그 웃음 속에 눈물이 묻어나게 한다는 점.
▶올해의 작가 '조지프 콘래드'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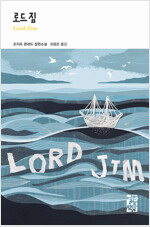

올해 내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작가는 조지프 콘래드 (Joseph Conrad 1857~1924)이다.
영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은 물론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산 작가에게 묘하게 끌렸다. 러시아 치하 독립운동을 한 부모, 유배생활, 부모의 죽음을 겪고 외삼촌 보호 하에 있다가 16살에 폴란드를 떠나 20년간 바다에서 선원 생활, 30대 후반에 세 번째 언어인 영어로 소설을 써 세계적인 작가가 된 조지프 콘래드! 변방 폴란드 출신으로 늘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영어로 글을 쓰면서 토마스 만, 헤밍웨이, 포크너 등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이것은 바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언어가 아닌 남의 언어로 쓴 그의 글은 진지하고 심각하며 심오하다. 비록 원서로 읽지는 못했지만 번역된 책으로도 작가가 얼마나 치열하게 글을 썼는지 느낄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내가 콘래드에게 매료된 이유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

'여기는 나무가 끼어 사는 우리 세계가 아니다. 나무의 세계에 인간이 막 도착한 것이다' (p.597)
이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미대륙에서 사라져가는 '마지막 3퍼센트'의 원시림을 지키고자 모인 아홉 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간이 알지 못하는 나무들에 관한 경이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인간은 숲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나무는 인간이 쓰고 버리는 작물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며, 암울한 미래를 위한 희망이고 무엇보다 신비로운 존재이다. 이 책을 읽고 밖에 나가 나무를 보면 나무가 나에게 향기로 말을 건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읽기 쉽지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읽고 정말 보람있었던 책

7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1933년부터 1945년 동안 나치 독일과 스탈린 치하 소련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역사를 다룬다. '피에 젖은 땅'은 폴란드, 발트 연안,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소련의 서쪽 변방지대를 이르는 땅을 '지칭하는 말로 영어로 'Bloodlands'라 한다. 이 땅에서 12년 동안 약 1400만 명의 사람들이 히틀러와 스탈린의 정책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 중 절반은 굶어 죽었다. 특히 나치 독일이 유럽에서 저지른 학살은 많이 알려진 반면 스탈린이 소련 내부에서 벌인 학살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책은 그 가려진 진실을 자세히 보여준다. 두 독재자가 저지른 범죄가 어떻게 상호작용 했는지 방대한 자료와 연구로 그 실상을 생생하게 파헤친 <피에 젖은 땅>! 정말 돈이 안 아깝고 눈에서 어떤 막이 제거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감사한 책

단편 소설을 좋아하게 만들어 준 책이다. 올해 <그레이엄 그린> 단편집을 읽고 단편이 싫어졌었다. 53편의 이야기 중 거의 반을 이해 못했던거 같다. 당분간 단편을 읽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예전에 읽다 만 트레버의 단편이 눈에 들어왔고 하루에 한 편씩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단편을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다. 23편의 이야기가 다 내 주변 어디선가 일어날 법한, 그런 안타까우면서도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우리 주변의 보통 사람들이 겪는 외로움, 절망, 후회, 슬픔을 감상적으로 다루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묘사하는 트레버의 글에는 독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함이 있다.
이런 페이퍼 처음 써 보는데 '아 내가 이 책도 읽었었구나...'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 좋다. 올해 80여 권의 책을 읽었는데 내년에는 100권 이상을 읽고 싶다. 북플 이웃님들 올해도 많이 배웠고 즐거웠습니다. 님들을 만나서 제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