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 플러스 원 - 가족이라는 기적
조조 모예스 지음, 오정아 옮김 / 살림 / 2014년 1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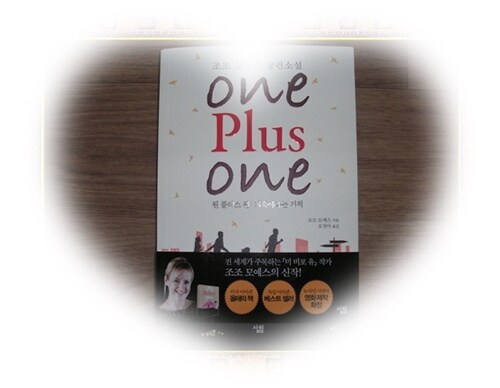
서양은 일찍부터 가족이란 형태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들 삶을 통해 이미 오래 전 부터 각종 법적인 형태나 사회적으로 인식이 넓은 포용력으로 다가선 점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고는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비한다면 아직까지는 못미치지만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진 것을 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탄생을 보게 된다.
'미 비포 유'의 책을 접한 독자라면 흠뻑 눈.콧물을 빼놓은 그 감동의 기억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사랑의 대상과 그 사랑을 향한 사람들의 감정이입을 이처럼 진하게 쏟아부을 수있는 작가를 접했단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랜 만에 깊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던 차, 이번엔 가슴 뭉클하고 따뜻한 책으로 다시 만났다.
'원 플러스 원'... 마치 마트에서 할인 행사시에 끼워주기 일환으로 명명된 제목을 연상시키지만 읽다보년 그 이미지를 넘어선 또 다른 거대한 그림이 떠오르게 되는 작품이다.
16 살이란 어린 나이에 딸 탠지를 낳은 제스는 싱글맘이다.
남편 마티와는 2년 전 그가 그의 어머니 집으로 가면서 이혼처럼 굳어져 버린 생활을 하게 됬지만 그에겐 18 살의 큰 아들이 또 있다.
바로 마티가 자신을 만나기 전 철없던 10대 시절에 낳은 아들 니키다.
니키를 낳은 엄마는 약물중독에 다른 남자를 만나 떠나버렸고 마티마저 두 아이들을 그녀에게 맡긴 채 나몰라라한 실정이기에 그녀의 직업은 투 잡이다.
오전엔 청소부, 저녁엔 바텐더로 일하면서 그저 두 아이들이 별탈 없이 잘 자라주길만을, 언젠간 마티도 제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와 가장으로서 함께 하길 기다리는 그녀의 생활에 뜻하지않은 남자가 끼어들게 된다.
아니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그의 삶에 뒤섞이게 된다.
에드 콜린스-
컴퓨터 회사를 친구와 차려 돈도 벌고 모자란 것 없이 사는 이혼남이지만 어느 날 대학시절부터 짝사랑하던 여자 동창생과의 함께 하고 난 후에 회사의 기밀을 알려준 뒤로 내부거래자로 혐의를 받게되 재판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자다.
그런 그에게 그가 있던 별장이 있던 지역에 살던 제스네는 탠지의 뛰어난 수학능력을 눈여겨 보게 된 선생님 권유로 유명한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지만 문제는 학비-
그러던 차 수학 올림피아가 열리는 스코틀랜드까지 가게 되어 무사히 등수에 들면 학비 걱정쯤을 해결 될 수있을 것이란 생각 하에 집 마당에 쳐박혀 있던 마티의 고물 차를 끌고 나오게 되고 이는 곧 교통위반에 걸려 우여곡절 끝에 에드의 도움으로 스코틀랜드까지 오고가는 과정들이 그려진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우선 우리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얼마나 서로간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주고 받으며 때론 웃기도 하면서 지내는지, 그런 순간들 조차도 정말로 소중하단 사실을 여감없이 느끼게 해 주는 책이다.
제스의 가족은 그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형태라고 할 수없는 여러 인연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집단의 모습이다.
서양에서 싱글맘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보다 덜 할 것같단 느낌이 들어왔지만 이 책에서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제스가 처한 상황은 싱글맘으로서 갖게 되는 한계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고, 그다지 별달라 보이지 않을 만큼 매사에 돈 문제에 골머리를 앓으며 살아가는 , 그렇지만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용감한 여인의 모습이 강하게 비쳐진다.
키는 크고 자신의 감정표현조차도 하지 않는, 자신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 눈에 아이라인을 그리고 마리화나를 피워대는 니키는 동네 북이다.
동네 아이들에게 맞는 날이 맞지 않은 날보다 많을 정도이고, 키우고 있는 덩치가 산만한 개, 노먼은 독한 가스를 뿜어내며 시종 침을 질질 흘리는 식구로서 어느 것 하나 조화가 맞는 구석이라곤 없는 가족들 총집합체의 모범 답안이라고나 할까?
에드는 어떤가? 바쁘다는 핑계로 병으로 죽어가는 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다는 데도 가보지 않다가 억지로 뵈려던 찰나, 범법행위로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의,모든 것을 잃어가는 사람이다.
조카의 얼굴을 보고도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가족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그에게 제스의 가족과 동행은 그를 변하시키고 제스와의 관계도 진지하게 바뀌는 여정이 어느 가족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읽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작가의 의중을 십분 이해하면서 느끼게 되는 책의 구성들이 재미와 유머가 섞이면서 감동을 전해준다.
생판 모르는 남들이 모여서, 엄마, 딸,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과정들이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 '너와 나는 우리'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우리' 안에서 가족이라는 새로운 의미의 울타리 형성을 이뤄나가는 과정들이 그야말로 자연스러움 그 자체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물론 생활면에서 차이를 따진다면 상류층과 최하층간의 결합이란 이미지 자체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지만, 작가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떠나서 진정한 가족관계란 무엇인지, 그 가족간의 구성원이 꼭 피를 나눈 것만이 아닌 진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를 해 줄 수있는, 무언의 강한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들이야말로 원 플러스 원의 가장 합당한 사람들임을 알게 해 주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