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카란다 나무의 아이들
사하르 들리자니 지음, 한정아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5년 4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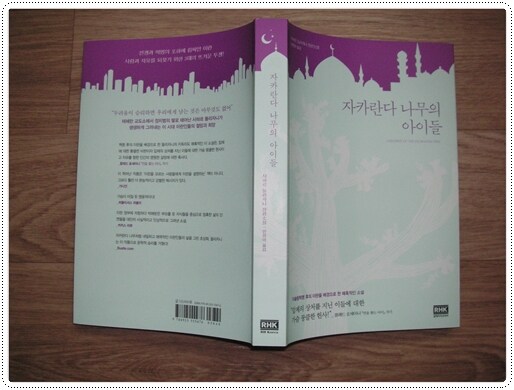
한 나라가 지닌 유구한 역사 속에는 분명 많은 역경의 시기가 있다.
그것이 외세의 침략이든 같은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이권 쟁탈이든 간에 결국 그 모든 피해를 입는 대상은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성을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외세 침략에 이은 한(恨)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이나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제도의 한계와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들을 모르쇠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지닌 아픔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투쟁의 역사가 있다.
흔히 문학을 통해 알려주는 역사 속의 단면을 드러내주는 책들을 접하다 보면 이런 종류의 힘없는 사람들의 고충과 그 아픔을 통해 다시 한 번 국가란 무엇이며 그주체자인 국민의 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한다.
제3세계의 문학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영.미 문학을 제외한 타 국가들에 대한 작품들을 출 판자들의 작품 발군에 힘입어 접할 기회가 예전보다 많아진 것을 확실하나, 그래도 여전히 아랍계나 아프리카의 문학들을 접해 본 경험을 그다지 많지가 않은 터에 이번에 접한 작품은 아랍권의 문학이다.
아랍권이라고 하지만 실제 저자는 현재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이란 태생의 여류 소설가로서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소설을 통해 내보임으로써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의 현 정세와 그 과거에 얽힌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는 기회를 주는 책이다.
이 소설은 흔히 주인공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책 안에 모두 등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모끼리, 아니면 사촌끼리, 그리고 이민 와서 알게 된 같은 민족 사람이란 공통점 하에 모두가 연관이 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 구조다.
책 제목에서 알다시피 처음엔 이 나무가 무엇인지 몰랐다.
검색해 보니 아프리카의 벚꽃이라고도 불리는 보라 빛깔의 꽃잎들이 무수히 매달려 있는 아주 화려하면서도 지조를 보이는 듯한, 그러면서도 향기가 아주 좋은 아열대성 식물이란 말이 뜬다.

(다음에서 발췌)
이 책에선 이 나무가 등장하면서 그 나무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지에 대한 하나의 소도구처럼 쓰인다.
이란의 에빈 교도소에서 ‘정치범’의 딸로 태어난 사하르 들리자니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긴 장편소설이기에 거짓 없는 현실적인 이야기와 여기엔 엄마가 갇혀 있던 교도소 안의 여인들과 연관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씩 하나씩 서로 연결이 되고, 그들의 자식들이 자라면서 현재의 이란과 타국에 이민을 갔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자식들대까지 연결고리를 갖는 형태를 지닌다.
현대 이란을 배경으로 이슬람 혁명, 이란-이라크 전쟁,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반체제 인사 숙청은 통해 보다 나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길거리에 나선 사람들의 투쟁과 그 과정 속에서 형기를 마치고 무사히 나온 가족이 있는가 하면 면회 금지가 되면서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 소리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인간들의 모습들이 암울하게 펼쳐진다.
태어났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 했던 딸을 안아보는 아버지의 기쁨도 잠시, 그 아이에게 남겨 줄 대추나무 씨를 불리고 말리는 과정, 변소의 못을 빼내와 뾰족하게 간 후에 팔찌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들이지만 완성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긴박감마저 느끼게 하고, 그것이 바로 실제로 벌어진 일이란 현실이란 사실, 딸아이만큼은 자신들이 겪은 고민과 내상으로 이뤄진 아픔을 겪지 않게 하려고 비밀리에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려 하지 않는 엄마가 있는 반면, 솔직하게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딸아이가 갖는 자신의 나라의 현 실정을 알게 해 주는 장면들이 상반된 성격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생략)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인 것 같다. 남편을 잃었잖니. 근데 딸까지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 딸이 자라서 아빠가 간 길을 따라가겠다면 어쩌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 봐봐. 20년이 지났는데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잖니. 그들이 다시 시작했잖아. 우리 자식들을 감옥에 처넣고 백주대낮에 거리에서 함부로 살상을 하고 있잖니. 못봤어? 난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들한테 너를 빼앗길 수는 없었다고!” -p264
우린 그렇게 살았다. 언젠가 아자르가 네다에게 말했다. 너도 알아야 돼. 엄마 아빠가 투쟁한 건 네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너도 알고 있어야 돼. 하지만 저 문을 나가면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누구도. 네가 좋아하는 선생님도, 이웃도. 가장 친한 친구도 믿으면 안 돼. -p364
책을 읽다 보면 꼭 이란에서 벌어진 일만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끝난 결과가 아닌 어느 때고 들이닥쳐 아무 이유나 대고 잡아가는 현실 속에서 자식만은 이런 현실을 벗어나게 해 주고 팠던 부모 세대, 동료들과 뜻을 이루고 현실에 참여를 했지만 결국엔 투옥과 석방을 거치면서 동지들을 등지고 타국으로 도망 올 수밖에 없었던 레자의 경우처럼, 부모 세대들은 이념의 차이로 상반된 길을 걷게 된 세월이 자식대에 (네다와 레자)오게 되면서 서로가 뜻을 이루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현실적이다 못해 꾸민 인생의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는 흐름이 갑갑함을 느끼게 한다.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자카란다 나무처럼 이들의 삶은 이 나무가 상징하듯 언젠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돌아갈 날을 상상하는 상징처럼 그려진다.
바람에 날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꽃잎들은 비록 떨어질지언정 그 나무가 갖고 있는 뿌리의 견고함은 아마도 이란의 밝은 미래를 짊어질 청춘들의 희망이 아닐까?

(다음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