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이약국
니나 게오르게 지음, 김인순 옮김 / 박하 / 2015년 11월
평점 :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 가는 증상은 점점 육체적인 병과는 달리 현대에서 들어서는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내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고치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처방전으로 들어가는 약을 조제해 받는 경우가 있다.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 주는 약의 처방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약과 상담만이 아닌 책을 통해서 마음의 병을 치료해 받는다면 어떨까?
바로 페르뒤 씨의 경우가 그렇다.
룰루라는 화물선을 개조해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처방전으로 권해주는 '책'을 파는 '종이 약국' 이란 이름을 가진 서점 주인이다.
사람들이 찾는 책을 무조건 찾아서 파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지금의 심정이 어떤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자신이 권해주는 책을 파는 식이다.
상인이라면 이익창출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페르뒤 씨는 결코 이런 상도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타인에 대한 세심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독특한 재능을 가진 그이지만 정작 자신의 아픈 마음은 고칠 수가 없는 상태-
20년 전에 5년간 만난 마농이란 여인과의 이별에 가슴 아파하며 그 시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은둔해 접어들다시피 오로지 집과 배위에 세워진 서점 '종이 약국'만 오고 갈 뿐, 그에겐 그 어떤 빛나는 사랑도 해보지 못한 채 50살이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곳에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당한 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사 오게 된 카트린이란 여인이 이사 오면서 그에게 변화가 찾아온다.
그가 살고 있는 집 맞은편에 마주 보고 있는 카트린에게 남아도는 식탁을 주려고 찾아가게 되고 카트린은 식탁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면서 그에게 전해준다.
다름 아닌 마농이 떠나고 난 뒤에 온 편지로 그 편지 안엔 당연히 구구절절 미안하단 상투적인 말들만 가득 들어있을 것이란 생각, 그 자신이 자존심 상하는 마음에 읽어보지 않았던 편지였다.
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마농이 암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페르뒤는 그동안 자신 안에 갇혀 있었던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배에 밧줄을 풀고 본 뉴로 향하게 된다.
배는 이웃으로서 작가의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기대치 않았던 유명세를 피해 다니는 조당이란 아들뻘 되는 작가와 함께 떠나게 되고 여기엔 간간이 마농의 읽기가 등장함으로써 그녀가 자신의 약혼자인 루크 외에 페르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사연과 마음의 상실을 그나마 지탱해준 책이었던 <남녘의 빛>을 쓴 저자 사나리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 같이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페르뒤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려나가는지 섬세한 감정의 파고가 드러난다.
흔히 실연의 상처는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가 될 수 있다고들 한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에는 사랑의 유효기간도 빨리 다가오고 이별의 상처도 빨리 회복되는 것 같기만 하지만 페르뒤가 겪은 마농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20년이란 세월을 오로지 그녀만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그리워했다는 점에서 인스턴트식 사랑법 보다는 답답함마저 주는 아날로그식의 사랑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타인에겐 딱 맞는 책을 통해서 치유를 해주는 솜씨가 자신에겐 전혀 소용이 없었던 그에게 마농의 죽음을 대하는 감정의 노선은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이 느끼는 분노, 회한, 용서 같은 감정들이 그대로 보여준다.
마농의 사랑법, 약혼자를 두었음에도 또 다른 남자인 페르뒤와의 사랑을 나누는 행동은 '아내가 결혼했다'의 사랑법 비슷한 느낌도 받게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했지만 사랑에 대해선 과감하게 행동함으로써 또 다른 사랑을 쟁취했던 그녀의 사랑법은 페르뒤의 인생에 커다란 방향점이 되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마농을 찾아가면서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다른 새로운 사랑에 눈을 떠가는 과정이 책에 대한 사랑과 책이 인간들에게 어떤 도움과 감성을 건드리는지에 대한 작가의 심리 묘사, 적정 장소에 어울리는 각 이름난 책에 대한 소개가 함께 들어 있어 종이 약국이란 책 제목이 참 잘 어울린단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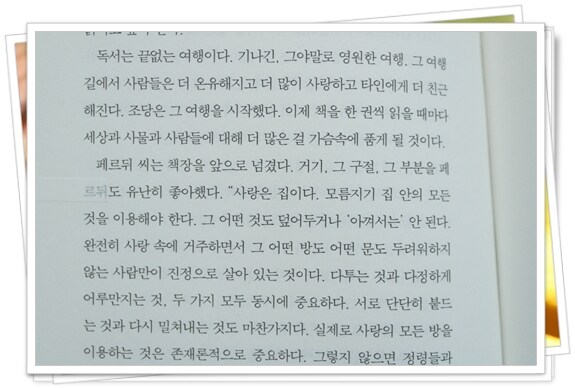
과거로부터 자신이 스스로 나오게 됨으로써 제 2의 인생을 또 다른 책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잔잔하게 그려지는 책, 이런 종이 약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꼭 한 번 방문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게 한다.
라벤더 향과 해바라기의 꽃들이 연상되는 프로방스의 전원풍경과 와인에 취하고 책에 취하고, 노을 진 풍경이 연상 떠올리게 되는, 작가의 출신은 독일인데 기욤 뮈소처럼 다른 나라인 프랑스를 주된 무대로 펼쳐서 그려진 점도 색다르게 다가온 책이다.
*****<이 리뷰는 출판사나 작가와 전혀 상관없는 몽실서평단에서 지원받아 읽고 내맘대로 적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