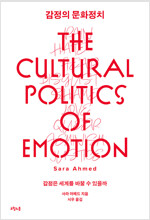"내 묘비는 당신이 될 거야."
보부아르 읽을 때 됐네,
오늘 아침에 나도 모르게.
프로이트는 20년 만에 읽어서 그런가,
더 귀에 착착 감기더라구요.
딸아이가 부탁한 일을 대강이나마 처리하니 이 시간이다.
30분이라도 걷고 오자 싶어 목도리 휘휘 두르고 패딩 뒤집어쓰고 나간다.
할 일이 잔뜩 쌓여있고 읽을 책은 더 잔뜩 쌓여있다.
별 거 아닌데, 참 그 별 거 아닌 걸로 사람들은 살고 죽고 또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말 한 마디에 사람이 죽고 또 사람이 살고 그러잖습니까,
라는 프로이트의 말이 들리는 것도 같았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정확히 말하면 묘비명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묘비명, 말고 묘비_ 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말았다.
이제는 거침이 없구나, 라고 대꾸를 하면서도
누가 누구를 거침 없게 만들었나? 라는 답을 들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부아르가 떠오르면서,
언니, 저 이제 언니 읽을 때 된 거 같네요, 라고 중얼거렸다.
보부아르 읽을 때 됐네.
읽기와 쓰기가 체화가 되어서 완전히 본연의 내가 된 것만 같은 그런 거 있잖아,
라고 친구가 이야기할 때도 알 것만 같은 기분에 고개를 끄덕였는데
말 한 마디에 보부아르가 떠오르는 현상을 마주하면서 응, 그래, 그런 것도 같다,
나 혼자 마음 속으로 대꾸했다.
지랄맞은 성격에 더 지랄맞게 말은 나오고 그럼에도 흥,
가벼워지는 마음은 겨울이기 때문이다.
그걸 알고 있다.
포인트가 어디에 있건 맥락을 찾아서 보자면
결국에는 오빠와 나눈 대화 속에 마주하는 현상들, 장면들, 그런 것 속에서
나는 계속 보이지 않는 걸 찾았던 것도 같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걸 찾기에는 너무 나이가 든 거 아니냐, 등등
속한 제한들이 방어벽처럼 나를 구축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정말로 마주해보니 스스로가 두려워한 것은 결국 하나뿐이었다.
오빠는 그런 뜻에서 내 등을 밀어주면서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냐, 동생아_
라고 강하게 응원해주었던건가 싶기도 하고.
엑스도 내게 그 말을 하긴 했다.
지랄맞은 성격대로 기어코 하고야 마는.
달달한 캐롤을 들으면서 온몸을 고양이처럼 늘려 기지개를 켜고
엄마와 사촌 언니와 코다리찜 먹으러 가기 전에 후다다다다닥
지랄맞은 서로를 십년 넘는 시간 동안 마주하며 함께 한 것도 어쩌면 기적이었으나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긴 했다.
짠해지는 순간들과 결국 여기까지 오고 말았다는 자포자기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궁극적으로는 웃음만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것이 결국 자기 위안이건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원수 같았던 관계이건
아이를 위한 마음이건.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긴 했다.
아니 이건 그냥 쓰지 말도록 하자.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보는 것들이 무엇이든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든
그것이 판타지에 불과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기로 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 말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마주할 것들을 받아들여보도록 하자_로.
이제야 책이 슬슬 읽히기 시작한다.
백수 노릇도 올해 겨울이 마지막이다.
말뿐인 걸 알면서도 겨우 말 한마디에 푸른색 나비들이 온몸에서 날아오르는 것만 같은
오늘 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