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달아 기분 나쁜 경험들을 겪고 또 입을 쀼_루퉁하게 내밀고 나는 고자질하는 아이처럼 숨이 곧 넘어갈 것처럼 세차게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 이래서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래서 저랬어, 그래서 기분 나빴어. 또 이래서 이래서 이랬고 또 저래서 저래서 저랬어, 그래서 정말 화가 났어. 현상을 마주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썰을 풀 때 나는 제일 좋아하는구나 이것도 알았다. 감정 고자_라고 소문난 두 사람이 주로 나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다. 감정 고자_라고 오해를 받는 이는 감정 고자가 아니다. 실은 어마무시한 감정 돌봐주기 주관자인데 어쩌다 그런 별명을 얻었다. 완전 정반대 성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이름 매치라니_ 너무 근사하다, 고 여겼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감정 고자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다. 스스로도 나는 감정 고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무관함_이라고 하는데 내 앞에서는 감정 고자로서의 탈을 벗고 별의별 욕을 다 해주며 맞장구를 쳐주거나 그건 네가 문제야! 라고 따끔하게 지적질을 하다가 이 감정 고자 같은! 버럭하면 아 이런 지금 내가 감정 고자로서의 탈을 벗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래버렸음, 하고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 싹싹 두 손을 발이 될 것처럼 빌어댄다. 희로애락의 파도 속을 오고가며 잠수를 하거나 둥둥 몸을 띄우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기도. 고요한 평화로운 순간은 노년에도 가능하다. 노년이 그런 순간들로만 점철되어 있으리라는 소리는 아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아니다. 희로애락이 가능한 순간들을 맞이하기로 했다. 나를 넓게 만들어주고 나를 깊이 알게 만드는 일. 자신의 실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할까. 가끔 묻기도 하지만. 나는 아직 나를 잘 알지 못한다_는 결론에 다다르고나니 이성적으로 계산하던 방식을 깨끗하게 포기하기로 했다. 때로는 본능에 휘둘려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다.
김기태 소설을 읽는 동안 이햐, 하고 감탄사를 연이어 내뱉었다. 김기태는 이제 겨우 단편 두 번째. 올해 여름에 뜨겁게 사랑을 했던 옛 연인을 20년이 지나고 오랜만에 만났다. 반갑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건 온전하게 나만의 착각이었다. 20년 전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좀 많이 좋았다고 여겼는데 난 그저 20년 전의 그가 좋았을 따름이었다. 20년이 흐르고 만나니 옛 연인은 거인이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이 되어버렸다. 오롯이 자기의 현재 인생, 자신이 만들어온 것들, 현재 자신을 둘러싼 안전망이 얼마나 견고하고 괜찮고 보수적인 곳인지를 설명하는데 3시간 정도를 쏟았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는 동안. 그 3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외롭고 고역이었는지 모른다. 아 지루해, 아 집에 가고 싶어, 아 내가 왜 여기에서 이딴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이런 감정이 흘러나오는 동안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아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행복하게 지난 20년을 살았네, 앞으로 더 성실하고 더 행복해지겠네, 맞장구를 쳤다. 맞장구를 치는 동안에는 예의를 지켰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 개새끼야. 라고 조용히 톡을 보냈다. 그리고 알았다. 우리가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아마도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서 20년 만에 옛 연인을 만났던 것도 같다. 20년 전에 아 그건 아닐거야_ 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개새끼였고 나는 너에게 개새끼였다. 그래서 우리는 맺어질 수 없었다. 끝까지 예의를 갖춰 서로를 대했으니까. 단 한 번도 서로에게 날것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니까. 옛 연인을 차단하기 전에 톡을 하나 더 보냈다. 야, 그리고 마누라 자랑은 정도껏 해. 좀 병신처럼 보여. 라고도 했다. 그게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만난 옛 연인에게 마누라 자랑만 한 시간 넘게 해대는 꼴을 보고 있자니 얘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싶어서 좀 암담하기도 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때_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내년에는 그에 골몰하면서 보내고 싶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다는 건 좋은 인연으로도 악연으로도 모두 다 풀이가 될 수 있다. 그러기에 그렇게 인연이 끊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한다. 엑스와 그 어느 때보다 이별을 맞이하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았다고 여겼던_ 연애했던 순간들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도 같다. 아쉽고 또 안타까워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 다른 이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으로도 그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16년 이상을 함께 해왔고 그렇게 서로의 손을 놓아주기로 했을 때. 비로소 어떤 관계의 형식을 빌리지 않고 서로를 마주했을 때, 편하다는 느낌을 동시에 가졌다. 많은 일이 있었다. 함께 하는 동안 좋아도 괴롭고 불편하고 짜증이 치밀어오르는 경우가 잦았던 관계들도 끊었다. 나를 살피는 동안 책을 오래 읽지 않았고 책을 읽지 않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활자로 접할 수 없는 것들. 새해가 오기 전에 책을 다시 읽을 수 있을까_ 라는 궁금증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다. 매번 나를 일으켜주었던 것은 활자였기에. 책을 읽는 사람이기에 책을 읽는 이들을 만나는 건 당연한 일 같기도 하다. 책을 읽지 않는 동안 엄마가 선물로 피부관리샵 6개월 이용권을 끊어줘서 차곡차곡 피부 관리를 받으러 다녔다. 두 시간 동안 누워 이런저런 관리를 받는 시간은 좀 많이 지루했지만 내 몸은 의외로 선선하게 수긍했다. 책을 읽지 않는 동안에는 내 몸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 조금 많이 먹던 습관을 소식하는 습관으로 바꿨다. 하루 한 시간도 걷지 않았는데 가능하면 하루 두 시간은 걸으려고 애썼다. 날이 추워지면서 외투를 입고 걷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진다 싶을 때 땀이 날 정도로 실내에서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했다. 책을 읽으려고 노력해봤으나 활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싶으면 과감하게 책을 덮었다. 읽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이렇게 사라지려나 잠깐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라깡과 김기태를 만났다. 그러니 다시 읽는다.
올해가 가기 전에 김기태를 만난 건 행운이다. 귤을 하나 더 까먹고 다시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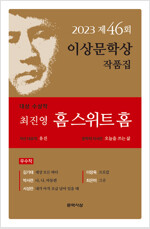
전철에서는 여전히 음악을 들었다. 음악을 듣고 있다는 걸 종종 잊기도 했다. 정신을 차려보면 자동 재생 때문에 엉뚱한 곡에 닿아 있었는데 그게 또 나쁘지 않았다. 인생은 지금이야, 야, 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아, 아, 아모르 파티. 알고리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연자 선생님 멋있네. 나 이제 아모르 파티를 알겠네. 전철역을 나서고도 집에 가지 않고 산책하는 날들. 노점에서 굽는 붕어빵 냄새. 담장 위를 걷는 고양이의 발걸음. 전동 킥보드에 올라탄 여중생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은총처럼 빛나는 저녁이 많아졌다. 하지만 맹희는 그 무해하게 아름다운 세상 앞에서 때때로 무례하게 다정해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런 마음이 어떤 날에는 짐 같았고 어떤 날에는 힘 같았다. 버리고 싶었지만 빼앗기기는 싫었다. 맹희는 앞으로도 맹신과 망신 사이에서 여러 번 길을 잃을 것임을 - P99
예감했다. 많은 노래에 기대며, 많은 노래에 속으며.
"나 조맹희. 나는......"
식탁 위의 호랑이. 솜으로 만든 맹수. 구르고 포효하고 플라스틱 이빨로 남과 나를 물어뜯고, 완두처럼 작지만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상대에 따라 콩알도 총알도 되지. 사랑이라면 삽질을 하다 내 발등을 찍지만 얕본다면 당신 정수리를 찍을 거야.
전신 거울 옆에 기념품인 삽이 있었다. 나무로 된 길쭉한 삽자루 끝에 빛나는 금속의 삽날. 꼭 그것처럼 생겼는걸. 맹희는 삽을 옆으로 들었다. 스타디움에 번개를 내리꽂는 록 스타처럼, 왼손으로 자루를 받쳐 잡고 오른손으로 삽날을 긁었다. 오늘은 호랑이에게만 들리는 기타 솔로. 제목을 붙인다면 롤링, 롤링 선더......!
- P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