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 - 지나온 집들에 관한 기록
하재영 지음 / 라이프앤페이지 / 2020년 12월
평점 : 



집은 나에게 무엇인가?
북성로집은 누구에게는 아늑한 ‘쉽터’이고, 서른살 엄마에게는 ‘일터’였다. 거동을 못하는 할아버지, 어린 두딸, 일주일에 한두번씩 집에 오는 큰삼촌과 둘째삼촌 가족의 구성원은 다섯이거나 일곱이거나 명절, 경조사때 세명의 고모네 가족까지 찾아오면 오롯이 모든 일은 엄마의 몫이었다.
글을 읽는 순간 여든의 연로하신 어머니(8남매의 장녀)가 생각이 났다. 우리집은 빠듯한 공무원 아버지(6남매의장남)의 월급으로 우리 오남매와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이모, 삼촌, 작은아버지, 그들의 조카들까지 직장에 취직이 됐다고, 또 서울 학교에 입학했다고 좁디좁은 방 두칸을 우리식구 일곱명과 나누어 살았던 기억이 많다. 삼촌이 부르는 조용필의 단발머리, 창밖의 여자를 듣고 나의 유년시절도 시작했다.
올해만큼 부동산 대책이 연일 쏟아져 나오던 해가 있었던가? 자고나면 오르는게 집값이다. 발표에 발표를 거듭해도 일반 서민이 내집 한 채 갖는게 그렇게 많은 규제와 검증을 통과해야만 얻어지는 것이라면 팬데믹 시대에 집을 갖고자 하는 꿈은 현실과 점점 멀어져간다.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 하재영작가의 인생사에서 ‘집’이 곧 역사이다. 그것은 작가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독자 모두가 공감하는 점이다. 독자는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지나온 자신의 집들을 머릿속에 아니 가슴속에 기록할 것입니다.
책속에서- ‘대구의 강남’, 그 동네에서도 가장 비싼 집’에 사는 5년 동안, 나는 집이 가진 계급과 자본의 속성을 알아차렸다. 단지와 단지로 이루어진 아파트와 고급 빌라는 비슷한 계급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신분제 공간이었다. 신분제 안에는 이 아파트보다 저 아파트가 비싸고 이 단지보다 저 단지의 집이 넓다는 차이가 있었다. 어떤 어른들이 그렇듯 어떤 아이들은 그 차이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로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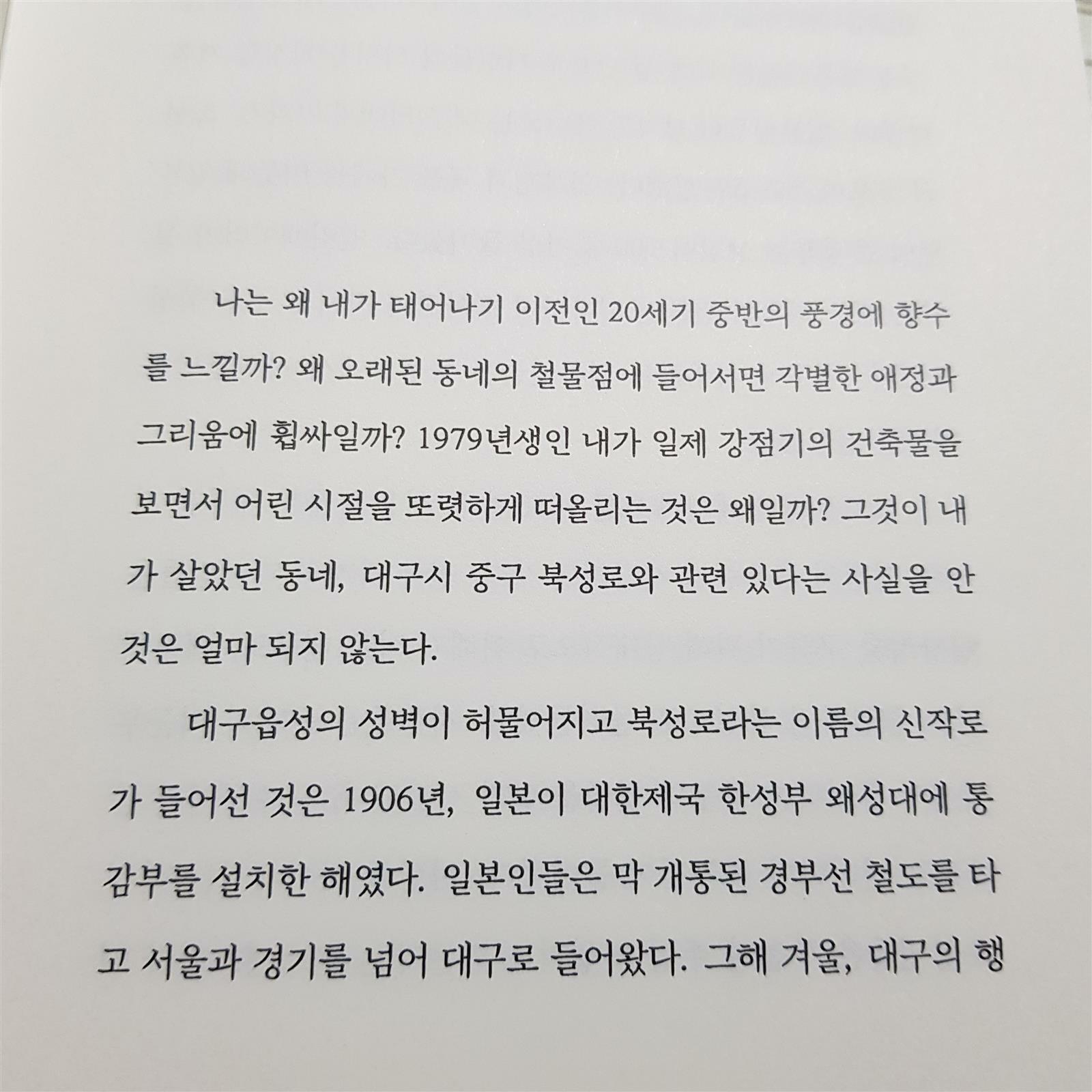
책속에서- 무엇이 가난일까? 한강다리 위에서 아파트촌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도 언젠가는 이 도시에 집 한 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 마음이 저려왔던 순간을 가난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까? 어떤 방에 살아보고 나서야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스스로의 어눌함을 자책하던 순간을 가난이라 명명할 수 있을까? 전 세입자가 그랬듯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침묵한 채 폭탄 돌리기를 하는 심정으로 그 방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던 순간과, 죄책감에 휩싸여 도망치듯 떠나던 순간을 가난이라 말해도 괜찮을까?
난곡의 안쪽을 바라볼 때마다 ‘여기’가 최악은 아니라는 안도감과 ‘저기’로 굴러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누가 ‘집주인’이야? 내가 ‘집주인’이야! 거긴 아직 ‘내 집’이라고!”나와 같은 세입자이면서 ‘집주인’이라는 단어를 힘주어 발음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으니 혼란스러웠다. 두 세입자가 다투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누가 이곳의 주인인가? 소유자인가, 거주자인가? 흔히 말하듯이 소유자만이 집주인이라면 언제나 세입자였던 나는 한 번도 주인이 아니었던 사람, 집 없는 사람이었던 것일까?
라이프앤페이지에서 협찬받은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