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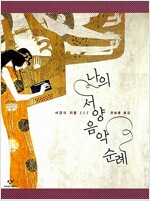

12월이야 내남없이 번잡하고 어수선한 달이다.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한 해를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자'는 말은 山中에 거하는 이들에게나 가당한 소리지 저자거리에 의탁해 사는 나같은 속인
무리에게는 뜬금없는 클리쉐다.
그 12월에 여러가지로 심란하기 짝없는 생업에 쫓기며 틈틈히(자주!) 술도 마시고 해장안한
쓰린 속과 아픈 머리로 몇 권 들여다 보았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두권을 뽑자면 미유키여사의
<고구레 사진관>과 서경식 선생의 <나의 서양음악순례>다.
나는 미유키 여사가 '에도 시대'에 가있을 때가 가장 좋다. 한국인인 내가 '에도'로 상징되는
일본 문화사의 어떤 맥락을 체감하겠는가마는 그녀가 그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의 따뜻함을
좋아한다. 그런데 현대물인 이번 작품에서 그녀의 그런 '시선'을 느꼈다면 나의 오독인가.
미유키여사는 진화하고 있다. 이 책 재밌다. 진짜다.
서경식 선생의 <나의 서양음악 순례>는 요즘 유행하는 클래식 음악 해설서라기보단 서선생의
연애사, 성장담이다. 아주 고통스러운...! 우리 현대사는 그와 그의 가형들인 서승, 서준식
형제들에게 빚을 졌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사실이다. 형들은 낯선 '고국'에서 감옥살고
홀로 '태어난 곳'이지만 이방인일 수 밖에 없는 '낯선 곳'에서 악전고투하며 살아야 했던 한 청춘의
성장기에 음악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울림이 더크다. 이 책은 한 챕터씩 읽고 쉬었다가 읽는 것이
좋다.
코넬리의 <다크니스 모어 댄 나잇>은 보슈 팬덤들에게 코넬리가 하사하는 종합선물세트다.
다 나온다. 정말이다. 보면 안다. 누가 나오는지는 말할 수 없다. (절름발이가 범인이다 ㅎㅎ)
코넬리의 팬이라면 어느 한 챕터에서 반가움에 짜릿할것이다. 재밌다. 보슈는 더 철학적이 되었다.
스티븐 굴드의 <풀하우스>는 진화심리학에 대한 관심이라기 보단 이 책의 한 챕터인 "4할 타자의 딜레
마'때문에 읽었다. 야구 '덕후'인 아들놈은 야구 통계학에 관심이 많고 내가 맞장구를 처주자면 꼬맹이들
은 모르는 '뭔가 좀 근사한' 이론이 필요했다. 3부에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4할타자가 사라진 이유를 찾
아가는 굴드의 시도는 흥미롭다. 이 접근방법은 요 근래 카이스트 정재승교수의 <백인천 프로젝트>로
변용되고 있다. 그것도 트윗을 이용한 다중지성이란 흥미로운 실험으로...이 프로젝트의 결과가 발표되
는 내년 3월이 기다려진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11072.html)
레비의 <주기율표>는 샘 킨의 <사라진 스푼> 다음에 읽었다. 일종의 잠언집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희미하게, 또는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것들을 일일이 호명하여 슬프고 아름다운 속성을 부여한다.
읽다보면 "이 노인네 욕심은.."소리가 나온다. 샘 킨의 책과 두권을 병독하면 대단한 시너지다.
샘 킨의 책이 열전(列傳)이라면 레비의 책은 전기(傳記)다
정민선생은 요 근래 '다산'에 천착한다. 반쯤 읽었다. 정선생의 책은 두고 두고 읽는다. 이번 책의
문체가 내가 좋아하는 그의 스타일이다. 개인적으로 정민교수의 문체가 가장 빛나는 책은
<마음을 비우는 지혜 : 청언소품>과 <한시미학산책>(개정판말고 구판!)을 꼽는다.
어지러운 엄동시절이다. 가카와 그 무리의 패악과 도적질은 그 끝을 모른다.
수첩에 적어놓고 한번씩 바라보는 옛 글이다.
年年喜見山長在 日日非看水獨流
해마다 즐겁게 바라보는 산은 거기 있고
날마다 슬프게 바라보는 물은 외로이 흐른다
'獨流'하자고 다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