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 라는 질문의 대답에 따라 정치적 스탠스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열광과 박수, 숱한 오해와 억측 그리고 조롱과 비난, 그 넓디 넓은 스펙트럼 어느 지점에서 나는 '인문주의자, 공화주의자로서 유시민'을 좋아한다. 특히 그의 글쓰기는 하나의 '전범'이지 않을까.

존 버거 할배 이래 사진에 대한 메타 평론이나 에세이들을 즐겨 읽는다. 교보에서 무심코 집어 읽다 구매한다. 버거옹보다는 가볍고 손탁 할매보다는 덜 딱딱하지만 조금 더 우아하다는 느낌.
주말 사진가로서 '사진'과 '카메라'를 조금 지분거려 본 경험에 따르면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선 '카메라 퀵 가이드'보다 '사진론' 책이 더 도움이 된다.
텍스트로 읽은 사진과 피사체에 대한 독창적 해석은 내가 실제 뷰파인더와 마주 보았을 때 색다른 프레이밍으로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다이어의 글은 '보기에 좋다'. 특히 '사진'이란 물건이 '시간에 저항하려는 인간들의 헛되고 가여운 안간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더욱.

나는 이택광을 좀 삐딱하게 바라본다. '지식 수입상'이란 악담과는 다르게 한윤형과 고은태를 바라보는 그 어떤 지점에서 말이다. 물론, 당연히(!) 김난도를 보는 지점과는 대척점에서.
그럼에도 이 책은 공화국의 시민에서 '공주국의 신민(臣民)'으로 이 시절을 살아내는 나에게 끌린다. 목차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지 짐작이 가지만. 아..그런데 너무 얇다. 200페이지 미만의 얇은 책은 죄악이다. 무례이자 패악이다. 그러나 시절이 더 흉악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마녀들을 만나게 될까.

매달 자동차 잡지 <모터 트렌드>를 사서 아껴가며 읽은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지 방 책장에 꽂아놓는 아들놈을 위한 책. 야구 '덕후'이자 자동차 매니아인 아이에게는 경전이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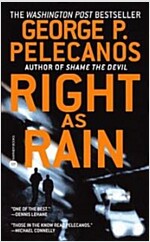
황금가지에서 <살인자에게 정의는 없다>로 번역된 펠레카노스의 이 책은 이미 읽었다. 영문판으로도 읽고 조영학의 번역판으로도 읽었다...이번엔 선물용이다. 누군가를 '깨몽'시켜야 하기에.
적나라한 폭력과 디테일한 마약 묘사...17금 정도의 선정성...쓰레기 군상들의 한판. 욕과 슬랭의 향연.. 전형 적인 펄프픽션이라고 폄훼할 수 있지만 읽다 보면 마구 뿜어 나오는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저절로 느껴진다. 이런 책 너무 좋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