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어머님과 아버님은 하늘로 떠나셨다. 형제들은 울지 않았다. 이미 수십년 전에 돌아가실 것을 예견한 때문은 아니다. 여든이 넘게 사셨다는 것이 형제들에게 기적이었다. 벌써 40년 전부터 어머님은 언제 돌아 가실지 모를 병환으로 시달리셨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다. 아버님도 몇 번의 수술을 마치면서 결국 이번에 숨을 거두셨다.
나 또한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다. 가끔 내 나이의 아버님을 모습을 생각할 때가 있다. 그땐 아버님이 크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고단하고 힘든 시절을 아프게 지나고 계셨다. 철이 없으니 부모의 아픔을 보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알았다 한들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종종 죽음을 생각한다. 타인의 죽음이 아닌 나의 죽음을. 나의 마지막, 나의 끝은 어떤 의미일까? 숨을 거두기 직전 막내 동생이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시골 집에 한 번 가고 싶어 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나온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물론 면회도 철저히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서만 잠깐 이루어졌다.
<우리 옛집> 두 번째 책을 주문했다. 첫 책은 강원경기전라제주충정 지역이다. 이번에 주문한 책은 경상도 편이다. 어쩌면 이런 책은 이룰 수없는 꿈을 위한 대리만족인지도 모른다. 가끔 주변의 촌집과 고택을 방문하면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가히 어마어마한 집들이다.


하지만 기본틀은 초가집이나 대궐집이나 비슷하다. 구들방, 기둥에 흙벽을 하고, 초가나 기와로 지붕을 인다.
최근 한류 때문인지 모르나 한옥이나 한국의 구들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구들의 역사는 문헌상으로 기록된 것으로도 삼국시대 이전이라고 하니 가히 수천년은 흘렀을 것이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근방인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낭방 문화이다. 그들도 겨울이 있고 추웠을 텐데 한국만이 구들난방 방식을 사용했다니... 비교문학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이 있었다고 하지만 한국만큰 정교화된 곳은 없다.





<초가집과 대화> <초가집 이야기>도 궁금해 담아 놓는다. 지금은 시골집이 기와지만 그 집 이전에 아주 어릴 때의 집은 초가집이었다. 매년마다 가을 걷이가 끝나면 아버지와 친한 몇 분이 모여 지붕을 잇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잘못이면 비가 새서 힘들었던 기억도 난다. 하는 수 없이 비료 포대를 엮어 비가 새지 않도록 했다. 삭은 볏집 지붕을 걷어내면 수많은 굼벵이들이 두두둑 떨어졌다. 지금에야 그것들이 풍뎅이 새끼들이란 것은 알았지만 예전에는 굼벵이가 성체인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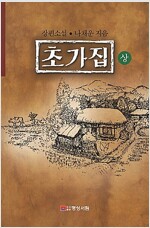

아내의 책이 곧 출간 예정이다. 연말에 출판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인쇄소에 확진 자가 발생하거나 인쇄물량이 밀려 내년 초로 미뤄졌다. 내년부터는 매일성경을 매일 묵상할 예정이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매일 성경을 읽고 글을 쓰지만 질서가 없어서 작은 질서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