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카의 여행
헤더 모리스 지음, 김은영 옮김 / 북로드 / 2021년 4월
평점 :



“실카의 여행 (헤더 모리스 著, 김은영 譯, 북로드, 원제 : Cilka’s Journey )”을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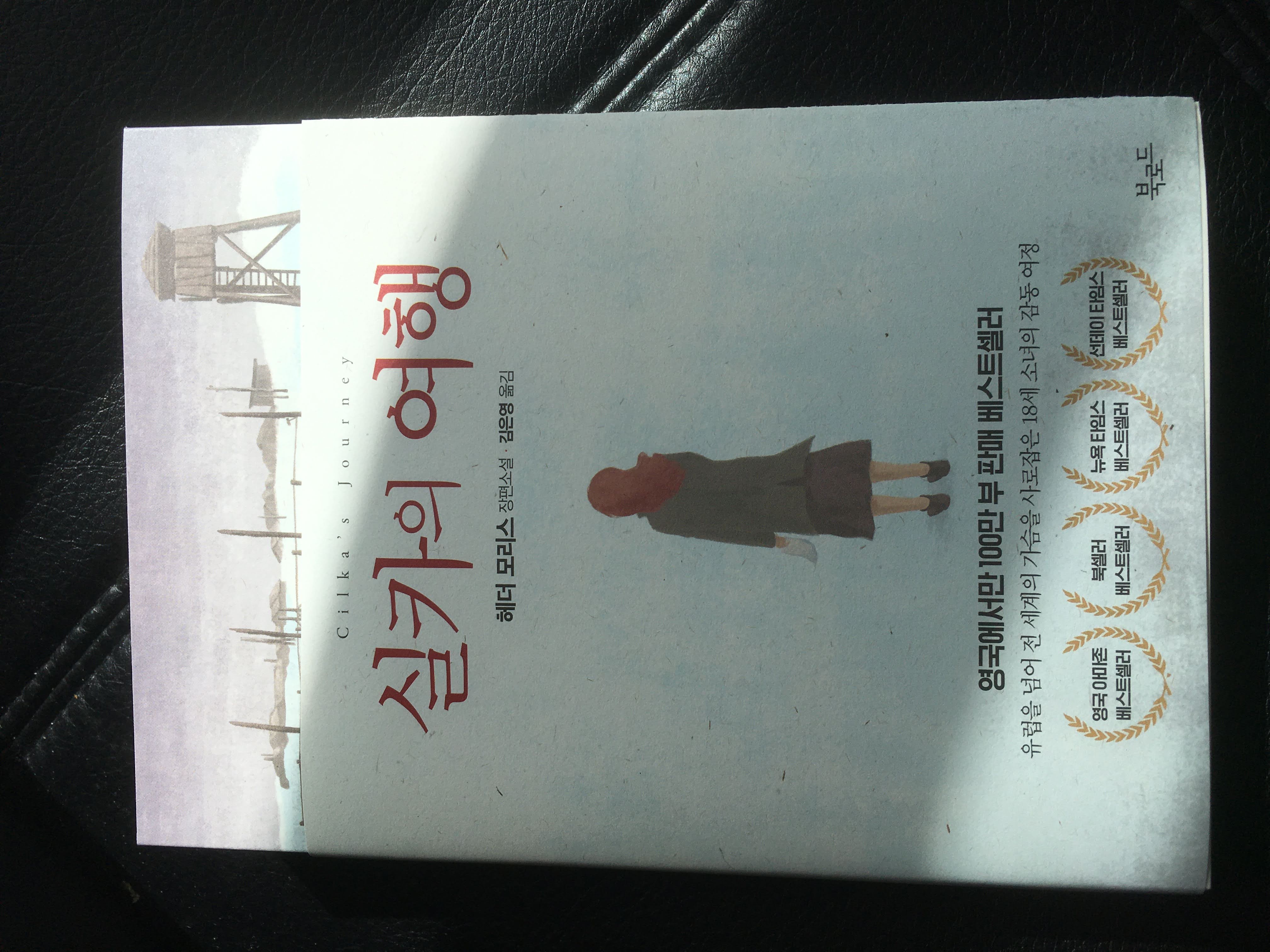
헤더 모리스(Heather Morris)의 전작 “아우슈비츠의 문신가 (박아람 譯, 북로드, 원제 : The Tattooist of Auschwitz)”을 읽어본 독자라면 실카라는 이름이 낯익으실 겁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었던 랄레가 이야기했던, 생존을 저항의 수단으로 선택했던 영웅, 바로 그녀가 십대의 소녀 세실리아 클라인, 즉 실카입니다.
“1942년 4월부터 여기에서 무엇을 했지?”
“살아남는 일이요.”
실카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지만 전후 다시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죄목은 살아남았다는 것. 무려 15년의 노역형. 아우슈비츠에서도 그랬지만 북극권에 있는 시베리아의 보르쿠타 굴라크는 엄청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과도한 노역으로 인해 살아남는 것 자체가 엄청난 투쟁입니다. 유폐 지옥이라 불리웠던 강제 노역 교화소, 굴라크 (ГУЛАГ). 하지만 실카는 그녀가 가진 용기, 그리고 연민을 무기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용감하고 영웅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실카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옥의 여정에서도 살아내고 삶을 살아가고야 맙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은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누구나 영웅적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소중한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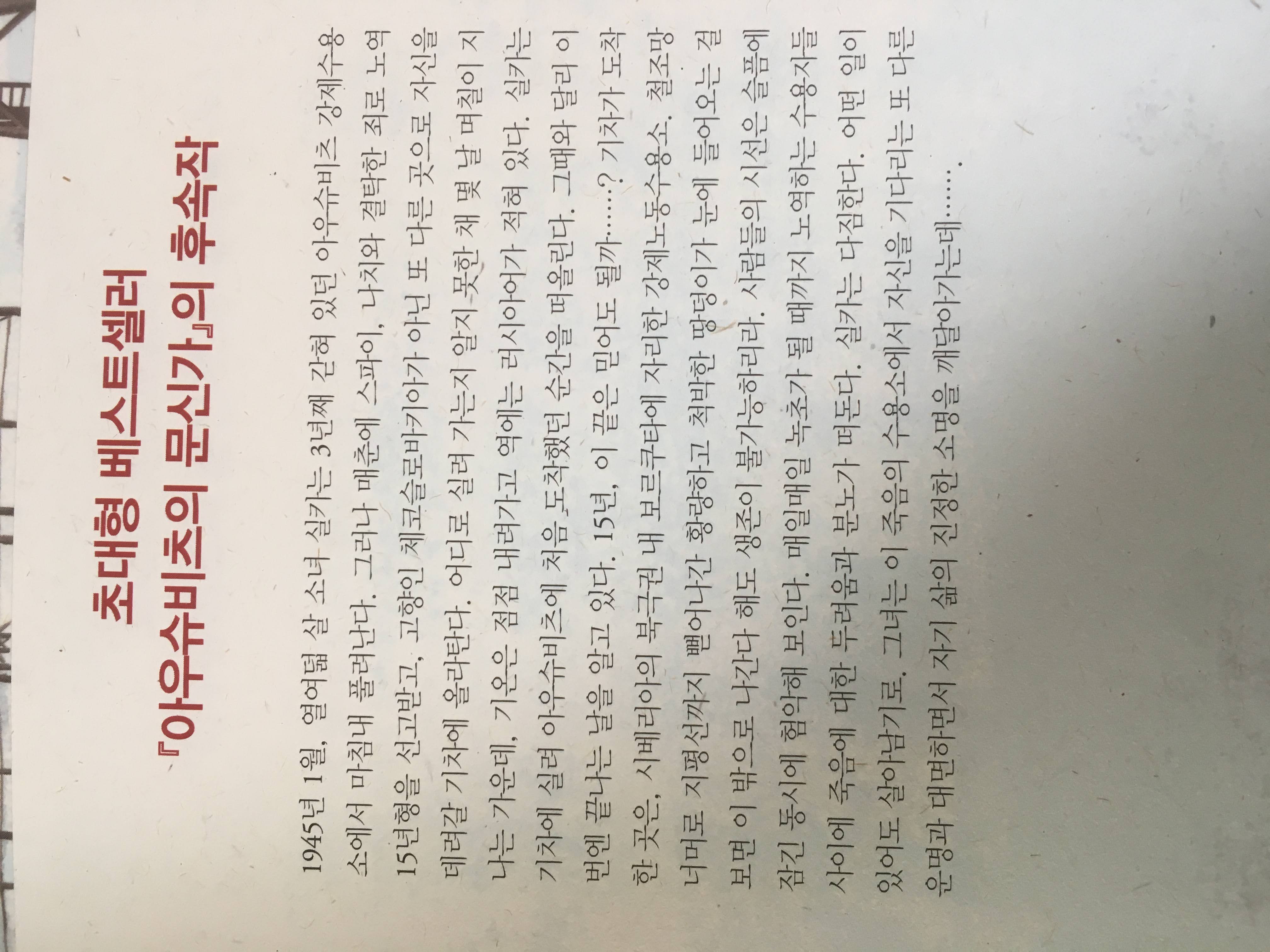
덧붙이는 말 : 실카는 끝끝내 살아남아 승리하였고, 2004년까지 나름의 행복을 누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네,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실존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소설입니다.
#실카의여행, #헤더모리스, #김은영, #북로드, #리뷰어스클럽, #영미장편소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