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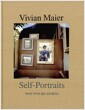
-
비비안 마이어 : 셀프 포트레이트 ㅣ 비비안 마이어 시리즈
비비안 마이어 사진, 존 말루프 외 글, 박여진 옮김 / 윌북 / 2015년 8월
평점 :

품절

비비안 마이어의 삶은 사진 그 자체였을까. 무명으로 죽어 유명해진 예술가는 많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몰라주는 세상에 소외된 채 인정받지 못하고 죽었고, 죽은 후에야 가치가 높아졌지만, 아마도 진정으로 그것을 원한 건 아니었을 거다. 자신이 포착한 세계가 예술로서 인정받지 못할 때에 아마도 많은 작가들이 절망하지 않았을까. 욕망은 때로 예술가의 연료일 수도 있으므로. 대부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마이어의 삶은 철저한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보모와 간호보조 등으로 일하면서 은밀하게 자신만의 시간동안 자신만의 시각으로 담은 순간적 진실들을 그녀는 대부분 인화조차 하지 않았다.
집 없이 떠돌이처럼 남의 집에서 일하며 먹고 사는 처지에 놓인 자신에게, 필름 상자들은 짐 덩어리였다. 결국 보관할 곳이 없어 창고를 임대해 보관하던 중, 사고로 골절상을 당하고, 사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상에 침묵한 채 죽고 말았으니, 그 창고 속의 필름들을 수집해서 행운을 잡은 사람들의 운명은 또 무언가. 세상 끝까지 치솟아 오르는 그녀의 작업 하나 하나를 모아놓은 필름 한 상자를 부동산 업자 존 말루프가 경매로 손애 넣었을 때의 가격은 400달러 였다고 하니, 행과 불행의 아이러니는 어쩔까.
책은 그녀의 인생과, 작품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는다. 그녀가 남긴 것이 그저 인화되지 않은 엄청난 양의 네거 필름인 것처럼, 책은 그녀가 포착한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위치시킨다. 비비안 마이어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포착한 세계 속에 넣었다. 자신의 모습은 거리 곳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모퉁이마다 그림자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햇빛 건너 상점 창유리에도,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어느 차창 속에도, 때로 익숙하게 때로 낯선 모습으로, 친구처럼 타인처럼, 내가 바라보는 세계 속에 떠나지 않고 있다.
평생 많은 점의 자화상을 남긴 렘브란트가 생각난다. 부자로 태어난 그는 거지로 죽었다. 그 조금씩 변화하는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면서 순간처럼 지나쳤을 한 사람의 고단한 생이 보인다. 예술가로서의 자기 철학을 버리지 않았기에 조금씩 명예와 돈과 세상이 중요시하는 가치들을 잃어, 초라한 모습이 되어가는 그, 그것을 다시 그림에 담아내고, 후대에 다시 영원히 남을 명작들로 가치매겨진.. 혼자만의 세계에서 그 누구와도 사진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도 않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자 삶 자체인 사진을 세상이 매기는 가치로 환산하고 싶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다. 제주도에 갈 때마다 김영갑 갤러리를 찾는데, 그가 더이상 굶지 않아도 될 때에 죽음 직전에서얻은 저주적 병이 그에게 영감의 원천이었던 자연 그대로의 제주도가 거센 상업화와 관광화의 길로 내몰려 중국인들의 소유지들로 채워지는 모습들을 보면 그의 비극적 죽음과 닮은 것 같아 씁쓸하다.
그의 작품들을 처음 발굴하고, 사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flicker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온 존 말루프가 직접 편집해서 엮은 사진집이다. 큐레이터 작가 앨리자베스 아벤돈의 서너페이지 쪽의 서문 말고는 다른 텍스트 없이 모두 사진이다. 1956년경의 흑백 사진부터1970년대 말까지의 약간의 컬러 사진까지 여러 장소에서 찍은 셀프 포트레이트들의 모음이다. 흑백 사진이 주는 차분한 대조와 거울과 그림자 속에 투영된 마이어의 모습들이 잔상처럼 머물다 흩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