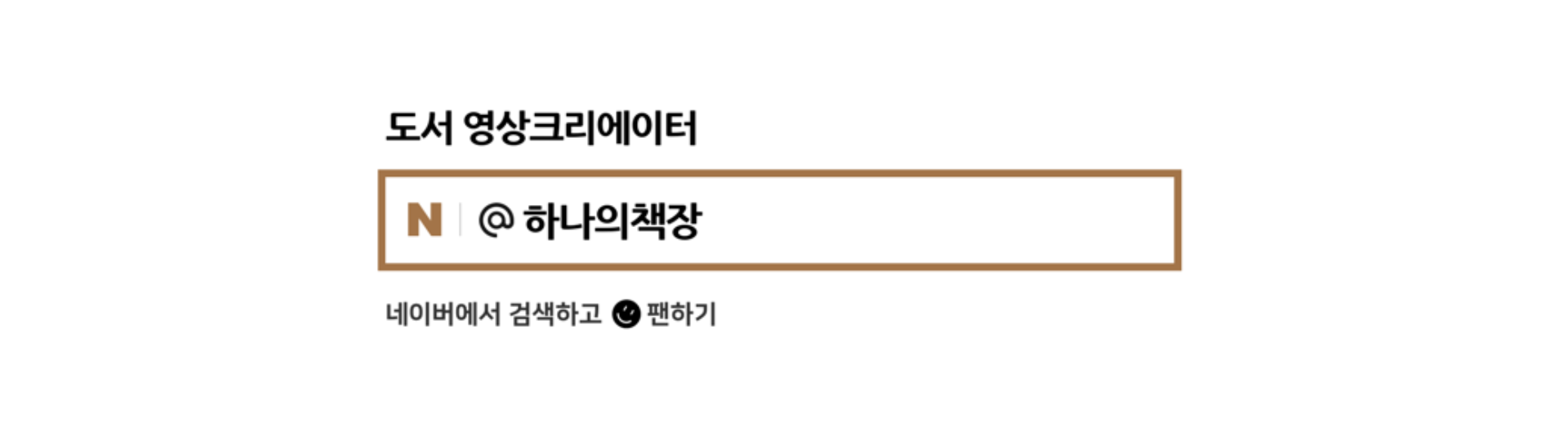보통의 언어들
저자 김이나
위즈덤하우스
2023-09-20
에세이 > 명사에세이
에세이 > 한국에세이
마음을 살피는 언어가 관계를 지켜준다.
■ 책 속 밑줄
웨이브라는 의미에는 파동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그 형태가 쪼개어 들어가보면 물질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없는 저에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아,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어쩌면 파동이겠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와 통한다는 것을 "쟤랑 나랑은 코드가 맞아, 주파수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파동의 만남이고 그 파동이 서로 박자를 맞추어가는 것이, 우리가 한 사람과 긴 길을 오랫동안 걷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한 경계선이 없어 혼돈스러운 감정들이 있다.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다. 좋아하는 마음에 확실히 매듭이 지어져서 결단코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대개의 사랑은 '좋아함'에서 싹트므로 그렇게 방심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에 부등호를 붙일 생각은 없다. 이 둘은 맞닿아 있는 듯 완벽하게 다른 세계를 빚어내는 감정이며 그저 '좋아한다'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지 잊지 않길 바랄 뿐이다.
실망이라 함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상한 마음'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상한 마음'이 아니라 '바라던 일'이다. 실망은 결국 상대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다. 무언가를 바란, 기대를 한, 또는 속단하고 추측한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고유의 모양으로 존재하는데,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그렇다.
그러나 '기대'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늠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자 낭만이니까. 그게 없이 어찌 사랑에 빠지거나 연민을 느낄 수 있겠는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인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 소수와의 관계는 견고한 것이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서는, 나는 누군가와 진실로 가까울 자신이 없다. 우리, 마음껏 실망하자. 그리고 자유롭게 도란거리자.
결정적으로는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거죠. 그때 느끼는 벅참이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벅참을 느끼는 거 같아요. 함께 있기만 해도 나를 좋은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비로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또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선을 긋는다는 말은 내겐 '모양을 그린다'는 말과 같아. 5개의 선을 그어 만들어지는 게 별 모양이다. 다시 말해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야'라고 알리는 행위가, 선을 긋는다는 의미이다. 간단하게 지도를 떠올려보자. 꼬불꼬불한 선으로 나뉘어 있는 수많은 국가들은, 선이 있다고 해서 서로 단절된 관계들은 아니다. 한 예로 유럽의 경우 각국의 법령, 풍습, 기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차이들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지키기 위한 테두리로 그려져 있지 않은가.
나의 인생을 극으로 본다면 작가는 나고 주인공도 나다. 작가가 위기에 빠진 주인공 곁에 같이 앉아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하고 발을 동동 굴러선 안 되는 법이다. 걱정에 빠진 내 인생의 주인공인 나를 위해 작가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음 회차로 이야기를 진전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순리에 모든 걸 맡기는 것.
생각에 갇혀 잠 못 이루는 밤, 긴 숨을 쉬어보자.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만 집중해보자.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잘 살아 있다. 걱정에 빠진 나를 구원하기 위해, 가만히 숨을 쉬며 누워 있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된 다음, 주인공을 위한 최선의 다음 화를 써내려가는 거다. 주인공이 방치될 순 없으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자존심이 꺾이지 않으려 버티는 막대기 같은 거라면, 자존감은 꺾이고 말고부터 자유로운 유연한 무엇이다. 자존심은 지켜지고 말고의 주체가 외부에 있지만 자존감은 철저히 내부에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누가 아닌 스스로를 기특히 여기는 순간은 자존감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 선행에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욕망이 부록처럼 딸려온다. 어릴 때 칭찬에 길들여졌을 수많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내성이고, 특별히 나쁠 것도 없는 점이기도 하다. 허나 선행이 누군가의 칭찬과 거래되는 순간 자존감 통장에는 쌓일 것이 없다. 나의 대견함을 '알아주는' 주체를 타인에게 넘겨버릇하는 게 위험한 이유다.
■ 끌림의 이유
김이나 작가의 글은 무심코 지나쳤던 감정의 결을 다시 어루만지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번 책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란 참 무섭습니다.
가볍게 던진 한 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작은 표현 하나에 관계가 180도 달라질 수 있으니깐요.
때로는 위로가 되고 싶지만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사랑을 말하고 싶은데 어쩐지 거칠게 밀어내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보통의 언어들』은 그런 마음들의 낯선 감정을 조용히 조명해줍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말을 바라보았을까요.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된 친구의 조언처럼 따뜻하고 단호하게 마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쉽게 쓴 글도 없었고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문장조차도 없어 단 한 문장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책이었습니다.
■ 간밤의 단상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말을 내뱉고 후회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말을 아끼다 오해를 쌓아갈까요?
말은 마음의 옷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말은 곧 나 자신입니다.
즉, 말을 탓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게 결국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니깐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말을 너무 가볍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기 위해 신중히 고르듯이, 좋은 말 또한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또한 진심도 말로 다듬지 않으면 날이 서 있을 수 있기에 조금 더 섬세하게, 더 성실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아끼던 하루였나요?
혹은 너무 많이 쏟아낸 하루였나요?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하고 예쁜 언어로 스스로를 그리고 누군가를 다독여보세요.
■ 건넴의 대상
말로 상처를 주고 받은 경험이 있는 분
관계 속에서 마음을 전하는 법을 고민하는 분
일상 속 언어를 더 따뜻하게 가꾸고 싶은 분
♥
이 책을 읽고 마음에 남은 문장이나 순간이 있다면 공감(♥)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감상이 더해지면, 이 공간은 조금 더 깊고 따뜻해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