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게네스는 초기 기독교 시기 중요한 신학자 중 한 명이다.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교리문답학교를 운영하기도 했고, “헥사플라”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6개 성경 본문을 비교/대조한 대작을 펴내기도 했던 성경연구가이자, 수천 편의 저작을 남긴 정력적인 저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비운의 신학자인데, 최근에는 그 이단 정죄의 근거에 대해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오리게네스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성경해석학에 기여한 독특한 공헌 때문인데, 그는 이른바 성경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이 책은 오리게네스의 성경해석법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을 서사적으로 되짚어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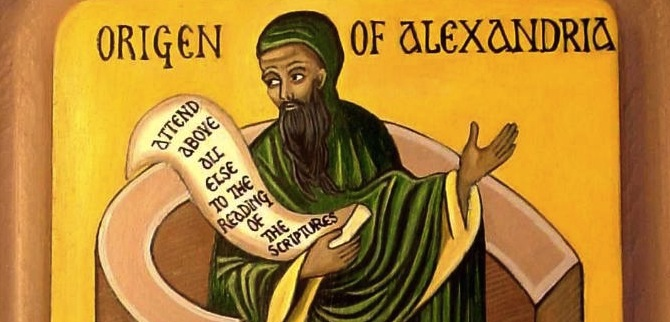
물론 오리게네스 이전에도 알레고리적 방식으로 문헌을 해석하는 시도는 존재했다. 고대 그리스에 상징(그리스어로 “심볼론”)은 BC 6세기에서 4세기 사이 인간과 신 사이를 이어주는 신성한 증표로 여겨졌고, 이 시기를 거치며 호메로스 같은 이들을 시인에서 선지자로, 그들의 작품은 서사시에서 신탁을 감추고 있는 상징으로 격상되었다.
플라톤 사상 전통에 바탕을 두고 이런 상징을 전면에 들고 나온 인물이 암모니아스였다. 그는 텍스트 상징을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플라톤이 물질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켰던 천상계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런 암모니아스의 1세대 제자가 바로 플로티노스, 신플라톤주의 주창자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리게네스가 등장한다. 오리게세네스 역시 플로티노스와 마찬가지로 암모니아스의 제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동기인 플로티노스와는 다른 문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바로 구약성경이다. 그는 구약성경을 신적 비밀이 가득한 일종의 텍스트 상징으로 보았고, 이른바 비유 해석법, 즉 알레고리를 통해서 그 상징 속 본래 의미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저자는 우선 이렇게 오리게네스의 학문적 계보가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책은 흥미롭게도 오리게네스의 개인적 삶의 연대기와 그의 신학적 작업을 매치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런 구성을 통해서(그러니까 오리게네스의 저작이 나온 순서와 배경을 아울러 살핌으로써) 자연스럽게 그의 사고와 사상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함께 살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주된 주제는 그의 알레고리적 해석 방식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다. 특히 알렉산드리아에서의 정치적인 이유로 쫓겨난 후 정착한 팔레스타인의 카이사레아(가이사랴)에서 그의 작업은 유대 랍비들과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장으로 접어든다. 흥미로운 건 성전이 파괴된 시대를 살고 있던 랍비들 역시 일종의 알레고리로 구약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유월절의 핵심적인 상징인 “피”를, 유대인들은 모리아산에서 흘린 이삭의 피나, 그에 앞서 할례를 행할 때 흘린 아브라함의 피로 해석하곤 했다. 이에 반해 오리게네스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큰 차이점이 있고.
국내 저자 가운데 교부 신학을 전공하고 이렇게 책(원래는 논문이었지만)까지 내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책의 내용 역시 흥미로운 설명들이 잔뜩 발견되어서 즐거운 독서를 할 수 있었다.
특히 1장 “상징의 시대”와 4장 “텍스트 상징으로 지은 성전” 부분이 새로운 내용들이 많아 집중해서 읽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가벼운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준다. 작고 얇은 볼륨이기도 하니,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