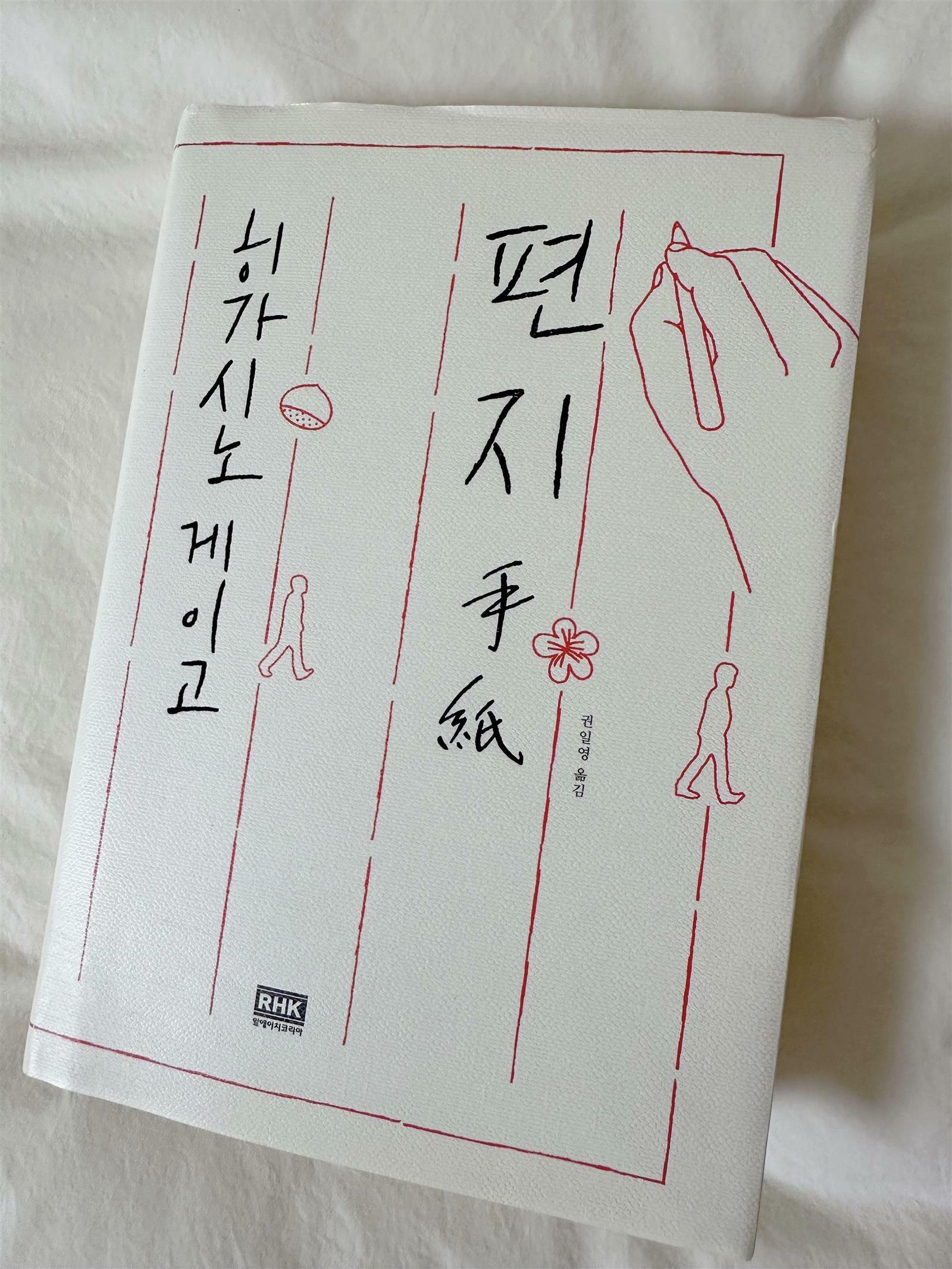‘나’로 살아갈 수 없는 한 남자가 있다.
그는 행복과 불행이란 것의 극명한 대비를 느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지금의 이 불행한 현실이 앞으로도 자신을 옥죄고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만큼은 안다.
세상과 사람이 그걸 분명하게 알려준다.
나오키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떻게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생각한다. 구린 냄새를 풍기는 술집 전단지 한 장도 그냥 넘겨볼 수 없다. 그런 나오키를 담임 선생님인 우메무라가 한 식당에 데려가 저녁을 사주며 그 식당에서 일하기를 권한다.
(P. 61) “점장하고 아는 사이야.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만 아르바이트로 써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네가 괜찮다고 해야겠지만.”
생계와 연관된 돈벌이라면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을 나오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며, 의사를 물어봐 주는 선생님의 세심함이 감사하다. 스치듯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존중’의 마음을 나오키는 처음 느꼈봤을 것 같아서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오키에게 남은 식구는 형 츠요시 한 명 뿐이다. 형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죽도록 일만 하다가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돌아가시게 된 어머니 대신이었다.
가난 속에서도 대학을 가라는 어머니의 모습을 형이 고스란히 이어받아 동생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모든 게 다 닮아있었다.
체력만큼은 자신이 있었기에 이일저일 해 온 게 화근이었던 걸까.
몸이 망가져 츠요시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
가난하다고 해서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삿짐센터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온화한 얼굴로 넉넉하게 사는 할머니를 떠올린다.
조금 훔친다고 해서 타격을 입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같은 사람을 용서해줄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
나오키는 형을 기다리며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전화벨이 울린다. 경찰이다.
흐르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흐르고, 다음 날 텔레비전에서 낯선 표정을 한 형의 모습 밑으로 ‘홀로 사는 부유층 여성 살해’라는 자막이 보인다.
불행하게도 형의 죄는 연좌제가 되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만으로도 형벌과 다를 바 없는 나오키의 인생은 누군가의 입술에서 자신의 이름이 다정하게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고, 알 수 없었던 삶의 방향은 불행을 가리켰다.
‘형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다 끔찍하기만 하구나’라는 생각으로 서로 만나는 것이 되려 고통이었을 나오키는 형 면회 가기가 쉽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나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자신의 몸을 혹사시킨 형을 원망하는 것도 어렵다. 그렇게 자신과 형 생각을 하는동안 정작 피해자 생각은 못했다.
그저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
나오키에게 행복은, 차츰 열리다가 닫히는 문처럼 말없이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아도 살다 보면 실낱같은 빛줄기를 발견하기도 한다. 남들과 똑같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그 순간만큼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고 보통의 사람으로 사는 기분을 느껴보기도 한다. 그 당연한 일을 즐거운 일로 여긴다는 게 서글플지도 모르지만,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살아가는 자체만으로 나오키는 더 바랄게 없을 거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응원을 받을지도 모른다.
알다가도 모를 일처럼 악인으로 여긴 이가 호인이 되는 상황에 설지도 모른다. 물론 그 또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운을 나오키에게서 앗아갈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P. 220) 나오키는 자신이 묘한 희망을 품게 되는 게 두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