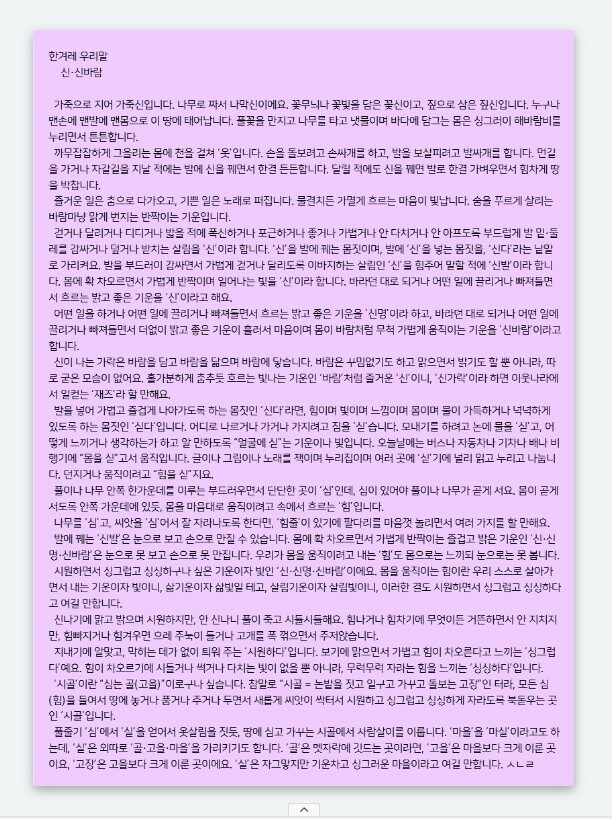숲노래 책숲
책숲하루 2023.3.4. 나누는 나
―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 (국어사전 짓는 서재도서관)
: 우리말 배움터 + 책살림터 + 숲놀이터
누구나 모든 일을 한 사람 기운으로 합니다. 다만, 하나이되 함께인 기운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삶을 저마다 새롭게 지으려고 다 다른 몸을 입고서 이 별에 태어났고, 다 다른 몸에 다 다른 마음이 깃듭니다. 겉으로도 다르게 생겼고, 말소리도 다르며, 마음빛도 다른데다가, 이루려는 꿈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 제(하나) 기운으로 일어서서 스스로 하루를 짓되, 이 다 다른 하나인 사람들이 모여서 푸른별을 이루었고, 푸른별에서 뭍하고 바다로 나누었고, 들숲바다에 시골서울로 또 나누었으며, 고을에 고장에 마을로 나누다가, 조그맣게 보금자리로 더 나누었어요.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다 다른 숨결인데, 이처럼 나누어야 ‘나’를 느낄 수 있을까요? ‘나’를 보고 느끼고 알고 배우려고 ‘너’를 바라보면서 ‘나’를 다시금 들여다볼는지 모릅니다.
“숲노래 책숲”이 언제 비롯했는지 뚜렷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2019년에 《우리말 글쓰기 사전》을 내놓느라 글을 여미면서, ‘이미 열 살 무렵’에 혼자 천자문을 익히고 한문을 배우고 그때 국어사전·옥편을 통째로 외우다시피 읽으며 ‘말더듬이로 놀림받는 말씨’를 추스르며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덟 살에 어린배움터에 처음 들어가며 ‘말더듬이’를 놀림받은 일도 빌미였다고 여길 만합니다. 말더듬이에 혀짤배기가 안 더듬고서 혀를 놀릴 말은 ‘한자도 영어도 아닌, 가장 수수하며 쉬운 우리말’이었거든요.
푸른배움터를 다니던 열일곱∼열아홉 살에 국어사전을 다시 두 벌 통째로 읽었고, 열린배움터에 들어갔다가 그만두면서 혼자 국어국문학 책을 샅샅이 뒤지고, 우리나라 낱말책을 다 찾아서 읽다가 1994년부터 혼책(독립출판물)을 냈어요. “숲노래 책숲”은 2007년 4월 15일에 인천 배다리에서 처음 열었되, ‘책숲종이(도서관 소식지)’는 1994년부터 이미 냈어요.
지난 2022년 12월에 셈틀이 맛가느라 예전 셈틀에 깃든 글·사진은 통째로 잠들었는데, 가만 보니, 그동안 해온 일을 스스로 너무 밀쳐놓았다고 느껴요. 여태 낸 ‘책숲종이’를 헤아려 ‘1001’부터 새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즈믄 + 첫’ 걸음입니다. 1994년부터 혼책으로 내놓은 책숲종이를 다 잊으려 했는데, 구태여 ‘잊기’보다는 ‘잇기’를 해야겠다고 여겨, 그동안 낸 책숲종이를 어림해 보고서 매기는 ‘1001’입니다.
ㅅㄴㄹ
* 새로운 우리말꽃(국어사전) 짓는 일에 길동무 하기
http://blog.naver.com/hbooklove/220188525158
*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 지기(최종규)가 쓴 책을 즐거이 장만해 주셔도 새로운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짓는 길을 아름답게 도울 수 있습니다